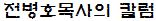1937년 군산이 나은 소설가로 유명한 채만식씨가 조선일보에 <탁류>라는 소설을 연재 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물은 조수까지 섭슬려 더욱 흐리나 가득하니 벅차고, 강 너비가 훨씬 퍼진게 제법 양양하다. 이름난 강경 벌은 이 물로 해서 아무 때고 갈증을 잊고 촉촉하다....이렇게 에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 온 물이 마침내 황해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에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채만식의 탁류에서 보여준대로 호남 선교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하겠습니다. 군산 옆구리를 흩으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금강의 탁류를 거슬러 복음이 군산에 흘러들어 왔습니다. 1890년대 당시의 조선의 정치가 탁류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 통 탁류가 흐르는 그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1832년 7월 25일 귀츨라프목사가 군산을 지나 금강의 물을 타고 강경까지 이르르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때는 그저 돌작 밭에 불과한 때라 아무런 싹도 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귀츨라프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조선에 파송된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는 예정하신 때에 푸짐한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언제인가?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하바국2:3)고 하신 말씀대로 조금은 지체되었지만 때가 이르매 그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귀츨라프목사가 지나 간지 62년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가 처음 한국선교를 시작한지 9년이 된 1894년 3월 30일 이였습니다. 군산의 봄눈 녹은 언더바지에서 나무 케던 아낙네들이 지금 막 배에서 내리는 이상한 양복차림의 두 서양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레이놀즈(W D Reinolds 한국인 이름 이눌서)선교사와 드류(A D Drew 한국인 이름 유대모)의료선교사 였습니다. 이들은 네 명의 선원이 움직이는 목선을 세내어 약과 책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과 함께 인천을 출발하여 200 키로미터가 떨어진 군산 까지 열하루 만에 아직은 작은 어촌인 선창에 도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창에서 군산 땅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구나”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으며 그 첫 발을 내려 땅을 밟았습니다. 어째서 이들은 이처럼 탁류가 부딪치는 낯설고 물 설은 군산 땅까지 오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가라 하시지 않았다면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이 머나먼 땅까지 올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일념만을 흔들거리는 그 작은 목선 배를 타고 인천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호남 선교는 육로보다는 바다를 통해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고 싶어 먼저 답사를 하기 위해 군산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레이놀즈와 드류 선교사가 군산에서 아침 9시에서 밤 10시 반까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전하는 전도지를 잘 받았고 전하는 복음 또한 귀담아 들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하니 한마디도 알아듣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루에 5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볼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답례로 생선 굴 미역 달걀 같은 것을 가져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몇 일을 군산에서 보낸 그들은 임피로 향해 갈 때에 사람들은 매우 호의를 가지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분들의 선교 일지를 보면 임피에서 하룻밤을 묶었는데 빈대와 벼룩들이 어찌나 달려드는지 한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일찍이 전주로 향해 떠나 마침내 전주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은송리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레이놀즈의 한국어 통역을 맡은 정해원이란 사람이 이미 2월 달에 내려와 작은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는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드샌 곳이라 전주성내로는 서양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성 밖 은송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4월 9일부터 두 선교사는 다시 김제 금구 태인 정읍 흥덕 줄포 곰소로 선교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시 16일 부터는 영덕 함평 무안 목포까지 내려갔고 해남 우수영 진도 고흥 녹동 벌교를 지나 30일에는 순천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대 선교 장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선을 타고 인천으로 서울로 돌아오니 5월 12일이였습니다. 드류선교사는 오랫동안 육로의 험한 길을 걷다보니 발에 물집이 생겨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를 하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물집 잡힌 발의 아픔은 느낄수 없을 전도로 기쁨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드류 선교사는 서울 선교회의에서 호남 선교부로 가장 합당한 장소는 군산으로, 군산에 호남 선교부를 세우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셨는데 바야흐로 아시아의 끝 나라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점찍어 두셨던 군산 땅에 호남 선교부가 세워져 바야흐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계절이 이제야 막 시작되게 되었으니 여기에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고 있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93년 1월 28일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인 빈톤(C C Vinton)의 서울 집에 장로교파 선교사들이 모여 <장로회 미슌 공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논의 한 이 회의에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선교정책으로 공식 채택을 하였습니다. 네비우스(John Nevius)는 1890년부터 중국 지푸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서울에 와서 선교방법의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선교 방법가운데 다른 교회나 단체와 서로 선교의 협력과 일치의 노력은 하지만 서로 선교지역을 분할하여 서로 절대 간섭을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단 5000명 이상 되는 도시나 개항장은 공동으로 선교할 수 있지만 그 이하 되는 지역은 한 선교부가 맡아서 선교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방과 충청도 일부 지방은 미국 남 장로회가, 평안도 경상북도 황해도 충청북도 그리고 서울은 미국 북 장로회가, 함경도는 카나다 장로회가,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회, 경기도와 강원도는 미국 남 감리회가, 충청남도와 서울 일부는 미국 북 감리회가 맡아 선교하도록 하였던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지역을 각 선교회가 분할함으로서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고 각 선교회가 독립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함으로 보다 빠른 시일 내 선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교정책은 교파의 난립과 지역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도 제공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하나 되어 하나의 한국교회를 이루었다면 더욱 좋을 뻔하였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실 선교지역을 돌아 본 레이놀즈 선교사가 그런 주장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리해서 호남지역 선교는 미국의 남 장로회 선교사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남 장로회 선교사들이 남으로 남으로 어떤 선교사는 말을 타고 어떤이는 걸어서 그리고 어떤이는 배를 타고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895년 6월에 서울을 위시하여 각 지역에 콜레라 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에 60여 명 씩 죽었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는 5,000명 이상이 콜레라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평안도부터 발병하여 나라 전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져 갔습니다. 콜레라는 양반, 평민, 천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얀 쌀뜨물 같은 설사를 했고, 토하였습니다. 심하게는 하루에 20리터를 싸거나 토해냈습니다. 자연히 피부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이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자 못지않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 괴질(怪疾)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어로는 코레라라고 발음한 한자가 호열랄(虎列剌)로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고, 호랑이가 살점을 뜯는 듯 심한 고통을 준다고 하여 호열자(虎列刺)로 사람들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내부대신 유길준이 방역위원장으로 제중원 의사로 있는 에비슨을 임명하였습니다. 에비슨은 우선 전국에 콜레라 예방을 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을 써서 붙였습니다.
"콜레라는 악귀에 의해서 발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균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생물에 의해서 발병됩니다. 만약 당신이 콜레라를 원치 않는다면 균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음식은 반드시 끓이고, 끓인 음식은 다시 감염되기 전에 먹기만 하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신들이 준 병이라고 여기저기에서 무당을 불러 치병 굿을 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 물을 끓여서 먹으라는 방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실시함으로 병의 전염이 더 확산 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방역 위원회는 격리 수용소를 설치하여 환자들을 격리하였고 방역 계몽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콜레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방역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박하던 때에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한 의사가 드류 의료선교사였으니, 그와 함께 전킨(William McCleary Junkin)선교사가 협력하여 서대문밖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예방활동에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환자들을 돌보며 한편으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그 어떤 선교사들 보다 더 열성으로 활동한다는 정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드류와 전킨의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적인 활동이 조정에 알려져 고종임금님은 매우 고맙게 여겨 그들에게 은재 스탠드를 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선교 콤비가 잘 맞아 그 이후에도 함께 선교활동을 하는 중에 이 나라 땅과 기후는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매우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는 1893년 8월 4일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만 한국의 무더위가운데 태어난지 열흘 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킨 선교사도 같은 해 봄에 첫 아기 '조지'가 태어났는데 태어 난지 18개월 만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신 선교적 사명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킨과 드류 선교사는 한조가 되어 마침내 전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군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레이놀즈 선교사와 함께 군산에서 잠시 선교활동을 하였던 드류선교사가 호남 선교의 교두보로 적극 군산을 추천하고 군산에 호남 선교부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선교회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드류선교사를 전킨선교사와 짝을 이루어 군산에 최초의 선교사로 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복음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군산을 첫 선교지로 삼도록 하심은 군산과 호남 지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척박한 자갈밭 같은 복음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키워 나가도록 하실 것인지, 세계선교 역사상 그 유래가 매우 드믄 흥미로운 선교활동이 군산 땅에서 바야흐로 전개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찌해서 전킨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 낮 설고 물 설은 머나먼 이국 땅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당시 군산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861년부터 일어난 미국 남북 전쟁 시에 남 장로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남 장로교회의 외지선교사업회가 이태리 중국 일본 브라질 멕시코 쿠바 그리스 등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남 장로교회의 해외 선교사 출신 신학교는 두 주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카고의 멕코믹 신학교와 버지니아의 유니언 신학교 였습니다. 이미 1885년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 받은 북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인 언더우드목사가 1891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귀국하여서 그해 9월 멕코믹 신학교에서 조선 선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때에 이 학교 졸업생으로 루이스 데이트가 그의 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10월에는 테네시주의 네스빌에서 전국신학교 해외선교연합회가 개최되었는데 이곳에서 언더우드 목사와 벤더빌트 대학에 유학하여 와있던 윤치호가 초청되어 선교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일곱 명의 남 여학생들의 가슴에 조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하였던 사이였지만 그 후 조선 선교의 열렬한 동지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소개한 루이스 데이트 외에 유니온신학교의 전킨, 레이놀즈, 존슨, 그리고 데이트의 동생 메리 데이트, 버지니아주의 아빙돈 출신 린니 데이비스, 버지니아주 렉싱톤 출신 메리 레이번, 그리고 역시 버지니아주의 펠시 볼링 이렇게 여덟명 청년들 이였습니다.
레이놀즈는 중국 선교를 볼링은 아프리카 선교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조선 선교의 뜻을 모으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레이번은 전킨을 만나 “당신이 가는 것이면 나도 가겠다”고 하여 마음 뿐 아니라몸도 하나 되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강연을 들은 존슨은 아저씨 댁에서 조선에 대한 희귀본 역사책을 발견하여 이 책을 가져와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책을 돌려 일은 이 젊은이들은 매우 흥분하였고 지금이라도 당장 조선에 달려가고픈 열망에 사로 잡혔습니다. 앞서 데이트는 남 장로교 외지 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조선선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이란 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로 선교사를 보낼 의도가 전혀 없다는 통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선교회는 그리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고를 받고 주저 않은 그들은 아니 였습니다. 레이놀즈 존슨 전킨은 다시 조선 선교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돌아온 통고는 여전히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할 계획이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이제 포기 할 것인가. 아닙니다.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찾은 길이 무엇이였겠습니까? 바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선교를 위한 뜨거운 합심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동안 하였을까요. 그들은 2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각 선교부를 찾아다니며 조선 선교사 파송을 호소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여기저기 선교부를 찾아다니던 이 젊은이들의 당시의 열정과 수고가 결코 그들만의 의지만 가지고 된 일이 아니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아니하고는 어찌 모두가 반대하는 조선 선교를 마치 골리앗 앞을 달려 나가던 다윗처럼 그처럼 무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당시 그처럼 조선 선교를 열망하며 기도하던 그 젊은이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들은 언더우드 목사를 모시고 버지니아주 노스케롤이나주 테네시주등 미국의 각 주의 여러 도시들의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조선 선교의 필여성을 역설하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 잡지들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하여 선교를 상기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1892년 2월에 <선교 The Mission>이란 잡지에 “왜 우리는 조선에 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지금 조선 왕실은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입니다. 현재 조선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대할만한 조직화된 종교도 없습니다. 현지의 선교사들만 가지고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선교역량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조선 선교는 우리와 쉽게 협동할 수 있는 북 장로교회에 의해 시작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각 방면에 호소한지 2개월여 지났을까? 외지 선교부 실행위원회로부터 “9월에 항해할 준비를 하시오” 이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19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조선 선교에 대한 회의적인 미 남장로교회 외지선교회는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조선 선교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선 선교에 열망을 가진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하신 뜻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국의 하나인 그리스 정부가 선교활동을 방해 하므로 부득이 그리스 선교를 중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 장로회 소속인 언더우드 목사의 형인 존 언더우드가 2망 5천 달러를 기부하였고 언더우드 목사도 500달러를 조선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 장로교회 외지 선교부 실행위원회는 7명을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트와 그의 누이 메리 데이트, 리니 데이비스 레이놀즈 부부 그리고 전킨 부부였습니다. 존슨이 일곱명 선교단에 들지 못하게 된 것은 이미 그는 한 달 전 조선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조선의 선교사 후원을 위한 활동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1892년 9월 7일 데이트와 그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양 레이놀즈와 전킨 부부 등 7인의 선발대가 서부로 가는 관문인 데이트 남매의 고향인 세인트루이스에 모였습니다, 마 장로교회 외지선교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는 파송예배를 드리고자 함이였습니다. 센트럴 장로교회와 에비뉴장로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마친 그들은 힘차게 조선을 향해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선교의 장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이들이 이후에 조선 선교를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생명을 다바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 호남지방에 엄청난 열매로 나타났으니 그들에 대한 호남의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미래인 오늘날의 우리들 또한 박수를 치며 그들의 장도를 환영하고 그들에게 진 선교의 빚을 어찌 다 갚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은 마침 주미 워싱톤 초대 주미 한국공사관 이채연(李菜淵)서기관이 부인과 함께 귀국하는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특히 데이비스는 이 부인과 사귀게 되어 함께 동행하니 1892년 10월 18일 다른 이들 보다 먼저 조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과의 사귐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낮 설은 땅에서의 선교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그 부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채연은 귀국후 전우국방판(電郵局幇判)이 되었다가 1894년(고종31년)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를 거쳐 이해 제2차 김홍집 내각의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瓣)이되어 개화정책 수해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후 독립협회 창립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이 처럼 그는 조선의 개화에 앞장섰던 인물이였습니다.
데이비스는 버지니아주 아빙돈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따라 자주 가난한자, 병든 자들을 돌보는 봉사 일을 하면서 해외 선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데이비스는 처음엔 아프리카 선교를 생각하였지만 앞서 소개한 바처럼 조선 선교의 강연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떠날 무렵에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지체 말고 조선으로 떠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서울에 도착한지 9일 만에 어머니의 소천소식을 듣게 되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오열하였지만 지금 막 시작한 나날이 바쁜 조선 전도에 어머니 장레식에 참석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에 들어와 1년 동안 1,885명을 전도하였고 80여 가정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선교보다는 더욱 힘든 조선 선교를 자청하여 온 데이비스는 메티 데이트와 함께 선교를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서양여인들을 처음 본 조선의 여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 녀들을 찾아오면 서양 사람들의 살림을 소개해 주고 성경과 찬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들의 입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찬송이 힘차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데이비스는 군산에 내려와서도 부녀들과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은> 대구에서 선교활동을 한 북장로교회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 애니 로리 아담스(Annie Laurie Adams Baird 안애리1864-1916.6.9)가 번역한 찬송입니다. 본래 애니는 언어학자로서 한국어와 한국음악에 조예가 깊어 많은 찬송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머리멀리 갔더니” 이 찬송도 애니의 번역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에 대해 잠간 소개하면, 1860년에 발표된 찬송으로 본래 안나 바틀렛 워너와 그녀의 여동생 수잔이 함께 쓴 “넓고 넓은 세상”이란 소설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소설에서 병약한 조니가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주일학교 교사인 린덴에게 조니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린덴은 요 15:9을 바탕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네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리고 약한 이들 주님께 속하였으니 이들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라는 노래를 불러 줍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조니는 세상을 떠난 다는 내용입니다.
데이비스가 가르쳐 당시 우리 아이들이 부르고 다닌 <예수사랑하심은>은 이런 가사였습니다.
쥬님날 사랑함을 셩경으로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님으로 두려온 마음 업시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셩경으로 내가 아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라고 힘차게 찬송을 불렀을 그 때 모습을 상상하면 싱긋이 웃음과 콧등이 시큰 거리는 감동이 송글송글 솟아오릅니다.
데이비스 여 선교사가 먼저 조선으로 떠난 이후 6명의 선교사들은 일본 요꼬하마에 머물면서 주일 북 장로교 선교사로 은퇴한 헾번 목사로부터 언더우드목사가 쓴 조선어 문법책과 사전을 받아 조선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선인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은 할 수 있게 되자 조선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892년 11월 3일에 그들은 마침내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던 코리아 인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서울에서 마펫 선교사, 그래햄 리 선교사, 빈튼 선교사 그야말로 조선 선교의 고참 선교사들을 방문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로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선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명예를 감사합니다”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서대문 인근에 있는 전 독일 대사의 집이였던 기와집을 1,500불을 주고 구입하여 실내를 서양식으로 개조한 다음 레이놀즈 부부, 전킨 부부 그리고 데이비스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데이트 남매도 함께 기거하며 숙식을 공동으로 해결하니 사람들은 미국 남부 인들이 모여 산다고 하여 이곳을 딕시(Dixie 미 남부 전쟁시 남부 연합국을 통칭)라고 불렀습니다.
1895년 서울에서 조선어를 익히고 조선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한 전킨 선교사 부부와 앞에서 소개한 드류 의료선교사는 4명의 선원들을 태운 목조선(木造船)을 전세 내어 여러 가지 약품, 책 그리고 다른 선교 용품들을 잔뜩 실은 다음 인천을 출발하여 450리 바닷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앞서 드류가 일차 방문 하였던 군산이였습니다. 보통 4일이면 도착할 바닷길을 무려 11일이 지나 도착하였으니 어찌나 바다가 흉흉한지 파도가 드높아 배안으로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들어와 물 퍼내기에 정신없을 정도였고, 안개가 자욱하여 앞을 바라보아도 알 길이 없어 사공은 이리저리 노를 저으니 한참 헤메다가 마침내 군산에 도착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베실만이라하는 군산에 도착하니 다시금 선교의 열정이 솟아올라 그들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군산에 첫 발을 디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3월, 군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3월 군산은 아직도 한 겨울 처럼 춥고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는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당시 군산은 아직 개항 이전이라 여기 저기 100여 호의 초가집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는 전형적인 어촌 이였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하고 더럽고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 길가 집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에 취하고 여기 저기 도박판을 벌려 소리를 지르다가 도박판이 싸움판으로 바뀌곤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딩그덩 댕그랭 굿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왔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돌팔매질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호감을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전키과 드류 의료선교사는 선창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배처소와 진료소를 차리기 위해 찾던 중 당시 군산 진영이 있던 수덕산 기슭에 있는 초가집 두 채를 50 달라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환률 시세로는 상당히 비싸게 샀다고 하겠습니다. 드류 선교사의 집은 1917년 당시의 우체국 있던 앞에 언덕의 기슭에 있었고 전킨의 집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전킨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드류 선교사들은 환자를 돌보고, 사람들은 두 선교사를 찾아와 말씀도 듣고 치료도 받으니 찾아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산에서 한 달 여 동안 생활하면서 집도 구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안면도 익힌 전킨 선교사와 드류 선교사는 가족들을 데리러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조선의 역사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시절 이였습니다. 동학혁명의 영향으로 시국이 어수선 하던 차에 1894년 고종은 김홍집 박영효들을 중심으로 갑오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이어오던 산분제도를 철폐하고 신분차별 없이 관리를 뽑도록 하였습니다. 고종이 먼저 머리를 깍고 전국적으로 단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도량형을 통일시켰습니다. 새로운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새롭게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개혁은 많은 백성들의 거부감으로 사회가 어수선하였고 더욱이 일본의 적극적인 사주와 지도에 의한 일이기에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차에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1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청국과 일본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일본 시모노세끼에서 청일 강화조약이 성립됨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지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청나라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가 실질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노골적인 간섭과 침략의 야욕은 더욱 악랄해 졌으니 마침내 1895년 8월 20일 경복궁 옥호루에 있는 민비의 처소에까지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들어와 무참히 민비를 살해한 천인공로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일본 공사 미후라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소행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심은 흉융하다 못해 살벌한 상태로 서울에 와 있던 외국인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킨 선교사와 드류 선교사도 쉽사리 군산으로 내려올 수 없어 차일피일 날자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1896년 4월 두 선교사 가족들은 인천에서 씨 드래곤이라는 증기선을 세를 내어 타고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증기선은 갑자기 고장이 나 수선소에 들어가 버리니 할 수 없이 한 작은 일본식 배를 전세 내었습니다. 그 배는 매우 작았습니다. 이사 짐들은 작은 화물칸에 쑤셔 넣고 겨우 네 명의 어른들이 앉을 정도의 작은 방안에 쭈구리고 앉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생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디어 1896년 4월 5일 안전하게 군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전킨은 이때의 여행을 “닭장 속의 4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거슬러 11년 전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4월 5일 조선 선교를 위해 인천항에 도착을 하였는데 전킨과 두류선교사 부부 역시 4월 5일 군산에 도착을 하였으니 날자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회사가들이 군산에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 할 때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1892년 미 남 장로교회의 칠인의 선교사들이 입국한 1892년부터 보아야한다는 주장이 있고, 레이놀즈와 드류선교사가 1894년 호남선교 답사를 하기 위해 군산에 와서 전도를 하였으니 이때를 군산 교회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킨과 드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군산의 선교사로 선정되어 온 1895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재 군산 개복교회는 1894년을 구암교회는 1892년을 교회의 출발로 교회의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교회라고 공식적으로 불려 진 때는 1896년으로 교회의 시작을 복음을 전할 때부터이냐 아니면 교회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때부터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교회사적인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96년, 드디어 군산 땅에 여호와 닛시의 깃발이 휘날리는 교회가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군산진 교회 또는 군창교회로 불려 지기도하고 후에 군산교회라 불려 진 교회가 세워짐을 시작으로 바야흐로 복음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뿌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낮 설고 물 설은 이국 한 어촌 마을에서 젊은 선교사 부부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라 할 것입니다. 집 주변에는 그늘이 될 만한 나무 한그루도 없고 삭막하기까지 하였으며, 사리 때가 되면 바닷물이 범람하여 마당이고 길이고 질퍽하여 걸어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선교부에서 보낸 배가 온다고 하지만 말이 정기선이지 선장 마음대로이니 서울 선교부에서 보내는 생활 용품이나 선교용품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불편하기가 말로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민들이 쌀, 계란, 채소, 생선 등을 선물로 가져다주어 주민들과의 친밀함은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1897년 5월 전킨 선교사는 군산에서의 감격스런 예배를 아래와 같이 편지에 썼습니다.
“주말 예배 등록인인 40명입니다. 이중의 반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방은 종이 문 막이에 의하여 두 개의 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여자들이 한 방을, 남자들이 다른 방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닥은 볏짚으로 짜서 만든 자리를 깔았습니다....출석을 부르고 결석자를 점검하여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예배자들은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평상시 큰 목소리로 책을 읽던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성경공부를 한 시간 하였는데 ‘크리스찬 준수자’란 책을 번역하여 한 장씩 공부를 시켰습니다. ...주일학교가 끝나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후에 헌금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남자가 헌금을 세니 1불 6센트, 엽전이 무려 530전이였습니다. 이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며 돈이 남으면 교회의 장래를 위해 비축해 쓰여 질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놀라운 것은 군산의 첫 교인들이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달러는 선교사들이 낸 헌금일 것이고 당시 아직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피선교지 4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530전 헌금을 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해외에 나가 처음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면 헌금은 고사하고 주민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군산의 첫 번 교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더욱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로운 축복으로 내려 주시리라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킨 선교사와 드류 선교사는 군산에서 복음전도와 의료선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님들의 인심을 얻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두 선교사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외 시간에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50여명의 환자들이 몰려와 진료를 하였습니다. 비록 서툰 조선어 이지만 한사람씩 붙잡고 기도하며 친절하게 치료해주는 두 선교사의 정성에 감동하여 주민들은 답례로 생선, 김, 달걀 같은 식료품등을 가져와 고마운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이때에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김 봉래라는 분과 송 영도라는 분 그리고 차 일선이라는 분이 최초의 원입교인이 되어 군산 선교의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1866년 6월에 기록한 전킨 선교사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에 핵심이 되는 몇몇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중 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자 반에서 교육을 시키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오후에 그들을 만나서 회개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안식일에 관하여, 세례에 관하여, 성만찬에 관하여 공부를 시켰습니다. 또 십계명과 교회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공부를 끝냈습니다.... 오랜 시간 진흙바닥을 수리한 후 드류 박사는 다시 금주부터 일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살피는 평일에는 적십자 깃대를 그리고 병원을 열지 않는 주일에는 성조기 깃대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매 주일 오후 세 사람에게 세례 예비교육을 시킨 다음 1896년 7월 20일 세례식을 거행하니 이들은 호남에서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성찬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10월 4일에는 송 영도의 딸 송 성장이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이 역시 호남 최초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차 인원 주 원선 문 화숙 이 자유 박 시길 등 20여명의 학습교인을 세웠으니 옥토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 자라 이제 바야흐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6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선교연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호남선교부를 군산보다는 나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킨 선교사와 드류 선교사는 이 안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산을 포기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 지방은 유잔 벨 선교사와 헤리슨 선교사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나주지방 유생들이 강한 반대로 나주 선교부는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산선교부의 문제가 일단락되자 두 선교사와 군산의 교인들은 더욱 열심히 복음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떤 이는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토요일에 군산에 와서 하룻밤을 묵은 후에야 주일 오후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와 성경공부에 결석자가 있는가 확인하고 만일 병으로 결석하였으면 드류 선교사가 곧바로 가정방문하여 환자를 돌보니 군산교회는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이처럼 군산교회가 활발히 일어나 전주 보다 앞지르게 되자 군산 선교부 폐지론이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킨 선교사의 선교 반경은 점점 넓어져 군산 인근 주변의 촌락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므로 만지산 남차문 송지도 등에 정기적인 처소가 만들어 졌습니다. 만지산은 오늘의 지경이고 남차문은 남전리를 말하며 송지도는 김제지역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지역을 다니고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일에는 그가 동역자라고 부른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 40여명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동역자라고 불려 진 사람들이 16명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마가 실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각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이들이 자기 집을 내 놓아 교회로 사용하게 하거나 바울사도를 머물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편의를 제공한 수많은 지역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들은 이런 바울 선교의 뒤를 이어 어디를 가던지 그들을 돕고 따르는 복음의 협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은 그들은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키우는데 선교사들의 동역자로서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먼저 호남 최초의 세례교인인 송영도씨와 그의 가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도씨는 이조 통영대부 예조 참의를 지낸 송진호씨의 5남매 중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96년 7월 20일 호남지역의 첫 번째 세례교인이란 빛나는 영에를 안고 그의 남은 평생은 오직 주님의 나라 확장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전킨 선교사를 도와서 구암교회의 설립위원으로 7년간 헌신을 하다가 그 후에 거주지를 군산 조촌동 메두에서 완주 이서 두현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 곳의 부락민 50여명을 전도하여 사오리 길을 걸어 전주 서문 밖 교회 현재 서문교회입니다. 그 서문밖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부락에 단독으로 두현리 교회 지금 만성교회입니다 교회를 설립하여 당시 200여명의 교회로 부흥 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군산옥구군 남내리로 이사를 와서 나문절 교회 지금의 옥구중앙교회를 설립하며 헌신하던 중에 1916년 2월 1일 향년 60세로 소천하시였습니다. 그는 마치 바울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은 분으로 헌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송영도의 딸 송성장은 1896년 10월 4일 호남지역 최초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장남 송만남은 어렸을 때부터 부친을 따라 교회를 섬기다가 22세때 나문절 교회를 떠나 군산개복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934년 5월 6일에 37세 때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송만남 장로는 23년간 시무하면서 주일 청년 공과를 홀로 지도하였고 신사참배 거부로 십여차례 군산경찰서에 끄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송만남 장로는 1957년 1월 조촌교회 지금의 동광교회를 설립하여 21년간 장로로 시무하다가 1985년 7월 23일 89세에 소천하였습니다. 송만남 장로의 슬하에 9남매가 있는데 군산 중동교회의 송기권 장로 군산 개복교회의 송기수 장로등 모든 자녀가 교회의 중진 교인으로 헌신하였으며 그중 장손 송관석 목사등 목사 3명에 장로 3명 전도사 3명 집사 20여명 등 군산 최초의 자손이 번창하여 120여명이나 되니 모두 주님의 나라의 학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토성산 기슭에 송씨 가문의 가족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의 막벨라 상수리나무 아래 무덤처럼 송영도씨의 후손들의 묘가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업의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듯하여 보는 이들이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100여 년 전 호남 초기 선교사들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혀 생소한 땅에 와서 선교활동을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듯이 선교사들에게도 있었으니 조사라고 불려지는 분들이였습니다. 당시 레이놀즈 선교사에게는 정해원이라는 조사가 있었으며, 미스 테이트 선교사에겐 남씨 부인이, 테이트 선교사에게는 최중진 윤식명 이자익 신경운 오덕홍 잉골드선교사에게는 오씨부인이, 멕커첸 선교사에게는 이원필 이경필 최대진 김응규 김성식 장경태가 있었으며 해리슨 선교사에게는 김창국 양웅칠 김옥여가 있었으며, 얼 선교사에게는 김치만이, 미세스 얼 선교사에게는 윤씨부인이, 전킨선교사 부인에게는 최씨부인이, 특히 전킨 선교사에게는 김필수 장인택 오인묵 등 여러 조사들이 협력하여 놀라운 선교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선교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선교적 열정과 노력이 한국 선교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면 이들 선교사 뒤에는 역시 많은 한국인 조사들의 헌신과 인내와 충성이 한국 선교의 디딤돌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킨선교사의 조사중 장인택 이란 분의 믿음의 수고는 꼭 기억해야 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명준 교수님과 김수진 목사님이 장인택 조사에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셔서 그분의 면모를 오늘날 다시 조명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장인택 조사는 경기도 평택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이 한문을 깨우치고 지식인으로 행세를 하면서 서울을 드나들며 새로운 서구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선교사들을 만나 신 지식을 들으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남 장로교 선교사들의 어학교사로서 있으면서 조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로만 회의를 하는 미국 남 장로교회 미션공의회에 조선인 대표로 참석한 것을 보면 그의 영어 실력과 신앙의 정도가 뛰어났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1896년 전킨 선교사를 따라 군산에 내려와 군산교회와 궁멀구암교회를 설립하는데 그의 수고는 대단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평택의 부자였는데 궁멀에서도 많은 땅을 구입하여 대 농이 되었습니다. 농사철에는 농사일을 돌보고 농한기에는 선교사를 도와 조사로서 활동하였으니 전킨선교사가 가는 곳에는 항상 장인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산 부두에 나가 전도를 하고 전킨 선교사의 집을 건축하며 교인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키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니 초기 구암교회의 성장에 그의 공로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몇 년전 구암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을 하였는데 교회 전면에 8개의 큰 기둥을 새웠습니다. 일곱 기둥은 미 남 장로교회 일곱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둥이고 나머지 하나는 장인택 조사를 기념하는 기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는 장로가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이름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자취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1916년 구암교회가 교회당을 신축할 때에 건축위원으로 회계를 담당하였습니다. 그의 외아들 장재서, 딸 장한나, 둘째딸 장은숙, 셋째딸 장태인 이렇게 1남 3녀의 자녀들이 구암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영명과 멜본딘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앞서 소개한 바대로 장한나는 다음에 소개할 만지산 지경교회의 최흥서장로의 맏며느리가 되었고 그 남편 최주현은 영명학교와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지경리에서 삼성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최주현의 큰 아들 최영태는 역시 영명학교와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후에 세브란스대학 학장을 지내며 우리나라 세균학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최주헌의 동생 영환도 형과 같은 학업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에서 병원을 개업하였습니다.
장인택이 구암교회의 초창기 기둥역할을 하였다면 최흥서는 개복교회의 기둥이였습니다. 최흥서는 1860년 7월에 김제군 만경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873년 가족을 따라 임피 만지산 현 지경리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조달현이라는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믿었는지 아려진바 없습니다만, 조달현은 보부상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물건을 팔면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최흥서가 이 조달현을 만나 복음을 듣고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산 전킨을 찾아가서 기독교 교리를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해리슨 선교사가 그에 대한 성품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최흥서는 중산층에 속한 독농가입니다.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수줍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전킨선교사도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성실한 사람으로 좋은 집사 한사람과 좋은 장로 한 사람을 결합시켜 놓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는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거의 모든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흥서의 신앙과 성품은 당시 군산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 교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 그가 처음 군산교회에 나오던 때에 소송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라 선교사들이 교인들의 일상생활 또한 요긴하게 도움을 주곤 하였던 터라 최흥서의 소송문제도 전킨 선교사에 의해 원만히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흥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최흥서는 1897년 4월 10일에 전킨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한 후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10km나 떨어진 군산 교회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만지산에서 최흥서를 비롯하여 김채오 정치선 최관보 정백현 이양화 등 많은 교인들이 1900년 최흥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이 만지산 교회 즉 오늘의 지경교회의 시작이였습니다. 그후 중만자에 초가삼간을 건립하여 예배당으로 삼았으니 2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최흥서는 앞에서 소개한 대로 1902년 9월 조선 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 군산교회 대표로 찬석하였습니다. 또 군산 선교부가 궁말로 이전하자 군산교회의 맥을 이어 개복동에 교회를 재건하는데 앞장 선 일도 이미 앞에서 소개하였습니다. 1903년 만지산 교회의 최초의 장로로 피택되었으나 지체하다가 1905년 말에 장로로 장립하게 됩니다. 1907년 교회의 부속 2년제 소학교를 불 선교사의 도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으로 이요한 최주일 김준실 양해성 고란섭등이였는데 그 중에 이요한은 1947년 제헌국회의원이었고 전북도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이 되었을때 최흥서장로는 교인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철야기도회를 가졌고 3 ․ 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만세를 부르다 교인들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흥서 장로는 군산 선교부가 설립한 복음서원의 매서인으로 활략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기독교 신앙서적들을 읽히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보다 큰 사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윌리엄 B. 해리슨(William Butler Harrison, 하위염;河緯廉1866-1952)선교사를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리슨 선교사는 1866년 미국 캔터키에서 출생하여 캔터키 센트럴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또 루이스빌 의대에서 1년간 의학 공부를 한 다음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894년 남 장로교회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고 제 3진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서울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와 풍속을 익힌 다음 1896년 유진 벨(Eugene Bell 배유지)선교사와 함께 나주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의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유진 벨 선교사는 오웬(C C Owen 오원)선교사와 함께 목포로 내려갔고 해리슨 선교사는 전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1897년 전주 서문 밖 은송리에서 약간의 배운 의술로 진료소를 개설하여 의료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전주에서 매 5일 마다 열리는 장날 인근 장터마다 헛간 2곳을 마련하여 복음을 전하니 장터에 몰려온 사람들은 장터의 독특한 들뜬 분위기와 아울러 서양사람 구경을 하고 싶은 호기심과 그가 어눌하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즐거워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선교사는 장터 선교사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산에서 활동하던 전킨 선교사가 건강상 문제로 전주로 옮겨오게 되자 대신 해리슨 선교사가 군산 선교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1903년 부인 데이비스가 별세한 후에는, 선교지역을 군산으로 옮겼습니다. 전킨 후임으로 군산 영명학교 책임자, 남전교회(1904-1908 및 1916-1917), 개복교회(1905-1911),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웅포교회, 동연교회, 무주읍교회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리슨 선교사는 군산지역뿐 아니라 익산지역까지 선교활동을 하면서 익산 고현교회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현 교회를 소개하기 앞서 먼저 군산 대야에 있는 지경교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경 교회가 설립된 공식 지명은 임피군 남산면 만자산리 입니다. 이 지역은 김해 김씨 진주 강씨 전주 이씨 전주 최씨들이 중심으로 그 밖의 여러 성씨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의 모습이 말 형태라 백마산이라고 부르고 그 산 아래에 살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 하여 만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최흥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1896년 4월 초 어느 날 전남 신안사람 보부상인 조달현이 만자산에 와서 사람들에게 군산엘 갔더니 서양 사람이 와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더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만자산의 강채오 이양화 최관보 최흥서 이들이 조달현을 따라 군산에 가서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를 만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본 서양 사람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왔습니다. 조사 장인택으로부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흥미를 더욱 가지게 되면서, 그들은 여러번 군산을 찾아와 기독교에 관한 말씀들을 듣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군산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기로 하고 1896년 6월 13일 토요일 최관보 정치선 강채오 정백현 이양화와 그의 부인 삭녕최씨(후에 최매리로 불리움) 최흥서 그리고 삭녕최씨의 4살 난 딸 순길이 이렇게 군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순길이가 돌이 지나 눈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눈에서 고름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드류 선교사가 순길이 눈을 수술하여 고름도 제거하고 치료해 주니 상태가 매우 좋아 졌습니다. 이때 크게 은혜를 체험한 순길이 엄마는 그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이름도 최매리라 하고 지경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지경교회를 창립할 때 이 일곱 사람이 만자산 교회 창립 칠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군산교회에 방문하여 그 다음날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날이 마침 미 국 장로교회 어린이 꽃 주일이였습니다. 전킨 선교사가 눅 19:16.17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신 어린이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자산에서 30리길을 걸으며 군산교회를 다니던 일곱 사람이 최흥서의 집 사랑방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수가 점점 많아지자 중만자의 최찬일씨 댁 근처에 초가삼간을 20원에 구입하여 1900년 10월 9일 공식적으로 만자산 교회를 세워 첫 예배를 감격 속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인택 조사가 사회를 보고 예수사랑하심을 찬송하며 최흥서씨가 기도하고 불 선교사가 마16:13-20의 말씀으로 ‘만세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말씀대로 오늘날 지경교회는 군산의 유서 깊은 교회로 크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첫 예배 참석자는 성인이 35명 어린이가 40명 이였습니다.
당시 이 만자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오원집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원집은 임피 공창리 출신으로 친척인 완산의 오 할머니 댁에 왔다가 아직 군산교회를 다니고 있던 만자산 교인들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자산 사람들과 군산교회를 다니다가 만자산 기도처에서 본격적으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책임성이 강하여 한번 맡은 일은 열심히 감당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따라서 한번 복음을 듣고 난 후는 한번도 빠짐없이 만자산 기도처와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그는 익산 고현리 처녀와 결혼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한 후에도 만자산까지 수십리 길을 걸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그를 유심히 살펴 본 선교사가 바로 해리슨 목사님이였습니다. 오원집은 해리슨 선교사에게 학습과 세례를 받고 선교사를 따라 이곳저곳으로 노방전도 하는데 참가하여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쪽 복음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오원집은 친구 오덕근과 김자윤 고선경 김경장 오덕순등 과 더불어 만자산까지 가지 말고 고현리에 아주 교회를 세우자는 뜻을 가지고 고현리의 곽도일의 사랑방을 기도처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해리슨 선교사와 양응칠 조사의 도움을 받아 1906년 고현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양응칠(1855.7.27-1932.7.17 묘비에 적힌대로) 조사가 1903년 제3회 예수교장로회합동공의회가 모일 때 전라대리회 총대로 참석한 것을 보면 당시 선교사와 교회의 상당한 신임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1896년 3월 16일 군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궁멀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전킨 선교사와 열심히 교회를 섬기었던 것입니다.
양응칠 장로의 신앙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곡교회 100년사에 소개된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05년 불 선교사와 양응칠 장로의 권유로 백토리에 살고 있는 고형일 고익순 고창여 전학천 김이주 고준석 여러분이 궁말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 고형일씨 댁에서 기도처를 마련하여 양응칠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곡교회(남성교회로 후에 나누임)가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양응칠 장로는 백마를 타고 다니였습니다. 본래 유교를 믿고 있는 부모의 배척으로 집에서 쫒겨 나 자주성가하여 전주 서학동에 정미소를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또 한의학도 공부하여 침술로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외손녀 되는 이정은 권사(안산제일교회)의 증언에 따르면, 양응칠 장로의 집은 부유하여 머슴들을 여럿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일체 머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양 장로님 댁에선 주일마다 거지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였습니다. 양 장로의 부인과 자녀들 가족들이 이들을 대접하다보니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너무 일손이 부족하여 양 장로 부인은 머슴들에게 물 깃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 장로는 온 가족과 머슴들을 마당에 불러놓고 어떻게 머슴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었는가 부인을 문책을 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 부인의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로 부인의 장단지를 사장 없이 때렸습니다. 참으로 주일성수를 어겼다고 부인에게 회초리를 때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들 앞에 종아리를 걷고 남편에게 회초리를 맞은 그 부인의 순종의 도가 더욱 놀라움을 가지게 합니다. 철저한 성수주일을 고집한 양 장로는 주일에 옷고름이 떨어져도 꿰매지 못하게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추수하기 전에 미리 십일조를 헌금하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식량도 담당하고 주일이면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임피 선산에 양장로의 묘소가 있는데 그 묘비명에 “믿음의 횃불 되어 길이 빛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매서인들이 한국 초기 선교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매서인을 권서인 (勸書人; Colporteur)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인 로스역 성경이 번역 출판이 되자 번역에 종사한 백홍준 이성하 서상륜 등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한 짐씩 짊어지고 도시와 시골을 다니면서 약간의 돈을 받고 성경을 전해 주면서 매서인들이 한국 초기선교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해 온 유교와 또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한 책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너도 나도 성경을 사서 읽다가 그만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초기한국교회는 메서인들을 통해 성경이 널리 보급됨으로 보다 튼튼한 기초를 쌓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안양대학교 이은선 교수의 자료 논문에 의하면, 1907년 미국 북 장로교회 한국선교부가 부산에서 연차회의를 개최했을 때, 성서공회의 역할에 대해 “이 땅에서 발전되고 있는 기독교는 출중하게도 성경 기독교(Bible Christianity)”라고 했으며,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은 성경이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양식은 성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밀러는 한국 기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을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인”(Bible-loving Christian)이라고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매서인들의 사역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새롭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성서공회의 한국지부 총무로 활동했던 캔 뮤어는 한국에서의 성서보급의 결과에 대해 “말씀이 읽혀지고 암송되고 있다. 말씀은 이 생기 없고 영감 없는 백성들의 피와 뼈와 살 속으로 파고들어 가고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권서들을 통한 성경 보급은 성경연구모임인 사경회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사랑하는 한국기독교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바로 매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부산지방에서 크게 활동하였던 호주선교사 엥겔(George O. Engel 1964-1939)은 “메서인들이 먼저 가서 지역을 넓히고 관심을 일깨운 후에 선교사들에게 영구적인 결과가 있을 곳을 알려주면 선교사가 가서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조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선교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선교에 2만 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한국 선교와 교회개척의 최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성경보급에 힘쓴 사람들이 바로 매서인들이였습니다. 매서인들은 초기한국교회에 몰려온 온갖 시련과 모진 풍상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황무지를 개척한 믿음의 용사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민족수난기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성경봇짐’을 메고 다니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매서인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개척 선구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교회설립의 모태이자 그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 중에 군산의 최흥서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성한 최흥서 장로는 1935년 소천하였습니다.
군산 개복동 교회에 새로운 일군이 생겼습니다. 진사 홍종익의 사촌동생인 홍종필이란 분입니다. 본래 이분들은 강원도 평해가 고향입니다. 홍종익은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를 와서 구한말 서울에서 관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1905년 사촌인 홍종필과 함께 선조의 500지기 농토가 있는 익산군 웅포리 제석리로 낙향하여 마을 한가운데 서울식 곰배집 두채를 지었습니다. 윗집은 홍종익이 살고 아랫집은 홍종필이 살았습니다. 비록 낙향을 하였지만 돈이 많안 가문인지라 밤만 되면 도둑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쌀이며 물건들을 훔쳐갔고 아주 대낮에는 불량배들이 몰려와 강압적으로 재물을 빼앗아 가곤 하였습니다. 이같은 행패에 참지 못하여 이들은 군산이 개항을 하자 군산으로 이사를 나옵니다. 여기서 최흥서를 만나 전도를 받고 개복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복동에서 개복동으로 교회를 새로 지어 이사를 할 때에 홍종익은 상당한 건축헌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홍종익 진사와 홍종필은 본래 양방으로 학문에 깊이가 대단하였던 터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남들 보다 빨리 이해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이르게 되고 교히의 장년부를 신설하여 성경 교육과 나라 사랑하는 교육에 열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911년 홍종익이 1912년에는 홍종필이 장로로 장립이 되었습니다. 더욱 특이한 일은 홍종익과 홍종필이 군산으로 옮겨와 독실한 교인이 되자 제석리의 빈집을 교회당으로 만들어 제석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홍종익이 군산으로 이사를 나와 1906년 생일날에 제석에 있을 때에 그를 도와 주던 마을 사람인 송원규 강진희 엄주환 강두희 강문희를 군산에 ccjd을 하였습니다. 홍종익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를 못한다”고 말 하면서 예수 믿기를 권하니 이들이 제석교회의 첫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제석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한 박수명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처음 군산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던 엄주환과 강진희는 본래 들녘에서 농토를 일구면서 사는 소시민이었으며, 송원규, 강두희, 강문희는 홍종필 홍종익의 집에서 일꾼으로 살았던 천민들었지만 예수 안에서 천민, 진사 구별 없이 형제처럼 지내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강문희는 후에 조사 및 전도인이 되어 제석을 떠나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또 웅포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 가려면 이십리 길을 아이들이 걸어야 하므로 제석리의 홍종익 홍종필의 집에서 부용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을 졸업하면 군산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군산 영명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여자들은 멜본딘여학교에 진학하여 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종필 장로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평양신학교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1923년 오후4시 목사 안수 받고 개복교회의 청빙으로 모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회에 전염하니 출석교인 수가 420명으로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3회 총회 부 회의록 서기로 1927, 1928, 1929년 3년간 총회 서기로. 이외에도 장감연합공의회 이사,'基督申報' 이사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 편집위원,금강산기독교수양관건축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총회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1930년 9월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19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호남출신으로 김필수 이기풍 이자익 목사에 이어 네 번째로 장로교 총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1930년 9월 12일 조선 예수교장로회 제 19화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피선 되을 때 그의 나이는 43세였으니 그가 얼마나 교회와 총회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었던 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종필 목사는 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었지만 1935년 5월 29일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북노회에서는 그의 죽음이 너무 애석하여 전북노회록 제 30회 회록에 그의 약력을 소개를 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先生은 天性이 沈眞하시고 言少遠念하사 眞理를 敬愛함으로 一般信者에 模本이 되시었다."
홍종익장로 홍종필 목사 이 두 사촌 형제는 군산교회의 발전은 물론 전라 노회와 나아가 총회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남기었던 분들로 특히 군산 교계가 기억하며 따를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열방의 외세 앞에 마치 풍전등화인냥 그 사직의 명맥이 가물거리고 있었으니 특히 일본의 똑각 거리는 게다 소리가 삼천리 여기저기에서 들려 왔습니다. 군산은 바로 저들의 코앞에 펼쳐 논 진수성찬 잔치 상 같았습니다. 군산을 돌아 본 일본인들은 코를 벌렁거리며 드넓은 황금 논밭을 바라보며 침을 삼키었습니다. 군산에 처음 정착한 일본인은 사도도미지로란 자로 군산 옥구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미곡상인 이였습니다. 처음엔 구영리 작은 일본식 판자 집을 짓고 살며 군산 옥구의 쌀을 긇어 모아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어찌 그것으로 만족할 종족입니까? 일본은 군산의 개항을 계속적으로 고종에게 요구하여 마침내 1899년 5월 1일 군산을 개항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만 상업적인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항을 통해 일본이 조선과 대륙을 통한 병참기지로 삼으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은 군산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일본인 거주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개항 전에는 20여 호의 77명이었던 일본인이 1900년에는 131호에 422명으로, 1904년에는 1260명으로 1909년에는 819호 3229명, 1910년엔 957호 3649며으로 증가하니 지금부터 100년 전 군산에 일본인들이 4000여명 살고 있었습니다. 개항당시 군산의 조선인 주민이 150호에 511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본의 세력은 급격히 확장되어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목포영사관 군산 분관을 설치하고 바야흐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본격적인 침탈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거류민들이 군산 땅에 자리 잡으며 선교본부로 삼고 있는 초가 인근까지 일본인들이 점유해 들어오자 자연히 군산의 주민들이 군산교회를 찾아오기가 거북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킨 선교사와 드류 선교사는 더 이상 이곳에서 군산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 새로운 선교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선박선교하기가 용이한 당시 옥구군 임피면 구암리 일명 궁멀이라 부르는 곳으로 선교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로의 교통도 편리할 뿐 아니라 내륙교통도 유리한 지역을 알아보던 중에 드류선교사의 의견을 따라 1898년 12월 21일 궁멀에 호남 최초의 서양식 집을 준공하고 호남선교부로 그리고 구암 교회당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28년 간행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899년 옥구군 구암리 교회가 설립되다. 앞서 선교사 전킨, 의사 드류, 전도인 장인택이 이곳을 왕래하여 열심히 전도함으로 신자가 점점 많아져 예배당을 신축하고 그 후에 오인묵을 장로로 장립하여 당회를 조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기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905년 군산부 개복동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선교사 전위렴과 의사 유대모가 본처에 주택을 정하고 복음으로 선전하며 의약으로 시제하야 신자를 득함으로 전위렴 사저에서 집회하난 중 김봉래 송영도 이인이 호남에 최선 수세자가 되니라. 기후에 선교사 스테슨회 위취를 옥구 구암으로 이전케 됨으로 약간의 신도는 구암으로 래왕하며 예배하고 혹은 타처로 이거하니라. 기후에 선교사 어아력(A.M.Earle)이 조사 최흥서로 군산에 전도케 함으로 신자를 얻어 구복동에 처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중 최흥서는 전도 매서가 되어 전무하얏고 개복동 남편산에 12간 예배당을 신축하고 수십 신자가 예배함으로 교회가 완성되야 점차 발전되난 중 배경원 홍종익 이춘선 양석주 이호성 남 필 김명후 김두현 진운옥 홍인원등이 열성 협동하야 다대한 효과를 있었고 진운옥이 조사로 시무하니라”(史記 pp.138-139)
이와같이 선교부가 궁멀로 옮겨 감으로 일부 교인들은 궁멀로 따라갔고 일부는 흩어졌으며 또 일부는 군산에 남아있어 최흥서 조사와 홍조익등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에 1904년 3월 20일 군산시 구복동 77번지에 예배당을 건립하였고 1906년 현재 개복교회 자리인 개복동 13-1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1899년 12월 21일자로 군산교회는 궁멀로 이전하여 궁멀교회가 되었지만 그후 해리슨 선교사가 구복동 집한 채를 구입하여 복음서적의 매서인인 최흥서에게 군산모임을 책임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력으로 1907년 1월에는 18명이 학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최흥서 조사는 교회당이 건축될 때까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하였고 1902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제 2회로 서울에서 열렸을 때에 그는 군산 선교부의 유일한 평신도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1904년 예수교장로회 연감을 보면 1899년 12월 21일 궁멀교회가 창립되었다고 하였으나 개복동교회 창립은 미상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궁멀은 옥구에 소속되어 옥구군 구암리에 세워진 교회이었습니다. 전라 노회록을 보면 1915년 까지 개복교회를 군산 교회로 부르다가 개복동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개복동교회가 군산의 교회로 명맥을 이어 받았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옥구군 구암리가 군산에 편입되므로 구암교회가 선교부 이전의 군산교회로서 법통을 이어 받았으니 더 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선후를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구암리 교회가 먼저다 아니다 개복동 교회가 먼저다라는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한 나무에서 자란 두 가지이기에 어느 교회가 먼저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 1899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산둥 지방, 화베이 지역에서 의화단(義和團)이 외세 배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일찍이 산둥 지역에서는 의화권(義和拳)이라는 민간 결사가 생겨나 반외세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1897년 독일이 산둥성 일대를 점령하자 의화권의 반외세, 반기독교 운동이 격화되었습니다. 의화권은 다른 민간 자위 조직에 침투해 통합을 이루고는 스스로 의화단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부청멸양"을 구호로 내건 본격적인 의화단 운동은 독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활동이 왕성했던 산둥 성의 북부 지역에서 1898년 4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해 여름부터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어 가뭄 피해가 극심해지자 많은 유민이 발생했는데 이들이 대거 의화단에 가입하여 의화단 난은 점점 더 기세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1899년 12월에 새로 부임한 산둥 순무(巡撫) 위안스카이는 열강의 요구에 따라 의화단을 강력히 탄압했는데 이것이 의화단 세력이 허베이 성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면서 의화단은 철도, 교회, 전선 등 모든 외래적인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기독교도를 학살하였습니다.
이 같은 의화단 난의 영향이 우리나라 서북부지방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어 서북부지방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학살하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00년 겨울 미국인들이 전차를 부설하자 반대하던 군부대신 이근택과 내장원경 이용익이 기독교와 선교사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종은 전국에 알리기를 외국인과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보냄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교회는 1901년 9월 서울 정도 예배당에서 선교사 25인, 조선인 장로 3인 그리고 조사 6인으로 구성된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과 전라도와 경상도에 대리위원부를 설치하는 등을 결의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레이노즈선교사가 회장으로 있던 1902년부터 전라도 총대들이 정기적으로 공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레이놀즈(한국명:이눌서,William David Reynolds,1867.12.11~1951) 선교사에 대해서 잠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초로 호남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가 레이놀즈선교사임을 말씀드린바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번 그에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레이놀즈 선교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요동치게 되어 이참에 잠시 한아름 닉네임을 가진 선생님이 소개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레이놀즈선교사는 1867년 12월 11일 미국 버지니아 주 노포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달리 어학에 재능이 있었던 레이놀즈는 어린 시절의 꿈처럼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독어 등을 익히게 되는데 그의 재능은 훗날 우리나라 한극 성서번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햄펀시드니 대학을 최우등을 졸업한 후 레이놀즈는 남장로교신학교에 입학하고, 1891년 안식년을 맞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해 레이놀즈가 재학 중인 신학교에서 선교보고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레이놀즈는 조선 행을 기도하며 전킨이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레이놀즈와 전킨은 매일 3시에 기숙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 마음을 쏟아, 조선 선교의 길을 열어줄 것을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레이놀즈는 선교의 뜻을 같이하는 볼링 양과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 결혼하여 , 1892년 11월 3일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어학실력이 뛰어났던 레이놀즈 선교사는 어학 선생과 함께 강화 섬에 나가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 한국말로 전도 강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적응 훈련과 언어 훈련을 마친 레이놀즈 부부는 1894년 3월 27일 군산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말을 타고 임피 , 전주 , 김제, 영광, 함평, 무안, 우수영, 순천, 좌수영 등지를 순방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이 봉기하기 직전이어서 민심이 흉흉한데도 , 각 고을을 돌며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 강연을 하면서 호남 선교의 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새벽이슬을 맞으며 조선어와 씨름하던 레이놀즈 선교사는 조선말이 입에 붙게 되자 언더우드 선교사와 게일선교사와 함께 본격적인 성서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897년 9월 전주 선교부는 많이 발전하여, 9월 5일 주일에는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습니다. 집회시 예배 인도자 레이놀즈는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 말을 가장 잘 했고 유식한 말로 설교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배는 전주서문교회의 설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레이놀즈는 1895년 성경번역위원회 남장로회 대표로 선임되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성경번역은 외국인선교사와 한국어 선생의 공동작업이라고 할 만큼 한국어 선생의 역할은 지대할 수 밖에 없었는데, 레이놀즈가 한글성경번역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박학다식한 한국어 선생 김필수 장로의 공이 컸습니다. 김필수 장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끈기 있게 성경번역을 진행하던 레이놀즈는 마침내 그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권씩 개인역이나 수정역으로 나오던 신약 전체를 묶어서 1900년 단권 신약성경을 출판한 것입니다. 출판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견되자 레이놀즈와 언더우드, 게일은 아예 성경번역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들은 1902년부터 1906년까지 무려 555회의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친 후에 로스역 성경이 번역된 이후 최초의 공인역본 신약전서를 출판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전라 대리 위원부에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대리위원부의 총대로서 군산 출신으로 활동한 이는 1902년 군산교회의 최흥서 이었고, 1903년에는 군산 교회의 조사 양응철 이었으며, 1906엔 다시 최흥서가 군산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1907년 미국 남 북 장로회와 카나다 장로회 호주장로회가 <대한 에수교장로회 독로회>를 9월 7일 조직하였습니다. 선교사 38명 조선인 장로 40명 합 78명으로 회장은 마펫선교사, 부회장에 한국인 방기창, 서기 한석진, 부서기 송인서, 회계 그래함 리 선교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당시 독노회는 평양신학교 제 1회 졸업생 7명 즉 서경조 한석진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그리고 송인서에게 최초의 목사 안수를 하였습니다. 독노회 창립당시 전국적인 장로교 교세는 조선인 목사 7명 장로 53명 989교회에 1만 9천 여 명의 세례교인과 7만 여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괄목할만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적 회의에 군산교회 대표로 최흥서가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1911년 10월 15일 전주 서문 밖 예배당에서 목사 20명 장로 25명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전라노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회장으로 김필수 목사, 부회장으로 유진 벨 선교사, 서기에 이승두 장로, 회계에 최의덕 목사 , 최국현 장로를 선출하였습니다. 공천위원으로 최흥서 장로가 활동하였으며 김필수 목사에게 군산교회와 궁멀교회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강(秋岡) 김필수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인물로 본 Y 100년 2009.1월 30일 고 전택부선생님의 글 인용)
김필수 목사님은 1872년 7월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죽산의 부유한 연안(延安)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이 본래 선비 가문이고 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귀동자로서 한학 수학에도 남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일찍이 청운(靑雲)의 꿈을 품고 상경하여 과거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때마침 일어난 갑신정변과 박영효(朴泳孝) 등 개화당 지도자들과의 교분관계로 일본 고베(神戶)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관계로 역적의 혐의는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머리를 깎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귀국하자 김필수목사님은 언더우드(H. G. Underwood) 목사의 추천으로 레이놀즈 목사의 어학선생이 되었습니다. 레이놀즈 목사의 한국어 선생으로 일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레이놀즈 목사가 성서번역 때문에 서울에 와있었을 때에 한국 YMCA 창설이사로 발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YMCA운동을 통해 식민지 치하에 기독청년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등 한국 YMCA 운동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그 뒤 김필수 목사님은 전주에 내려가 완산교회의 장로로 피택이 되었고, 다시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여 1909년 제 2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 그는 진안․무주․장수 지방과 군산 지방을 순회 전전하면서 개척 선교에 헌신했으며, 1915년 장․감 두 교파가 연합으로 ‘기독신보’를 창간할 때에는 상경하여 그 편집인이 되는 한편 YMCA의 일로는 강화 및 사경회 강연회 등의 명강사로 활약하였습니다. 특히 1918년 11월에는, YMCA가 세계 기도주간을 맞이하여 대강연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는 ‘사회개량의 요소’란 제목으로 제 1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무단정치의 종식을 암암리에 주장한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필수 목사님은 3.1독립운동 직후 YMCA의 회보인 ‘청년(靑年)’을 창간할 때 그 권두언을 썼으며, 1920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순회 전도단을 조직하여 활동할 때에는 그 단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김필수 목사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전도대 발족 설교를 한 뒤 제 1대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제 2대는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제 3대는 함경도와 강원도로 나누어져 전도와 계몽강연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목사님은 물산장려운동, 절제운동에 앞장서서 YMCA 계몽사업을 주도했으며, 특히 이상재, 윤치호와 함께 소위 3거두의 지도체제를 이루어 실무담당인 신흥우 총무의 배후인물이 되어주었습니다.
한편 1907년에 조직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 때부터 1914년까지는 선교사들이 회장직을 독점했으나 1915년 제 4회 총회에서는 김필수 목사님이 최초로 한국인 목사로 총회장으로 선출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한국 교회연합 운동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물론 YMCA운동 자체가 연합운동이어서 이미 교회연합운동에 선봉을 섰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1918년 3월 26일 YMCA회관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조선예수교 장감(長監)연합협의회가 창설될 때에는 목사님이 초대회장으로 피선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참석했으며, 이 총회는 남북감리파와 남북 장로파, 캐나다 및 호주 장로파 등의 정식총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에 김필수 회장은 취임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파를 나누는 일은 다만 때와 장소에 의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따라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두 교파가 이를 생각하여 하나의 연합기관을 조직하게 됩니다.
”일 천부(天父)의 뭇들, 일 구주(救主)의 지톄(支體)로써 교파를 분립(分立)은 다만 시긔(時期)와 쟝소(場所)에 의야 형식에 불과거늘 라서 정신세계에 지 영향이 혹 잇슨 즉…현금에 쟝로 감리 량교파가 이를 고념(顧念)야 일톄적(一体的) 련합긔관을 조직다“라고 선언하므로 일찍이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참으로 김필수 목사님은 한국의 사도바울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교회 특히 군산과 전주의 초기 교회 역사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데 큰 족적을 남기신 한국 교계에 꼭 기억할 어른 이시라고 하겠습니다. 김필수 목사님은 그처럼 꿈꾸고 기도하던 조국의 해방을 보시면서 1948년 10월 30일 76세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였습니다. 오늘에 추강 김필수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기념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채로 남을 겄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오자 곧 미국 공사 푸우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교육사업을 시작하고 어학을 연구하러 왔습니다....우리는 서울에서 한국어 연구생으로서 또는 교육사업가로서 미국의 국기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지금은 선교사업이 아니라 교육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같은 언더우드의 입장은 종교로서 보다는 교육을 강조함으로 한국인들에게 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선교적 입장을 피력한 것 이였습니다. 1885년 8월에 아펜셀라에 의해 최초로 서구식 학교인 배재학당이 세워 졌습니다. 1887년6월 8일 고종께서 친히 “배재”란 이름을 지어 당대의 명필인 정학교 선생에 의해 간판을 써 붙이게 하였습니다. 1886년 5월 30일 스클랜튼 선교사가 여성 교육을 위하여 여학교를 세우니 이번에는 명성왕비 민비께서 이화학당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후 속속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이 전국 각지에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886년 서울에 경신학교가 1887년엔 정신여학교, 광성학교, 1894년엔 평양에 숭덕학교와 정의 학교 그리고 1895년에 동래에 일신 여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09년 까지 장로교가 605학교 학생수가 14708명이고 감리교가 200학교로 학생수가 6420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파들도 곳곳에 학교를 세워 한국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수많은 한국근대화의 인재들이 양성되고 독립인사들 그리고 해방후 건국의 지도자들이 무수히 배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법인아사회가 정관개악으로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의 교단추천 이사제도를 폐지함으로 NCC가맹교단과 비가맹교단의 포함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16개 교단이 연합하여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하게 정관개정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 이사회측에서 “학교 설립단시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ᅟᅡᆭ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자으로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확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는 교육과 의료를 통해 사회와 민초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선교명령을 온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수행하는 연합과 공공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다”라는 등 사실 확인서를 이사회 측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시작은 광혜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85년(고종22년) 미국인 선교의사인 H.N 알렌이 세운 광혜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1884년 의료선교사로 1884년 우리나라에 와있던 알렌이 우정국사건으로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하게 되고 그 후 청나라 병사들을 치료하다가 궁중의 전의(典醫)로 발탁이 됩니다. 알렌은 고종에게 건의 하여 1885년 2월 광혜원을 설립하였다가, 3월 의학교육을 위해 최초의 의학생을 선발하면서 12일에는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897년 운영권이 선교부로 이관되었고 1900년 미국 클리브랜드의 사업가 L.H 세브란스가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어 1904년 남대문 밖 복숭아 골에 한국최초의 병원이 준공되고 이름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 세브란스의학교로 교명을 제정합니다.
한편 1915년 3월 미국 뉴욕의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한 남 북 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협력을 얻어 서울 YMCA에서 Chosun Christian College(문과 수물과 상과 농과 신과)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대학이 생겨납니다. 현지의 교지는 1917년 존 티 언더우드씨의 기부금으로 구입하였고 찰스 시팀슨씨의 기부금으로 스팀슨 홀을 건립하여 1820년 이전하였습니다. 1923년 3월에는 신 교육령에 의해 교명이 연희전문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는 설립당시부터 서로 밀접한 선교적 동조를 통해 한구교회의 교육 및 선교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마침내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전문대학이 통합되어 연세대학교가 되고 그 학교 설립연도를 관혜원의 설립날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30년간 건학 이념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기독교 정신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한국 사회의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온 연세대학교를 한국교회에서 뺏어가려는 현 연세대학교의 법인 이사회가 “연세대학교는 한국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망발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저의를 의심하게 되며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법인이사회로부터 하나님의 학교인 연세대학교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앞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처럼 선교사들은 전도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당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무엇보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성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으니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선교지에서 다만 학교세우는 일에 치중하다가 자칫 본말이 전도되는 선교의 목적보다는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본래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하는 일이 많다고 부정적이 시각으로 말하는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1878년 미국 남 감리교회 선교사로 첫 번째인 리드(C F Reid 1849-1915)선교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봉사 활동보다는 차라리 복음전도 사업을 우리 선교부의 주된 특징으로 삼고자 한다. 중국에 이어서 여러 기관 학교 병원 등이 가장 유능한 사람들과 많은 돈을 소모하였었다. 좋은 학교와 병원은 물론 훌륭한 기관 사업이다. 그런 나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업가운데 지극히 적은 비율만이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아 왔으며 또 복음 전도 사업에 치중하는 선교부가 수천에 달하는 성도들을 헤아리는 데 반하여 그러한 기관 사업에 치중하는 선교부는 겨우 수백의 신도들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 왔다.”
이 같은 입장은 신학교육정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가 규정한 신학 교육 정책을 보면 첫째로 목사는 영적인 경험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성경 말씀을 핵심적으로 가르치되 기독교 중심의 역사와 지리를 철저히 교육시킬 것이며. 세 번째로 목사의 교육정도는 한국 교인의 지적 수준에 상응하게 할 것이지 지나치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서로 어울리지 아니할 정도로 높은 교육을 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당시의 선교사들이 교육에 관한 입장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낯 설은 한국 땅에 와서 해야 할 사명은 교육을 시켜 문명인을 만드는 일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 천국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전도에 합당한 교육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니스켓 선교사는 “그들의 사역자는 항상 그들에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외쳐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선교회의 공식입장은 ‘불신자는 전도하고 신자는 교육시키다“였습니다. 비록 형평상 불신자의 입학이 허용된다 해도 전체 학생수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에서 기독교 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신학과 신앙성숙이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사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옛 부터 얼마나 교육열이 심하였었는지를 간과한 일로서 그 후 김구 이광수 이동휘 등 많은 지식인들과 애국인사들이 교회를 떠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인의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알리기 위해 혼신의 열정으로 한국인들을 가르쳐 수많은 인재들을 기러냈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01년부터 전주 선교부에서는 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부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 우리는 선교사들이 선교회가 책정한 계획에 따라 남녀 학교를 각각 하나씩 새우기를 권하는 바이다”라고 학교설립의 뜻을 밝히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남녀 사역자들을 확보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고 학교 설립에 동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2년부터 전킨 선교사는 군산의 그의 서재에서 소년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여 영명학교라하고 그의 부인은 안방에서 소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멜본딘 여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멜본딘이라 함은 미국 버지니아주 랙싱톤 장로교회의 부인들이 불 선교사부인의 소식을 듣고 학교 신축기금을 모아 보내왔는데 이들 부인들이 멜본딘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군산에 근대 교육의 산실이 탄생되었고 오늘에 까지 학교 교명은 각기 제일고등학교 영광여자고등학교라고 바뀌었지만 수많은 군산 인재들이 해마다 알알이 영근 열매로 한국 사회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군산영명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킨 선교사는 미국 여러 교회에 학교 건물 신축과 교육 선교사를 보내 줄 것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에게서 모금이 속속 오게 되자 중등부를 신설하고 3층 건물과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서양식 3층 건물은 군산 지방에 명물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도 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병탄으로 식민지 교육이 실시되자 교회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폐교되는 일이 있게 됨으로 이런 학교들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군산 영명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남 한산에 있는 한영서원 중등부 학생들 전원이 영명학교로 옮겨 왔습니다. 이로서 영명학교는 활기를 띠고 학생들의 수업 받는 소리가 교실 밖 널리 군산 지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제는 보통 6년과 그리고 고등부 4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매 학년 모든 과에 공통으로 교육을 시켰으며 세계사 수학 자연과학 기독문학 작문 음악 체육 및 율동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영명학교에는 투철한 민족주의로 무장한 애국애족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부터 박연세, 김인전, 문용기, 문정관,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등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1919년 3월 5일 호남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전킨 선교사 부인은 남편을 따라 전주로 옮겨 감으로 얼 선교사 부인이 멜본딘 학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대로, 불 선교사 부인인 엘비 선교사는 자기의 모교인 멜본딘 대학에 군산 여학교의 건축을 호소하였습니다. 엘비 선교사의 호소를 들은 멜본딘 대학의 졸업생들이 모금운동에 나섰고 심지어 멜본딘 대학의 여학생들은 아침식사를 금식하여 모은 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빵 장사를 하여서 얻어진 이익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돈으로 구암에 아담한 신식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산 여학교라고 부르던 학교명을 앞에서 소개 하였듯이 멜본딘 여학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멜본딘 여학교의 교사로 성경과목을 전킨 선교사 부인의 조사였던 김부인이 담당하였는데, 김 부인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당시 학생들이 존경하던 선생님 중 한 사람 이였습니다. 그 외 안락 소학교 및 군산 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오긍선 박사의 두 여동생이 서울에서 고등과 교육을 이수하고 군산에 내려와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학교사정이 어려울 때에 엘비 교장의 초청으로 멜본딘 여학교의 학감으로 김영배 영수가 취임을 하였는데, 김영배 영수는 일찍이 서울에서 예수를 믿고 고향에 내려온 큰 형님 되는 김규배의 명령에 못 이겨 교회를 다니며 영명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 군산지역 선교사의 조사로 활동하다가 3.1운동에 가담하여 피신생활 한동안 하던 중 멜본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충남 서천 출신인 윤석구는 만주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군산에 와서 멜본딘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1937년 신사참재를 반대하다가 학교가 폐교가 되고 선교사들이 강제로 귀국하게 되자 윤석구는 한약 종사업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후 건국준비위원과 독립촉성회 군산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제헌국회의원이 되고 초대 체신부장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전북 서부 지방에 3,200명의신자와 50여개의 교회당이 있어 교회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보통학교가 21개소였고, 학생수가 436명이였는데 비록 학생수가 51명이었지만 여학교는 멜본딘 밖에 없었습니다. 디샤트 여선교사가 풍금을 치며 노래를 가르치자 여학생들은 신기하게 여겼고 이웃사람들도 구경을 왔습니다. 케슬러 간호선교사는 위생을 담당하였는데 여성의 생리변화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여학생들은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었던 일이라 신기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엘비선교사는 가사를 담당하여 재봉틀을 가르치고 얼 선교사 부인은 자수 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멜본디에서 배운 여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개 교회에서 지역의 복음화와 신문화 운동 야학운동을 이르킴으로 당시 침체된 민족의 활기를 북돋아 나가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일부 여학생들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 부설 간호학교로 진학하여 간호사로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성이 장인택 조사의 큰 딸인 장한나를 들 수 있는데 멜본딘 보통학교와 서울 정신여학교 고등과를 거쳐 멜본딘에서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최주현과 결혼하여 옥구지경에서 살았는데 자녀들을 잘 키워 모두 한국 의학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군산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온 선교사들은 보다 원활한 선교 활동을 위해 선교사들 간에 일정한 선교지를 나누어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산 서북부지역인 옥구 익산 그리고 김제 부안을 불(부위렴)선교사가, 군산 동북부 지역인 부안 부여 서천 옥구 익산은 헤리슨(하위렴) 선교사가 담당하고, 데이트 선교사는 전주의 서남부 지역인 임실 남원 금구 정읍 고부 태인 부안 등을 선교지로 하였으며, 레이놀드선교사는 전주 서북부지역인 김제 고부 흥덕 조촌 이서 등을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전주 동남부지역은 윈(Winn,Samuel Dwight 위인사. 1880-1954 1911년 전주선교부에 부임)선교사가 남원 인실 진안 장수, 클락(Clark, William Monroe 강운림 1881-1940 1909년 전주에 부임)선교사는 무주 상관면 장수 진안등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멕커첸(마로덕)선교사는 전주 동북부 지역과 군산 서북부 지역을 맡아 익산 보령 서천 진안 무주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 할 멕커첸(McCutchen 1973-1960) 선교사는 호남 초기 선교사에서 가장 혁혁한 선교활동을 한분 중에 한분이라 할 것입니다. 멕커첸 선교사는 미국 사우드 케롤라이나주의 비숖빌리라는 곳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콜럼비아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 후 1902년 미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전주지역 선교사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연례 모임의 결정에 따라 멕커첸선교사는 헤리슨과 1년 동안 함께 선교지를 돌며 견습 과정을 거친 후 1904년 9월부터 전주 동북부지역 선교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위로는 무주에서 아래로는 목포 제주에 까지 그의 활동 범위는 참으로 크고 넒어 그만큼 그의 선교역사는 괄목 할 만 하였습니다.
장로회 서기에 그가 선교 활동하여 세운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902년 이경문씨와 함께 무주군 석정리 교회, 1903년 정정보씨를 구원하여 시작된 익산군 삼기면 서두리 교회, 오경수씨와 10여인을 구원시켜 1905년 전주 소룡리 교회를 세웠으며, 같은 해 최재순 씨를 입교시켜 익산 선리교회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조사 최대진씨의 전도로 장경태 정찬씨와 함께 초가 4간을 매입하여 시작한 삼례교회가 있습니다. 1906년에는 이춘경씨를 구원시켜 시작한 전주 신리교회, 같은 해 유기택 박태호씨와 함께 금산 지방도 교회를 세웠으며, 장덕선씨를 전도하여 세운 전주 율곡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1907년엔 전의 심은택씨를 구원하여 전주 구개리 교회와 김원중씨를 믿게 하여 익산 황화정교회를 세웠으며 금산 읍내교회를 최대진 조사와 함께 학습인 7명을 세우며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문호순 김병섭씨를 믿게 하여 진앙 대불리교를 시작하였고, 미 감리회 전도대에 의해 복음을 믿은 이기황씨와 금산 하가리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황준권 이원지씨를 전도하여 진안 세동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본 교회에서는 1902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며 지금은 새로 짓고 이사하였지만 1902년에 세워진 옛 교회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1908년에는 김찬중 한윤성을 전도하여 조사 김성원씨와 함께 무주삼가리교회를 설립하였고 조사 방승섭씨와 함께 진안 읍내교회를 김성두를 구원하여 무주 이목리 교회를, 이찬경 박정숙을 구원하여 조사 정찬신씨와 함께 전주 구정리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909년 멕커첸 선교사는 오경수, 오경목씨를 구원하여 소룡리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교인수가 많아지자 교회를 건축하여 전주 종리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같은 해 최국현씨를 구원하여 전주 남문외 교회가 시작되었고 1913년에는 이덕봉씨를 구원하여 금산 역평리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멕커첸 선교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교도 여러 곳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전주 봉동면 낙평리에 영흥학교를 세웠고, 금산 읍내에 금산 신광학교를 세웠으며 역시 금산군 진산면에 육영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주 선교부 대지 내에 전주 성경학원을 개설하여 농촌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장로회 사기에는 멕커첸에 세운 교회로 21곳으로 소개 하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실상 멕커첸 선교사가 맡은 구역은 전북 26개 군 가운데 11개 군을 맡아 1년 중 4개월을 순회전도를 하였습니다. 멕커첸 선교사의 선교 표어는 “항상 준비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자! Make ready and get down among them."이였습니다.
1905년 9월 선교보고서에 이런 보고 기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멕커첸과 최대진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2-3개월씩 머물면서 복음사역을 하였다. 이 지역은 7개 군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 우리의 사역은 열매를 맺고 안정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규모의 그룹들이 주일날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잦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된다. 이들 중 두 곳에서는 몇 사람이 초신자 반에 들어갔고 한곳에서는 두 명의 세례교인이 나왔다”
“다섯 개 군으로 구성된 이 지역에서 멕커첸과 그의 조사 최가 활동하였다. 그들은 두 달 가량 함께 활동하였는데 조사 최는 이 지역의 개척을 위해 한 달 간 더 일했다. 많은 복음서적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사역을 맡은 다른 복음 전도자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지방 사마리아지방 유대지방 때로는 두로와 시돈 베레아 지방에 까지 복음 전파 하시느라 바쁘게 다니셨던 것처럼, 멕커첸 선교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전라도 각 읍면리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으니 전도북도 어느 곳이든 그의 발자국이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남전교회와 동련교회의 처음 역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익산시의 교회가운데 가장 오랜 교회로 함라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고, 대체로 1897년에 설립된 남전교회가 가장 오랜 교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킨 선교사에 의해 전도 받은 7명의 신자가 50리길 군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내 1897년 10월 15일 오산면 남전리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 예배 장소는 이윤국씨 집에서 남차문 교회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99년 3월 15일 전킨 선교사의 집례로 김정현 이성일 부부가 익산지역 최초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전교회를 말할 때에 1919년 4월4일 익산 솜리 독립만세운동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전교회 최대진 목사를 비롯하여 김만순 김필례 장경춘, 군산영명학교 교사 문용기(문정관으로도 불린다)와 학생 박영문 박도현 등 교인 150여명이 하얀 한복들을 입고 솜리 장날에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눠 받아 허리춤과 바지가랭이에 감추었다가 솜리 장터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 헌병대가 긴급 출동하여 시위를 강제 진압을 하였습니다. 당시 문용기는 일본 경찰이 칼로 오른 팔을 내려치자 왼손으로 태극기를 집어 들어 계속 만세를 불렀고 다시 왼손까지 내려치자 땅에 뒹굴면서 마지막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순국하였습니다. 군산 구암교회의 삼일운동기념관에 전시된 당시 문용기 열사가 입었던 피묻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삼일 만세운동으로 수많은 열사들의 피뿌 림이 민족의 제단에 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문용기 열사의 순국의 역사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 옵니다. 이 때 박영문 장경춘 등도 함께 현장에서 희생되었습니다. 한편 솜리 장터에 참여하지 못한 30여면 남전교회 교인들이 별도의 만세 시위를 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전교회 교인들의 4. 4 만세운동은 후에 이승만대통령이 높이 평가하여 친필로 순국선열비문을 하사하였는데, 6.25 전쟁 중 북한군이 이 비석을 넘어뜨리고 “李承晩書”(이승만서)라고 새긴 부분을 깨뜨려 없애려 한 흔적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는 전북 익산 남전교회를 4·4 솜리 만세운동 기념 기독교사적지로 웅포 제석교회와 함께 지정하였습니다. 역사위원장 정재훈 목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국가와 민족, 사회에 큰 공헌을 했던 교회”라며 지정 이유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애국 애족의 전통을 이은 남전교회는 6.25 전쟁의 시련도 고스란히 겪은 교회였고, 1970년대 기독교 인권운동의 중심에 섰었으며, 80년대 반부패 운동에도 당당하게 나섰던 교회로 민족의 자주독립과 해방, 6.25한국전쟁의 참화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현대사란 수례를 직접 이끌어 간 교회이기도합니다.
남전교회에는 귀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교회에 있던 종을 당시 남전교회 출신을 미국에 유학중에 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 요청을 하여 옮겨 오던 중 전쟁으로 일본에 잠시 머물었다가 1951년 남전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 종은 1884년에 제작된 종이였던 것입니다. 이 종 표면에 그 제작년도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남전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에 이 종을 탄일종으로 울린다고 합니다.
다음엔 황등 동련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1년 옥구군 서수면 신기리 장평마을에서 송군선 장휘서 정문주 백락규 장치오 여러분들이 지성록씨 집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1902년 황등면 동련리로 옮겨 옴으로 동련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련교회를 시작할 때 백낙규(1876-1943)씨의 도움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백낙규씨는 전남 승주군 송광사 옆 뱃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낫습니다. 그는 어린시절 송광사에 들어가 심부름을 하다가 동학에 귀의하여 송광군 이음리에서 동학접주로 1893년 동학혁명군에 참여하여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머리카락 판돈으로 소쿠리 장사를 하며 장터마다 찾아다니다가 황등 장에서 해리슨(하위렴)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평교회를 다니다가 동련리에 자리 잡고 살면서 동련교회 설립에 자신의 사재를 털어 교회당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 세례를 받으니 동련교회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1909년부터 불(부위렴)선교사와 함께 학교를 세워 운영하던 중 정식으로 사립학교인가를 받아 1910년 8월 15일 학교를 시작하여 예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구원의 원동력이라 하며 농민들을 깨우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계동학교는 1935년까지 4년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105명이 졸업을 하고 1936년 부터는 6년제로 1947년까지 운영되어 121명이 졸업을 하여 수많은 우국충정의 인사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백낙규씨는 1915년 12월 15일 동련교회 장로로 장립을 하였습니다. 자녀로 6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백흥길씨는 젊은 시절 주유천하하며 지내다가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고향에 돌아와 늦게 1959년 장로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장남 백종근이 목사가 되어 현재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 백기선씨는 역시 1986년 8월 장로로 장립하였으며, 백낙규씨의 삼남 백형남씨는 제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그의 부인 강복식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백운선씨는 호남대학 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광주가나안교회 장로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가문에 천대에 이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백낙규 장로님의 가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두교회를 소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두교회의 시작은 이러하였습니다.
1898년 11월 삼기면 서두리에 정정보씨가 기도처를 마련하므로 교회의 첫발걸음을 내 디디었습니다. 그 후 멕커첸선교사의 지도하에 강화철씨등에 의해 1903년 10월 10일 원서두 546번지에 초가 3간을 빌어 정식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서두교회에는 애국지사 박병렬 장로(1881.3.5-1940.9.22)님이 있으십니다. 박병렬은 전북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에서 한의사 박영호와 방씨 사이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박병렬은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도마리교회, 방주간교회, 와리교회, 부송교회 등의 매서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익산 4.4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비록 적은 수이지만 서두교회 교인들은 박병렬을 따라 참여하였습니다. 박병렬은 곧 체포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중에서 밤낮없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멕커첸 선교사가 이리경찰서에 박병렬을 면회하여 위로하고 일걍에 박별렬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일경은 매우 고깝게 여겼지만 다른 도리 없이 석방하였습니다. 박병렬은 1935년 5월 7일 서두교회 장로로 장립을 합니다. 그 후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다시 심기주재소에 체포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그만큼 일본제국주의 생명이 단축된다.”면서 고함을 지르자 일경은 모진 고문을 하였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 출소하였지만 고문의 후유증이 심해 1940년 9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병렬장로의 후손으로 박요셉 장로, 온누리교회 박수웅장로, 전주 박인출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습니다. 1986년 7월 17일 후손들과 교인들이 힘을 모아 엘리사기도원에 박병렬장로 순교비가 세워져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후대에까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석교회는 지난 달 소개한바가 있지만 좀 더 부언하여 소개합니다. 1899년 궁말교회(구암교회)에서 불(부위렴)선교사의 달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엄주환, 강진회, 송원규, 강두희, 강문회 등이 복음을 받아들여 군산선교부 전위렴 선교사에게 교회설립을 허락받고 1906. 12. 25 엄주환의 사랑채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4월 8일 군산으로 이주한 홍종필씨가 14칸 곱패집을 희사하므로 십자가를 설치하고 교회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곰배집이라고도 하는데 곱은자집이란 뜻입니다. 집모양이 ㄱ자집으로 경기지방 말로서, 평안도 지방은 꺽음집, 충청도 지방에서는 곱패집이라 부릅니다. 곱패집은 평면의 모양이 ㄱ자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용마루도 ㄱ자로 꺽인 형태입니다. (표면상 외양간이나 부엌을 덧댄 ㄱ자 모양이어도 용마루가 하나인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등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석교회는 꺽인 부분에 강대상이 놓이고 남녀가 서로를 볼 수 없는 ㄱ자 구조의 예배당이다. 해리슨(하위렴)선교사가 파송당회장으로 교회를 지도하여 1909. 4. 30 사립부용학교를 세우고 100여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몇 주전에 소개 드린바대로 홍종필씨는 군산개복교회 장로가 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1923. 1. 22 개복교회 3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1930. 9 제19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임기도 하였습니다.
ㄱ자집은 20세기 중반에 쓰인 말로서 처음부터 ㄱ자집으로 불린 것은 건축 시기가 20세기 중반 이후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엄칠중씨는 강경 3.1운동을 주도하였고 제석교회 교인인 이형오는 함라 웅포장날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엄주환씨는 6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엄창섭씨는 강경장날 독립선언서를 일고 태극기를 흔들었다하여 2년 징역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 8월 14일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또 둘째 종석씨는 4남4녀 4년 터울로 낳았는데 엄기택 장로와 엄기순 장로 그의 아들이 엄법용장로 그리고 엄기묵목사님이 있습니다. 엄기순장로는 1950년 6.25한국전쟁시 고등학생으로 전투에 참석하여 낙동강 전투로부터 압록강에까지 이르러 혁혁한 공훈을 세움으로 금성무공훈장을 받았으며 현재 제석교회의 은퇴 장로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석교회는 남전교회와 함께 익산지역 삼일운동 사적지로 인정되어 있어 후대들에게 나라사랑 민족구원의 신앙의 본을 깊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B. 해리슨(William Butler Harrison, 하위염;河緯廉1866-1952)선교사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해리슨 선교사는 1866년 미국 캔터키에서 출생하여 캔터키 센트럴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또 루이스빌 의대에서 1년간 의학 공부를 한 다음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894년 남장로교회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파송 받고 제 3진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서울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와 풍속을 익힌 다음 1896년 유진 벨(Eugene Bell 배유지)선교사와 함께 나주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의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유진 벨선교사는 오웬(C C Owen 오원)선교사와 함께 목포로 내려갔고 해리슨 선교사는 전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1897년 전주 서문 밖 은송리에서 약간의 배운 의술로 진료소를 개설하여 의료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전주에서 매 5일 마다 열리는 장날 인근 장터마다 헛간 2곳을 마련하여 복음을 전하니 장터에 몰려온 사람들은 장터의 독특한 들뜬 분위기와 아울러 서양사람 구경을 하고 싶은 호기심과 그가 어눌하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즐거워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선교사는 장터 선교사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산에서 활동하던 전킨 선교사가 건강상 문제로 전주로 옮겨오게 되자 대신 해리슨 선교사가 군산 선교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1903년 부인 데이비스가 별세한 후에는, 선교지역을 아주 군산으로 옮겼습니다. 전킨 후임으로 군산 영명학교 책임자, 남전교회(1904-1908 및 1916-1917), 개복교회(1905-1911),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웅포교회, 동연교회, 무주읍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리슨 선교사는 군산지역뿐 아니라 익산지역까지 선교활동을 하면서 익산 고현교회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06년 6월 12일 당회장 해리슨 선교사와 서기 양응칠 조사의 집례 하에 고현 교회 첫 번 학습문답이 있었습니다. 고현교회 당시 첫번째 당회에서 학습문답을 하였는데 당시 당회록(제1권 3쪽)에,
“1906년 6월 12일 온 교우가 회집하고 하위렴목사와 양응칠조사가 참석하야 기도하고 학습문답을 하였는데 그 중에 정사옥 김경장 김문선 삼씨를 시행의 가합한 결과를 좇아 학습을 세우다”
라고 하였고
다시 12월 2일에 두 번째 당회가 회집하여, 당회록(제1권 4-5쪽)을 보면
“하위렴목사와 양응칠 조사가 회집하야 기도하고 문답을 한 중에 김분순 김순녀 박순서댁 오원집댁을 합당한 결과를 좇아 학습을 세우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학습교인들은 양응칠 조사를 통해 6개월간 열심히 성격과 요리문답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등을 공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엔 박분순을 비롯하여 5명이, 1908년에는 김자윤을 비롯하여 4명이 1909년에는 오덕근을 비롯하여 3명이 1910년에는 정대식을 비롯하여 6명이 학습을 받는 등 해마다 그 수가 점점 많아져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 12월 9일 처음 세례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레자는 정사옥 김경장 김문선 김분순 김순녀 박순서댁이였습니다. 또 이날에 첫 번 유아세례가 있었는데 바로 오원집의 아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리슨 선교사는 군산과 익산 특히 고현 교회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인근 지역을 쉴 새 없이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며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체력이 쇠진하여 요양 차 1928년 귀국한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1902년 메커첸 선교사가 곰티제를 넘어 올라가 첫 번 이른 곳이 진안군 부귀면 원세동이였습니다.(여기 년수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멕커첸 선교사가 곰티제를 넘어 오느라고 흘린 땀을 이 곳에 이르러 닥고 있을 때 생전 처음 본 서양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 앞에 모여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어찌 놓칠 것입니까? 멕커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황준곤 이원지 손치문 한선명 최사행 이 다섯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10월 3일 진안군 부귀면 부암리 샛터 초가 삼간에서 원세동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장경태 전도인이 교회를 이끌었으며 1907년엔 최사행 전도인이 이어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 9월 17일 최초로 설립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 소속교회로 1908년 9월엔 전북노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1921년 봄 교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현 위치인 원세동리로 교회를 옮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세동교회는 군 생활 30년을 중령으로 마치시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의 길에 들어온 김형기 목사의 헌신으로 복음의 향기가 펼쳐 있습니다. 비록 시골 한적한 마을이지만 목사님과 장로 여섯분 그리고 80여 성도들이“작은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마25:40, 레19:18)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벗, 노약자들의 벗, 다음세대들의 벗, 불신자들의 벗이란 4벗 운동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부귀면의 북부에 운장산(1,126m)이 위용을 자랑하며 솟아 있고 주변에 부귀산(806m), 옥녀봉(737m) 등의 700m 내외의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석리를 찾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산골 속에 복음이 들어와 백여 년 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놀라움과 이 나라 방방곡곡에 퍼져간 복음의 능력에 새삼 찬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거석리에 거석리 교회 지금의 부귀중앙교회로 시작되기는 1900년 부터였습니다. 그러닌까 정식으로 멕커첸 선교사가 진안지역에 선교의 발을 내 딛기 이전에 이미 이곳에 복음의 자리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1900년, 18세 이원일이 어머니의 간질 병환을 고치기 위해 군산에 서양의사를 소문 듣고 궁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환 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받아 거석리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기도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02년엔 대지 200평을 교회 부지로 헌납하여 초가 교회를 건립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거석리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발간한 총회사진명감을 보면 부귀중앙교회의 창립일을 1900년 5월 1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록은 이원일의 장남 이원태 장로(면장)와 교회의 첫번째 장로인 이원칠 장로의 장남 이삼암 장로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처 교회로서의 전도적 사명을 다하고 있었으리라고 부귀중앙교회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27쪽).
비록 산곡 교회였지만 진안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1911년 9월18일 대구 남문예배당에서 있었던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제 5회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안 거석리 교회에서 4간을 새로 건축하였는데 그곳은 산중인고로 교인들이 심히 가난하야 재정이 군졸하오나 육신의 힘과 영혼의 믿음은 재정이 풍족한 것보다 나음으로 간략히 예배당을 건축하여 낙성까지 되었사오며....”
진안지역의 선교활동을 맡은 멕커첸선교사가 이곳을 말을 타고 다니며 교회를 돌보다가 1911년부터는 클라크선교사(Clark, William Monroe 1881-1940)가 교회를 지키었습니다. 클라크 선교사는 1907년 프린스톤 신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 8월 28일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전주에 부임하여 왔습니다. 그는 1923년 기독교서회 이사로 서울로 가기 전까지 14년 동안 거석리교회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1911년 10월 15일 전주서문밖 예배당에서 있었던 전라노회 1회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강운림(클라크)씨에게 진안 장수 무주 용담 각 교회 당회 일을 맡김
2. 강운림씨는 방언(한국말)이 아직 부족하오니 마로덕씨와 동사 목사 될 일
그리고 1912년 궁말교회에서 있었던 전라노회 2회 회록을 보면 클라크 선교사의 요청으로 조사 김응규 김성식 장경태에게 첫번째 학습문답을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석리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여 1918년 통계표를 보면 주일학생이 48명이고 세례교인이 40이요, 예배인원수가 85명이었으면 1932년엔 교인수가 127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원일과 함께 궁말 교회에 가서 병 치료를 받은 이원칠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었습니다. 이원칠은 1920년 교회 장로로 장립되며 거석리교회의 기둥 역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로 이정상목사와 증손 이한진 장로가 전주 중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충성스런 일꾼 가운데 이관익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형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조상대대로 믿어 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후손들이 거석리교회를 커다란 바위처럼 든든히 서서 섬기고 있는데 차남 이정환집사 자부 김기옥 권사가 있습니다.
이원일 집사는 한마을에 살고 있던 이관익 집사와 교회예배를 마치고 돌아 올 때면 항상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에 나가 밭일을 하고 돌아 올 때‘새벽부터 우리’찬송을 즐겨 부르곤 하였습니다. 이원일의 직계 후손 중 목사로 전주 노회장을 지낸 증손자 이주백 목사(배월교회)등 11명이 배출되었고 사위로 신흥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장평화장로와 효자로 소문난 부귀면장을 지낸 이영태 장로 등 여러분이 있습니다.
진안군 주천면에 가면 명덕봉(846m)과 명도봉(863m)에 의해 형성된 기나긴 협곡 운일암반일암(雲日岩半日岩)에 이르게 됩니다.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부쩍 거리는 국민 관광지입니다. 예로부터 깍아지른 절벽 밑으로 길이 없어 하늘과 바위, 나무만 있을 뿐 오가는 것은 구름밖에 없다하여 운일암으로 불렸고, 하루 중 햇빛을 반나절밖에 볼 수 없다 하여 반일암이라 불렸다 합니다. 100여년까지 만 해도 이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을 찾아 볼 수 없는 이곳을 대불리라 하는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불리라 함은 운일암 반일암 28경 중 제12경으로 바위 위에 바위를 포갠 모습이 마치 부처 같다고 해서 붙여진 대불바위(大佛岩)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대불리에 문도순 김병섭이 전주에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멕커첸 선교사와 함께 1903년 5월24일 대불리 처사동에 기도처를 마련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대불리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그 후 이름을 대광교회로 교회이름을 바꾼 것은 아무래도 대불이란 이름이 교회이름으로는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궁벽한 산속 마을 까지 찾아와 복음을 전한 멕커첸 선교사에게 다시금 숙연함과 고마운 마음을 가져 멕커첸 선교사를 기리는 마음으로 앞서 소개하였지만 다시금 소개하려 합니다.
멕커첸 선교사는 유니온 신학교 출신인 레이놀즈, 전킨, 해리슨, 오웬, 불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로 활발하게 선교 활동한 소식에 영향을 받아 나도 조선에 가선 복음을 전하리라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던 중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한국선교사로 지원하여 1902년 11월 7일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1904년 전주 선교지부로 전주를 중심으로 동북부지역을 맡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멕커첸 선교사는 호남의 사도바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멕커첸 선교사는 나름대로 농부 선교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씨뿌리기입니다. 길거리 서당 장터 사랑채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잡초제거와 물주기입니다. 처음 방문한 곳을 다시 방문하여 성경을 더 가르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교정해 줍니다. 다음은 수확하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얼마간의 이해를 하는 삶들은 정식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입니다. 지역교회를 맡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농부선교법이 대 성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멕커첸 선교사의 선교사역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에 의해서 1905년까지 4교회가 세워지고 14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906년엔 17교회가 세워지고 50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907년엔 21교회가 세워지고 201명이 세례를 받았고, 1908년엔 37 교회가 세워지고 273명 세례를 바았으며, 1909년엔 56개 교회가 세워지고 451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멕커첸 선교사는 평양신학교에서 오래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전주남자성경학교의 교장으로 30년간 봉직하였습니다. 그의 지도하에 수많은 교회지도자가 배출되어 호남지역 교회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홀로 이룩한 수많은 교회들을 돌볼 수 없음으로 여러 한국인 조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원필 이경필 최대진 김응규 김선식 장경태 등이였습니다. 태평양전쟁으로 송환된 뒤에도 한국인을 위한 그의 선교활동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면서 한인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일본군 포로들 중에 한인 전쟁포로를 위한 포로선교사역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이진구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그는 결코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아님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를 여러 번 당하였고 때로는 과도한 선교활동으로 인해 심각할 정도로 건강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안식년이 되어 귀국하여서는 혈압강장제를 복용하고 식이요법과 수혈까지 받아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선교 열정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수많은 ‘신앙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1946년 71세 나이로 선교사로서 활동을 끝내었지만 계속 한국의 교인들과 교류를 가졌으며 1960년 85세 나이로 소천하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Sumter)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가 멕커첸 선교사의 그 선교의 열정과 한국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운일암 반일암 골자기를 타고 흐른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대광교회 안에 여전히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안군은 전라북도의 동부권에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폭 10∼20km의 서남방향으로 아주 가까이 평행하며 고원을 이루는 해발 200∼400m의 산간 구릉지로서 약 82.4%의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진안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멕커첸 선교사가 곰티재를 넘어 부귀면 주천면 정천면을 거쳐 드디어 진앙읍에 교회를 세운 때가 1908년 10월 1일이였습니다. 당시 웃새골 백남인 성도의 집에서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오늘의 읍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1909년에는 백남인 성도가 목조 새 예배당을 건축 헌납을 하였고, 1928년 백남인 집사를 초대 장로로 장립하여 당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고문인 5선 의원 정세균 의원이 읍교회의 집사로 충성을 하고 있는 이야기 또한 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 읍교회를 지나 멕커첸 선교사는 계속 무주로 금산으로 장수로 복음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멕커첸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전북 동부지역에 선교활동을 하기 이전 해리슨 선교사(B.Harrison)는 무주에 거주하는 이경문이라는 사람을 통해 무주에 들려 풍남면(지금의 무풍면) 마을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무주 지역 첫 번째 교회 돌메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멕커첸 선교사가 1904년 10월 횡천면(지금 설천면) 두길리에 들어와 김재순 청년과 7,8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덕유산 아래 두길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일찍이 1896년 적상산(1034m) 아래 누구에 의해서 인지 알 수 없지만 괴목리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늘갓에 한윤성 전찬중 그리고 적상면 새내의 이상종이란 젊은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돌메기 교회와 괴목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1903년 3월 5일 이상종이 살고 있는 새내마을 적상산 자락에다 기도처를 마련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3년 여 만에 교인이 1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자 기도처가 비좁아 나이 40이 넘도록 자녀가 없는 전찬중 집으로 옮겨 가니 1906년 봄 마침 적상면 새내마을을 찾아 와 김성교 이명준씨와 복음을 전하던 멕커첸 선교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늘갓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0년 4월에 늘갓교회는 마을 뒷동산에 15평 새 예배당을 지어 전찬중 집에서 옮겨오니 교인들의 감개가 너무 컷습니다. 멕커첸 선교사가 한동안 교회를 돌보다가 그후 클락(William Monroe Clark 강운림) 선교사, 불(William F Bull)선교사 그리고 이자익 목사 등이 무주를 찾아와 읍내 북리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부흥회를 열자 수많은 마을 청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청년들이 무주 삼일운동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늘갓 교회에 전일봉이란 청년이 두길리 교회의 김재순을 만나 복음을 받은 후 함께 전주로 나가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앞서 부흥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삼례교회의 손희중과 함께 무주장로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전일봉은 김재순과 함께 손희중을 만나 나라의 독립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주민들에게 애국정신을 깨우칠 학교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6년 마을에 삼숭학교를 설립하고 전이삼씨가 교장으로 그의 조카 전일봉이 교사로 학교운영을 맡아하게 되었습니다. 진안 장수 금산에서 까지 학생들이 몰려와 80여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 소식이 이곳 무주에까지 전해왔습니다. 손희중, 김재순, 전일봉 그리고 전주 신흥학교를 다니던 전일봉의 동생 전기봉, 그는 3월 13일 전주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잠시 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태선 ,서재순, 그림솜씨가 뛰어나 태극기를 그린 한판익, 학생 신재희 ,박찬수 등이 거사를 논의 하여 1919년 무주장날로 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일찍이 서둘러 나뭇짐이나 달구지 장짐에 태극기를 숨겨 음내 장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오후 2시경 전일봉이 장터 중심에 서서 일본놈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자고 외치자 사람들이 ‘옳소’하며 크게 박수들을 쳤습니다. 손희중과 김재순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장터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재희 박찬수가 무주 보통하교 학생 수 십 명을 데리고 나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헌병 분견대 무장 헌병들이 출동하자 송희중 김제순 전일봉 서재순 등은 읍내 주변 산으로 주민들을 모아 횃불 시위를 벌리니 이산 저산에서 봉화와 함께 불야성을 이루며 밤새도록 대한독립만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7회에 걸쳐 참여한 사람들이 3,500여명이었고 21명이 부상을 당하고 19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일본 당국은 무주읍교회와 늘갓교회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였습니다. 1920년 1월 전일봉은 옥고를 치루고 나와 교회를 이끌다가 1936년 장로로 장립을 하게 됩니다.
전일봉 장로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할 이름이 바로 그분의 아들 전영창 선생입니다. 전영창선생은 미국의 크리스탈교회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목사와 동기동창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의 모 대학에서 총장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거창에 들어가 폐교직전인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하고 한국의 사학의 명문학교로 성장시켰습니다.
늘갓교회는 다섯 번째로 1970년 12월 신축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이름을 오늘의 여올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인 무주구천동의 입구에 두길 교회가 있습니다. 멕커첸 선교사가 돌메기교회(석항교회) 이경문 조사와 함께 두길리 마을에서 전도함으로 1904년 10월 10일 두길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두길 교회에는 김도순 김재순이 김만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경문조사가 신앙을 지도하였습니다. 이석하 무풍교회 원로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1908년 교인들이 초가 한 채를 매수하여 교회당 건물(두길리1181번지)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멕커첸 선교사는 두길 교회에 순회하여 올 때마다 1, 2주간을 머물면서 교인들에게 성경공부를 시켜 학습과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1909년부터는 멕커첸 선교사 다음으로 클락(강운림)선교사가 순회하면서 성경공부를 시켰고 1912년부터는 최대진 전도사가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교인수가 3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두길 교회 평신도로서 김재순 김화순 정춘화 김도순 손성찬 이상열 등이 교회를 섬기었는데 김재순씨가 더욱 열심을 다해 섬기었음을 지난 여울교회를 소개할 때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무주장로교회는 1907년 멕커첸 선교사에 의해 설립이 되어 앞서 소개한 손희중씨가 교회를 지도하였습니다. 1914년 봄 클라선교사 불선교사 이자익목사가 한 주간동안 천막전도 집회를 하여 많은 무주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음을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무주장로교회는 심태형 원로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71년 무주지역에 최초로 스라브교회를 건축하였고 오늘날 무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무주에 가면 관광객들이 꼭 한번은 가보는 나제 통문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경계지역으로 이 통문을 통해 양국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였습니다. 이 나제 통문을 지나면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입니다. 이 증산리에 무주의 최초의 교회인 돌메기 교회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부르는 증산교회가 있습니다. 무주지역의 최초로 1900년 4월 3일을 증산교회는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부터 한양에서 귀양살이 온 사람들이 살던 터전으로 금평이란 곳에 숯 굽는 숯 터가 있어 이곳에 이경문 오택근 등 몇 주민들이 일찍이 복음을 듣고, 이경문의 집을 기도처로 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증산마을 건너편에 철목마을에서 무풍장이 설 때면 교인들이 장에 나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무풍면 대덕산재를 넘으면 경북 금릉군 나면 송곡1리에 살던 김창서씨와 부인 서마은씨의 가정이 증산으로 이사와 망근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도우니 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멕커첸 선교사가 이 산골까지 찾아와 이경문씨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경문씨를 앞세워 두길교회 여올교회 안성 이목교회 무주읍교회 등을 순회하며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증산교회가 날로 확장되어 1905년 대덕사라는 사당을 매수하여 수리해서 교회당으로 삼았습니다. 1913년 증산교회의 세례교인이 70명이요 학습인이 20명으로 100여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경문 집사를 중심으로 김중현 집사와 각 20환씩 헌금을 하고 과부 장씨가 황소 한 마리 그 외 교인들이 30환을 모금하여 1913년 “보성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크라크 선교사가 교사 이사행의 월급 절반을 부담하니 14명의 학생이 이 학교에서 신 학문을 배우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918년 이경문 집사는 장로로 장립하고 교회로 충성하다가 1936년 3월 13일 소천 하였습니다. 이석하 무풍교회 원로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이경문 장로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으며 베드로처럼 과격하여 호랑이라는 별명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고 의리와 정의감이 강한 분으로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여 소나 집을 매매할 때면 의레히 이 장로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증산교회 출신으로 전 국무총리 황인성 씨와 김광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황인성씨는 2010년 10월 소천 하였는데 그의 유언대로 증산교회 앞 큰 고목나무 아래 수목장을 지냈습니다. 증산교회는 무주지역의 첩첩산중에 있으면서도 그 지역의 어머니교회 역할을 하였으며 수백 명의 신자와 16명의 장로 17명의 목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오늘날 증산지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국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최고의 사과출산 지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위암말기였으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건강을 다시 찾은 김명환 목사님이 증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백산맥이 남으로 힘차게 뻗어 내리고 무룡궁재를 분기점으로 하여 노령산맥의 종산인 장안산(1237m)이 서쪽으로 높이 솟고 여기서 다시 뻗어 관둔산과 남산이 대호의 자웅처럼 마주 보는 자리에 장수읍이 있습니다. 특히 수분마을 뒷산 신무산을 따라 2.5km 올라가면 금강의 발원천인 뜬봉샘(비봉천)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성계가 이곳에 와서 단을 쌓고 백일 기도를 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제단을 쌓고 기도한지 백일 째 되는 날 오색찬란한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소리가 있어 “새 나라를 열라”라고 하여 조선을 세우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단 옆에 을 짓고 옹담 샘물을 받아 천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뜬봉샘이 발원이 되어 금강과 섬진강이 나눠 흘러내립니다. 이처럼 산세가 수려하고 또 지역이 깊어 복음의 첫 발걸음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은 전라북도 여러 군 가운데 인구도 가장 적으니 1970년에는 7만 6천명 이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지금은 23,000여명에 불과 합니다. 기독교 인구도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교회수가 48개 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지 인근 지역보다 복음이 들어오는 일도 7,8년이나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어느 지역보다 넘치고 있으니 뜬봉샘 같은 축복이 수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풍성히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남에서 4km정도 장계 쪽으로 가면 540m의 싸리재가 있습니다. 이 재를 넘으면 마치 다른 고장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장수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데 계남은 눈이 내리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 1237m 장안산 아래 백화산과 법화산을 양옆에 낀 금계포란의 형국인 동리가 있습니다. 신전리는 음신마을과 양신마을로 나뉘어 양신마을에는 소위 양반 지주들이 사는 부자 동리였고 음신 마을은 그들의 소작농들이 살던 가난한 마을 이였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에 1907년 11월 29일 클락 선교사가 찾아와 복음을 전하고 박래문, 문귀선, 김사일, 박승기, 정세갑이 함께 신전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래문은 서당에서 글을 배워 그 동리에서 유식한 사람으로 알려져 클락 선교사가 성경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잘 풀어 설명을 하곤 하였습니다. 박래문은 나무하러 갈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다녔고 논과 밭에서 일할 때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곤 하였습니다. 전주 서문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을 때에는 먼 길을 기름과 소금을 짊어지고 찾아와 말씀을 배웠습니다.
1910년 신전리 509-1의 한옥 한 채를 교인들이 구입하여 새 예배당으로 삼았습니다. 이 신전교회 출신으로 목사가 11명이었고 수많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중에 1936년 장립을 받은 박진서 장로님은 전주로 이주하여 1946년 전주 금암교회를 그리고 1953년엔 전주 북문교회를 1980년에는 전주 영광 교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신전교회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때부터 아름다운 신앙이 전승되고 있으니 전교인이 철저하게 성수주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체로 농촌교회는 농사일에 바쁠 때는 주일 성수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거나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전교회 교인들은 오로지 성수주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평소에 밤이 늦도록 일을 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현재 음신 마을의 주민 70여 가구의 백퍼센트가 교회에 출석하고, 심지어 밭에 일을 하다가 매일 정오시간에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현재는 차임벨)에 맞추어 기도를 하니 마치 밀레의 그림에서 보는듯합니다. 1960년 교인들이 마을의 서낭당을 부서 버리고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우리나라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종탑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신전교회 교인들에게 특기할 일은 지난 2005년 5월 19일 마을 한복판에 정자를 멋들어지게 세웠는데 그 상량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말씀을 한글로 써 올렸습니다. 이처럼 음신 마을에 신전교회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는 군 소재 중심에 장수교회가 있습니다. 장수 교회는 1911년 4월 23일 멕커첸 선교사가 여기까지 찾아와 복음을 전하니 설립된 교회입니다. 지금 60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장수군의 중심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한의 국토면적은 99,284㎢로 한반도 면적의 45%로 그 70%가 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뒤로 마식령산맥 차령산맥, 조령 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광주산맥이 줄지어 마치 등뼈에 붙은 갈비뼈 형상으로 서해바다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노령산맥 끄트머리에 마치 정맥과 동맥이 흐르듯 만경강과 동진강이 흐르고 그 언저리에 넓은 문전옥답이 펼쳐져 있으니 호남평야의 중심지인 김해평야가 뱃살을 자랑하듯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호남평야의 경지 면적은 약 18만 5000㏊로서 전라북도 총 경지의 약 72%를 차지한 이곳에 살고 있는 인구는 180만 명으로 전라북도 총 인구의 약 7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해 바닷가에서 서쪽을 바라다보면 수평선이 보이고 동쪽을 바라다보면 지평선이 보이는 김해는 풍요롭고 넉넉한 인심이 예부터 수많은 정치가 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호남의 4대 경치로 변산반도의 녹음(邊山夏景), 내장산의 가을단풍(內藏秋景), 백양사의 겨울설경(白陽雪景)과 함께 母岳春景이라 모악산의 봄 경치를 말하고 있는데, 모악산은 김제의 머리처럼 우뚝 서 김제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모악산은 해발 793.5미터로 예로부터 엄뫼, 큰뫼로 불려왔는데 산 정상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쉰길바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과 같아서 모악산(母岳山)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호남평야에서 모악산을 바라보면 마치 어머니가 양팔을 벌려 사방 몇 백 리의 너른 들판을 감싸 안고 있는 듯 하여 고은 시인은 그의 시 모악산에서 "내 고장 모악산은 산이 아니 외다 / 어머니외다"라고 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악산은 계룡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민중 신앙의 모태로 널리 알려 져 있는 호남의 영산입니다.
모악산 아래 미륵불교의 본산이 금산사가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고, 동학혁명의 기치를 든 전봉준 역시 모악산이 길러낸 인물입니다. 모악산 일대를 신흥종교의 메카로 만든 강증산(姜甑山)은 이산 저산 헤매다가 모악산에 이르러 천지의 대도를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악산 아래 증산교 교파의 하나인 법종교 본부가 위엄 있게 세우 져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도 증산교 본당 인근에 큰 규모로 수련회장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유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제시 교동 38번지에 있는 벽성서원은 김해 김씨 종친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여기에는 김유신을 중심으로 고운 최치원, 죽강 김보, 점필제 김종직, 탁영 김손일 등을 모시고 제향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신풍동에 팔효사가 있는데 3대에 걸쳐 효자가 배출되어 이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나주 나씨 가문에서 태어난 9효자의 효행을 길이 빛내고 후세에 가르침을 주기위해 건립하였습니다. 팔효사 안에는 수령 550년된 은행나무가 아직도 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890년대 호남에는 3개의 성당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주교로 귀의시켰습니다. 되재(완주 화산), 나바위(익산 망성), 수류(김제 금산) 본당이 있습니다. 노령산맥의 주봉인 모악산과 상두산, 국사봉에 둘러싸인 수류본당은 1907년 건축됐고 이듬해 인명학교(이후 화율국민학교)가 세워짐 한문과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수류본당의 관할은 김제, 부안, 정읍, 순창, 고창, 담양, 장성까지였습니다. 수류는 한국뿐 아니라 동양권에서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한 지역으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 수는 무려 11명으로 김영구, 정재석, 서정수, 김반석, 김영일, 범석규, 박영규, 안복진, 박문규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화율리의 다섯마을인 상화, 평지, 시목, 율치, 복호주민이 모두 천주교회의 신도들이라고 합니다.
곁들여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김일성의 시조 묘가 모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 김정일 집무실에 그 시조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셋째 아들이 마의 태자인데 그는 금강산으로 갔고 넷째 아들 김은열(설)은 완주로 와서 살았는데 그의 7대 손 김태서라는 분이 전주김씨의 시조로 그분의 무덤이 지금 모악산 산기슭에 있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김태서 조상의 34대 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김일성의 시조만은 아닙니다. 현재 전주김씨 되는 분들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심이 가득한 모악산 아래, 김제 황금벌판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오늘날 풍성한 군산 익산과 더불어 인구 비례 30%가 넘는 복음화 열매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농촌 지역인 호남의 사람들은 인화 단결이 그 어느 지역보다 돈독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드리는 것도 그런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전도로 고넬료의 가솔 모두가 복음을 믿었듯이, 바울이 선교하러 다닐 때 루디아 온 가족이 복음을 믿었듯이 어느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온 가족이 그리고 일가친척까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순교를 당할 때도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그 가족 모두가 함께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순교자 1000명 중에 850명이 호남 사람들입니다.
전주선교부의 테이트 목사는 모악산 너머에 있는 김제의 팟정이(두정리)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여 1905년 팟정이 교회를 세웠고 군산선교부의 젼킨목사는 궁말에서 말을 타고 지경리(옥구 대야)를 거쳐 만경강을 배로건너 김제군 공덕면으로 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가 1897년 5월 3일 김제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송지동 교회입니다.
송지동은 온통 솔 나무로 가득하여 이리보아도 솔 나무 숲이요 저리 보아도 솔 나무 숲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송지동에 살던 송원성과 강문성은 군산 장날이 되면 배를 타고 만경강을 건너 지경을 거쳐 군산의 장터를 오고 갔었는데 어느 날 군산에서 전킨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킨 선교사와 함께 송지동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전도 결과 송지동 문학선 씨 댁 대청마루에서 송원선, 강문성, 최치국, 문학선, 문종삼 씨 외 다수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가 1896년도였습니다. 그 후 믿는 자가 증가하여 1897년에 교회당을 신축하여 ㄱ자형으로 남녀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세례 교인 15명이 되는 1897년 5월 3일을 기해 정식으로 교회 설립이 보고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제군 송지동 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선교사 전위렴이 당지에 래도하여 전도함으로 송원선, 강문성 등이 시신하고 신자 점차 증가한지라. 지시하야 예배당을 신축하니 교회가 완성하니라"
그래서 송지동 교회에서는 이것을 역사적인 자료로 하여 1896년을 설립으로 하던 것을 1897년 5월3일을 교회설립일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간행된 “The Missionary" 1902년 4월호 194쪽에 'Home-Coming to the Morning calm Contry'(주명준교수가 쓴 원평교회 100년사 93쪽)의 제목으로 전킨 선교사가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6년전 우리가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의혹에 가득한 눈초리의 군중들이 우리를 에워 쌓던가!...형제자매들중 약간은 16마일에서부터 찾아 왔고 한 형제는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찾아 왔다. ... 나의 두 번째의 군산지역 봉사는 규칙적으로 5곳...군산, 통사동(옥구군 개정면 통사리), 만자산(지경리), 남차문(오산면) 송지동...에서 행해졌다. 그 마지막 언급한 곳(송지동)은 군산에서 16마일 떨어진 것으로 전주선교부로 가는 길가에 있다’
주명진 교수는 전킨 선교사의 글에 약간 착오가 있다고 합니다. 송지동이 군산에서 16마일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30마일 떨어져 있었고 또 전주 선교부로 가는 길가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킨 선교사가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배풀고 할 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갔습니다. 그 후 전킨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귀국 시에는 해리슨 선교사, 불 선교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특별히 불 선교사는 전북지역 교회들을 많이 돌아보며 복음을 전했는데 1937년까지 수시로 송지동교회 당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05년 7월 30일 오후 1시 송지동교회 최초의 장로인 최치국의 장로 장립식이 있었는데, 이때 참석하여 예배드린 신도가 87명이었다고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치국은 송지동의 건너편 청하면 대신리에 거주하던 교인으로, 송지동교회에 다니면서 장로가 되었고, 그의 아들 최봉중도 뒤에 송지동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1908년 9월 7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예수교 장로회 제 2회 노회가 있었는데 최치국장로는 전주의 김필수장로 매계교회의 최중진장로 임피만자산의 최흥서 장로와 함께 호남지역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송지동 교회로부터 1901년에는 익산시 오산의 남전교회가, 1903년에는 봉남면 대송리의 대송교회가, 1933년에는 공덕 중앙교회가, 1955년에는 월현교회가 차례로 송지동교회에서 분립해 나갔습니다. 1991년 3월 19일 8,923㎡의 대지 위에 있던 구 교회를 헐고 연면적 555.24㎡ 규모의 3층 건물로 된 새 교회를 지어 1992년 3월 30일에 준공하고 5월 3일에 입당 예배를 보았습니다
1903년에는 당시 김제군 봉남면 월성리에 교회가 설립 되었습니다. 사기 104쪽에 기록하기를,
‘1903년 김제군 월성리 교회가 성립하다. 先是에 正道가 선교사 전위렴의 전도를 듣고 信敎한 후 예배당을 신축하여 열심히 전도하야 교회 인도자가 되니라’
월성리교회는 설립 된지 2년 만에 월성학원을 설립하였는데, 전주 선교부 레이놀즈 선교사의 어학교사이던 김필수가 처음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몰려오는 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어 다섯 칸짜리 한옥을 건축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신도 수는 적었지만 신학문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만은 강하였습니다. 신학문이라야 한글이 고작이었지만 차차 새로운 학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월성리교회에 뜻하지 않은 일꾼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배운 것은 없었지만, 개화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박금이란 청년이 월성리교회에 첫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박금은 원래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와 함께 김제 지역으로 이주한 뒤 월성리에 자리 잡고 남의집살이를 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후 그는 월성리교회 초대 장로가 되어 월성리교회와 월성리학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915년에 레이놀즈선교사가 당회장으로 있었고 제주도 1호 목사로 1948년 4.3사건 때 순교한 이도종 목사가 시무하였으며 1920년에는 스위코드(Swicord. Donald A 서국태 1921-1949 신흥학교봉직)선교사가 당회장으로 있었습니다.
1903년 4월 10일 주산면 대창리 최윤중의 4 칸 집에서 목요일 밤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대창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죽산면 대창리를 번드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드넓은 마을의 논에 물이 들어오면 머리서 볼 때 해 빛에 반사되어 번들번들하게 보인다고해서 번들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전킨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은 입석리 교회의 이기선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대창리의 이명순 최학성 최학삼 최태산 최윤중이 목요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1906년엔 임덕윤과 최학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더욱 대창교회는 전도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춘성의 집을 매입하여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1908년 3월 군산에서 전주로 옮긴 젼킨 목사와 김필수 장로를 초빙하여 공동 회의를 열고 최학삼을 장로로 선출했으며 뒤를 이어 1910년 4월엔 이명순의 이들인 이재언이 장로가 되고, 1915년에는 동시에 부자가 장로가 되었는데 최윤중과 아들인 최태진이 함께 장로가 되었고, 이어 최경윤, 최경택, 등 16명이 차례로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번드리 일대는 드넓은 벌판으로 농산물의 집산지였습니다. 번드리 서북쪽은 만경 관내인데 구한말 매국노 이완용이 막대한 돈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 바다를 둑으로 막아 거대한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완용이 자기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린봉에서 동진강과 수교천으로 흐르던 물을 보로 막아버리면서 비가 올 때마다 번드리 일대가 홍수 지대로 변해버렸지만 워낙 권력 있는 자라 아무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대창교회 최학삼 장로가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함께 이완용이 막은 수교천 근방의 보를 터 버리니 그 후로는 비가 많이 와도 번드리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학삼 장로는 키가 육척 거구로 언변이 좋고 성격은 대쪽 같아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완용이 최학삼 장로를 고발하여 2년에 걸친 재판이 이어져 마침내 대구고법에서 최학삼 장로가 승소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1911년에는 대창교회 출신인 최학삼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어떤 경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주명준 교수는 신학교육을 재대로 밟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김세열 한국신교선교 백년사강의 1984, 269쪽.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전래 220쪽)
1914년 9월 13일 함흥 신창리 예배당에서 장로회 제 13차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총회장이 이자익 목사님이였습니다. 이 총회 결의 사항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노회에서 문의한 신학구제 3년 급까지 공부한 최학삼장로를 목사로 장립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는데 대하여는 정치 제14장 6조와 11조를 의하여 해노회가 처리할 것이오며’
당시 5년제 신학교를 3년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의 허락으로 전북노회로부터 최학삼장로는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목사가 된 후 최학삼 목사는 대창교회에서 분립해 죽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명량교회 남포교회 선유도 교회를 개척 교회를 건립하였습니다. 그의 손자인 최현식장로는 신흥건설이라는 큰 건설업체 사장으로 있으면서 1973년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아름답고 독특한 양식으로 죽동교회당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최학삼 목사가 소천한지 1년 뒤 1935년 6월 10일에 대창 죽동 명량 남포교회 공동명의로 죽동교회에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글귀가 다음과 같습니다.(주명준 위의 책 221쪽)
‘서양의 기독교를 이 지역에 전도한 것은 공이 처음입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노령에 이르기 까지 계속 목회활동을 하시다가 생을 마친 뒤 이곳 죽동에서 영원히 반석이 되셨습니다.’
최학삼 장로의 아들 최용한이 임선유씨와 결혼을 하였는데 임선유씨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최 측근이고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영신씨의 친 언니가 됩니다. 최학삼장로의 둘째 딸 최정순은 전주 동부교회를 비롯해 죽동교회 등 이 지역 여러 교회에서 활발한 목회활동을 한 정희수 목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 조카인 최원선이 옥산교회 정공선과 결혼하였는데 정공선은 옥산출신으로 군산 궁말병원 원장 패터슨(Jacob Bruce Patterson 1909-1929활동)의 조수로 의학공부를 하여 김제에 벽성의원을 개업하고 옥산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김제에 신풍교회를 세우고 김제읍 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의사로서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던 정공선 장로는 6명의 사위가 모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큰사위 장태수는 신풍병원을 운영하면서 김제중앙교회 장로, 둘째 사위인 김보라는 서울에서, 셋째 사위 김형록은 부안읍교회 장로로, 넷째 사위 이동신은 김제 백산병원 원장, 다섯째 사위 조용근은 장항교회 장로, 여섯째 사위 민생은 전주 남문교회 장로로 각기 장인의 귀한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제지역에 많은 일본인들이 땅을 구입하여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일본인이 다끼(多木)라는 사람과 이사가와(石川)아런 사람이 넓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대창교회 교인들은 1922년 700원을 들여 132㎡ 규모의 예배당을 건립하는 한편 대창학당을 세워 교장으로 최경택이, 교사로는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의 김선애가 각각 취임하여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안경석이라는 청년이 학생들에게 쌀 한줌씩만 가지고 오면 악기를 살수 있다고 하니 온 교회 교인들이 쌀을 모아 악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안경석 김중화 최준식 이병욱 최태영 홍재일 그리고 후에 최종수장로도 참여 하여 6인조 악단을 경성하였습니다. 대창교회 종소리는 이 지역에 대단히 유명하였습니다. 번드리 넓은 논밭에 종소리가 퍼져 나감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시간을 알게 되고 비상사태를 아려 주기도 하고 결혼예식이나 장례예식도 알려주어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심지어 깡패가 사람들을 괴롭히면 종을 쳐서 사람들이 몰려와 깡패들이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1913년에는 이재언(1872.7.21-1949.9.1) 장로도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후 목사가 되어 1916년 대창교회 첫 번째 위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재언 목사는 대창교회 뿐 아니라 인근 여러 교회도 함께 돌봄으로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재언 목사는 대창교회 초기 신자인 이명순의 아들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에 살다가 1894년 광주 무등산 아래로 이주하였다가 더 좋은 집터를 찾아 김제군 죽산면 명량리 우렁산 아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명당자리를 찾았으니 이는 이기선씨의 전도를 받아 앞서 소개한대로 대창리교회 설립 교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편 모친인 이명순씨는 처음부터 아들 이재언을 목사로 하나님께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끌어 마침내 목사가 되어 대창 모교회의 목사로 오게 되니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명당중의 명당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대창교회는 최학삼, 이재언 목사를 비롯하여 정진철, 안경운, 안상영, 이병상 윤식명 목사 등 약 18명에 이르는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으며, 함태영부통령도 이 교회 출신이고 안 덕윤 목사는 6·25 때 순교하여 한국 기독교사에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리 신광교회의 고 안경운 목사까지 총회장을 4명이나 배출하였습니다.
대창교회 출신으로 이상섭 목사가 있는데 그의 가계에서 목회자가 11명이나 됩니다. 처가를 제외하고 직계 쪽만 이 목사를 포함해 7명이 목회자입니다. 큰형 이상운 목사는 서울 영등포 당일교회 담임이였으며 교경중앙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섭목사는 현재 방파선교회 회장으로 이스람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상당수의 동학교도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학도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자기들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인간 평등과 박애 사상을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人是天 事人如天 人是平等 차별철폐 인상무인 인하무인 등과 무엇이 다른가 비록 완전한 개종은 아니더라도 관군의 추격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네 적어도 위장개종이라도 하는 다급한 처지였습니다. 갑오경장이후 동학교도들은 상투를 자르고 채색 옷이나 검정 옷을 입도록 하는 진보적인 개혁을 선도하였는데, 당국은 “상투 자른 자들은 동학교도들이니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동학교도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므로 동학교도들을 잡아 조사하는 중에 상투를 잘랐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 하면 무조건 석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00년 동학 세력이 집단으로 개종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입석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입석리교회는 작은 기도처 였습니다. 동학농민군으로 동학의 접주인 김국현이 살아남기 위하여 기독교에 귀의를 하고 월천면 입석리 선돌 도로변에 있는 4칸짜리 자기 집을 기도처로 삼으라고 전킨선교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전킨 선교사는 송지동교회 개척을 위해 열심히 이 지역을 찾아 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전킨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은 김국현 구덕삼 이기선 조원배 와 목수 일을 하면서 매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성국 등 몇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기선에게 전도를 받은 이순명 최학성 최학삼 최대삼 최윤증등도 1903년 대창교회가 설립되기 전이라 입석리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국현이 교인들의 밥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교회 헌금을 자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구덕삼이 회계 일을 맡았는데 장부 기재를 몰라 회계장부에 수입만 적고 지출항목을 적지 않은 것이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월봉리에서 오는 교인들이 김국현이 내 놓은 기도처 집을 뜯어다 월봉리에 초가 18평 교회당을 짓고 1908년 10월 1일 봉월교회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입석리교회 교인들이 봉월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그들이 월봉리 사람 이였을 뿐만 아니라 실상 1905년 이곳에 정착한 일본인 마스도미 야스자이몽(升富 이하 승부) 때문입니다. 승부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고베중앙신학교를 졸업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장로였습니다. 그는 농장의 농민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여 대부분 소작 농민들이 봉월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승부장로에 대해서는 정읍지역 교회를 소개할 때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김국현씨도 월봉리로 이사와 봉월교회에 계속 출석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봉둴교회는 신양교회, 유정교회, 농원교회(현 월촌중앙교회) 등을 개척하는 등 지역복음화에 주력해왔으며, 일제강점기 후반인 1940년 경 교인들이 교회 종을 내려 감추었습니다. 교회 종을 징발하러 가던 일본 순경들이 화를 내며 교회당 구석구석을 수색하다 찾지 못하자 종을 감췄다는 죄목으로 윤동석·구봉규 장로와 오해석 집사를 구속하여 핍박하였지만 교인들은 끝끝내 종을 지키였습니다.
현재 봉월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더욱 친화력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관 건축, 학생들 대상 독서실 및 피아노 교습소 운영, 결혼식 장소 무료 대여 등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봉월교회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면장을 지낸 백봉석장로의 아들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 에르랑게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9대 10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초석을 다진 백영훈 박사가 있습니다. 현재 그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창 교회는 1908년 3월 군산에서 전주로 옮긴 젼킨 목사와 김 필수 장로를 초빙하여 공동 회의를 열고 최학삼을 장로로 선출했으며 뒤를 이어 1910년 4월엔 이명순의 이들인 이 재언이 장로가 되고, 1915년에는 동시에 부자가 장로가 되었는데 최 윤중과 아들인 최 태진이 함께 장로가 되었고, 이어 최 경윤, 최 경택, 등 16명이 차례로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번드리 일대는 드넓은 벌판으로 농산물의 집산지였습니다. 번드리 서북쪽은 만경 관내인데 구한말 매국노 이완용이 막대한 돈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 바다를 둑으로 막아 거대한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완용이 자기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린봉에서 동진강과 수교천으로 흐르던 물을 보로 막아버리면서 비가 올 때마다 번드리 일대가 홍수 지대로 변해버렸지만 워낙 권력 있는 자라 아무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대창교회 최 학삼 장로가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함께 이완용이 막은 수교천 근방의 보를 터 버리니 그 후로는 비가 많이 와도 번드리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 학삼 장로는 키가 육척 거구로 언변이 좋고 성격은 대쪽 같아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완용이 최 학삼 장로를 고발하여 2년에 걸친 재판이 이어져 마침내 대구고법에서 최 학삼 장로가 승소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1911년에는 대창교회 최 학삼장로갸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어떤 경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주 명준 교수는 신학교육을 재대로 밟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김세열 한국신교선교 백년사강의 1984, 269쪽. 주명준 전북의 기독교전래 220쪽)
1914년 9월 13일 함흥 신창리 예배당에서 장로회 제 13차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총회장이 이 자익 목사님 이였습니다. 이 총회 결의 사항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노회에서 문의한 신학구제 3년 급까지 공부한 최 학삼장로를 목사로 장립 하는것이 어떠하냐고 묻는데 대하여는 정치 제14장 6조와 11조를 의하여 해 노회가 처리할 것이오며’
당시 5년제 신학교를 3년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의 허락으로 전북노회로부터 최 학삼 장로는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목사가 된 후 최 학삼 목사는 대창교회에서 분립해 죽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명량교회 남포교회 선유도 교회를 개척 교회를 건립하였습니다. 그의 손자인 최 현식장로는 신흥건설이라는 큰 건설업체 사장으로 있으면서 1973년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아름답고 독특한 양식으로 죽동교회당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최 학삼 목사가 소천한지 1년 뒤 1935년 6월 10일에 대창 죽동 명량 남포교회 공동명의로 죽동교회에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글귀가 다음과 같습니다.(주명준 위의 책 221쪽)
‘서양의 기독교를 이 지역에 전도한 것은 공이 처음입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노령에 이르기 까지 계속 목회활동을 하시다가 생을 마친 뒤 이곳 죽동에서 영원히 반석이 되셨습니다.’
최 학삼 장로의 아들 최 용한이 임 선유씨와 결혼을 하였는데 임 선유씨는 이 승만 초대 대통령의 최 측근이고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 영신씨의 친 언니가 됩니다. 최 학삼 장로의 둘째 딸 최 정순은 전주 동부교회를 비롯해 죽동교회 등 이 지역 여러 교회에서 활발한 목회활동을 한 정희수 목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 조카인 최 원선이 옥산교회 정공선과 결혼하였는데 정 공선은 옥산출신으로 군산 궁말병원 원장 패터슨(Jacob Bruce Patterson 1909-1929활동)의 조수로 의학공부를 하여 김제에 벽성의원을 개업하고 옥산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김제에 신풍교회를 세우고 김제 읍 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의사로서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던 정 공선 장로는 6명의 사위가 모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큰사위 장 태수는 신풍병원을 운영하면서 김제중앙교회 장로, 둘째 사위인 김 보라는 서울에서, 셋째 사위 김 형록은 부안읍교회 장로로, 넷째 사위 이 동신은 김제 백산병원 원장, 다섯째 사위 조 용근은 장항교회 장로, 여섯째 사위 민생은 전주 남문교회 장로로 각기 장인의 귀한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제지역에 많은 일본인들이 땅을 구입하여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일본인이 다끼(多木)라는 사람과 이사가와(石川)한 사람이 넓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대창교회 교인들은 1922년 700원을 들여 132㎡ 규모의 예배당을 건립하는 한편 대창학당을 세워 교장으로 최 경택이, 교사로는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의 김선애가 각각 취임하여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안경석이라는 청년이 학생들에게 쌀 한줌씩만 가지고 오면 악기를 살수 있다고 하니 온 교회 교인들이 쌀을 모아 악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안경석 김중화 최준식 이병욱 최태영 홍재일 그리고 후에 최 종수 장로도 참여 하여 6인조 악단을 경성하였습니다. 대창교회 종소리는 이 지역에 대단히 유명하였습니다. 번드리 넓은 논밭에 종소리가 퍼져 나감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시간을 알게 되고 비상사태를 아려 주기도 하고 결혼예식이나 장례예식도 알려주어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심지어 깡패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니 종을 사람들이 몰려와 깡패들이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1913년에는 이 재언(1872.7.21.-1949.9.1.)장로도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후 목사가 되어 1916년 대창교회 첫 번째 위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재언 목사는 대창교회 뿐 아니라 인근 여러 교회도 함께 돌봄으로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재언 목사는 대창교회 초기 신자인 이 명순의 아들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에 살다가 1894년 광주 무등산 아래로 이주하여 살다가 더 좋은 집터를 찾아 김제군 죽산면 명량리 우렁산 아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좋은 집터를 마련하였으니 이 기선씨의 전도를 받아 앞서 소개한대로 대창리 교회 설립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명순씨는 처음부터 아들 이 재언을 목사로 하나님께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끌어 마침내 목사가 되어 대창 모교회의 목사로 오게 되니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대창교회는 최 학삼, 이재언 목사를 비롯하여 정진철, 안경운, 안상영, 이병상 윤식명 목사 등 약 18명에 이르는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으며, 함 태영 부통령도 이 교회 출신이고 안 덕윤 목사는 6·25 때 순교하여 한국 기독교사에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리 신광교회의 고 안경운 목사까지 총회장을 4명이나 배출하였습니다.
대창교회 출신으로 이 상섭 목사가 있는데 그의 가계에서 목회자가 11명이나 됩니다. 처가를 제외하고 직계 쪽만 이 목사를 포함해 7명이 목회자입니다. 큰형 이 상운 목사는 서울 영등포 당일교회 담임하였으며 교경중앙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섭 목사는 현재 방파선교회 회장으로 이스람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상당수의 동학교도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학도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자기들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인간 평등과 박애 사상을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人是天 事人如天 人是平等 차별철폐 인상무인 인하무인 등과 무엇이 다른가 비록 완전한 개종은 아니더라도 관군의 추격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데 적어도 위장개종이라도 하는 다급한 처지였습니다. 갑오경장이후 동학교도들은 상투를 자르고 채색 옷이나 검정 옷을 입도록 하는 진보적인 개혁을 선도하였는데, 당국은 “상투 자른 자들은 동학교도들이니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동학교도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므로 동학교도들을 잡아 조사하는 중에 상투를 잘랐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 하면 무조건 석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00년 동학 세력이 집단으로 개종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입석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입석리 교회는 작은 기도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으로 동학의 접주인 김 국현이 살아남기 위하여 기독교에 귀의를 하고 월천면 입석리 선돌 도로변에 있는 4칸짜리 자기 집을 기도처로 삼으라고 전킨 선교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전킨 선교사는 송지동 교회 개척을 위해 열심히 이 지역을 찾아 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전킨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은 김국현 구덕삼 이기선 조원배 와 목수 일을 하면서 매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성국 등 몇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기선에게 전도를 받은 이순명 최학성 최학삼 최대삼 최윤증 등도 1903년 대창교회가 설립되기 전이라 입석리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국현이 교인들의 밥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교회 헌금을 자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구덕삼이 회계 일을 맡았는데 장부 기재를 몰라 회계장부에 수입만 적고 지출항목을 적지 않은 것이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월봉리에서 오는 교인들이 김 국현이 내 놓은 기도처 집을 뜯어다 월봉리에 초가 18평 초가집터에 교회당을 짓고 1908년 10월 1일 봉월교회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입석리교회 교인들이 봉월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그들이 월봉리 사람 이였을 뿐만 아니라 실상 1905년 이곳에 정착한 일본인 마스도미 야스자이몽(升富 이하 승부) 때문입니다. 승부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고베중앙신학교를 졸업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장로였습니다. 그는 농장의 농민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여 대부분 소작 농민들이 봉월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승부장로에 대해서는 정읍지역 교회를 소개할 때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김국현씨도 월봉리로 이사와 봉월교회에 계속 출석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봉둴교회는 신양교회, 유정교회, 농원교회(현 월촌중앙교회) 등을 개척하는 등 지역복음화에 주력해왔으며, 일제강점기 후반인 1940년 경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종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종을 징발하러 가던 일본 순경들이 화를 내며 교회당 구석구석을 수색하다 찾지 못하자 종을 감췄다는 죄목으로 윤동석·구봉규 장로와 오해석 집사가 구속하여 핍박하였습니다.
현재 봉월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더욱 친화력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관 건축, 학생들 대상 독서실 및 피아노 교습소 운영, 결혼식 장소 무료 대여 등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봉월교회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면장을 지낸 백 봉석 장로의 아들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 에르랑게 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9대 10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초석을 다진 백영훈 박사가 있습니다. 현재 그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군 황산면 들판에 선인동 부락이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부락민들이 여러 퇴폐적인 생활을 하므로 1년 농사를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테이트 선교사(Lewis Boyd Tate 최의덕)가 선인동을 찾아 왔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안 백선이란 사람을 만나자 쪽 복음을 건네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술 담배에 투전까지 좋아하던 안 백선은 단번에 손을 저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기 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지라 어느 날 담배를 말아 피우려고 쪽 복음 한 장을 찢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로마서 5:18-20 말씀 이였습니다.
이 순간 마음의 찔림을 받은 안 백선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아 피우려던 입담배를 다 태워버리고 전주 서문밖 교회로 테이트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된 심정으로 테이트 선교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50리나 되는 전주까지의 길을 다니며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마침 당시 전킨 선교사가 월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보다 가까운 15리 길 월성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1905년3월 15일 같은 마을에 사는 박순경과 함께 초가 3칸을 매입하여 선인동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선교부에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달 성경학교에 안 백선을 입학을 시켜 공부를 시키니 마침내 1908년 레이놀즈 선교사의 위임을 받고 선인동 교회 영수가 되고 박순경은 집사로 충성하기 시작하여 날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박 순경집사는 장로로 임직하게 됩니다.
김제 감옥에 옥리 일을 보는 김 여일이라는 사람이 선인동 교회 소식을 듣고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는 스위코드(Swicord. Donald A 한국명:서국태 1921년-1949년까지 전주에서 활동)선교사가 교회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안 백선 영수가 남의 보증서를 써준 관계로 농토를 다 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주로 이사를 하게 되니 김 영일이 영수 일을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김제 읍내에서 선인동을 오가면서 신앙생활 하던 김 여일은 1910년 옥산리에 옥산교회(김제제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자 1917년엔 김 여일은 하목마을에 임 성용을 중심으로 하목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선인동 교회에 김 익두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한 상용이 은혜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1920년 김제군 용지면에 임상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믿음을 가진 선인동 교회 교인들은 보이어(Boyer Elmer Timothy 1893-1976 보이열 1921-1966활동)선교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1925년 선인동 학원을 설립하여 야학교육을 활발하게 공부 시켰습니다. 그 후 진관리로 교회를 옮겨 진괸리 교회라 부르다가 1970년 4월 7일 황산 들녘의 수문장처럼 높다란 십자가를 세운 동부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1997년 부임한 김 철안 목사가 삶의 안식과 기쁨을 주는 교회로 청소년 신앙운동과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더욱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인동교회를 설립한 안 백선은 전주로 이주하여 서문밖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의 세 아들이 머리가 영특하고 민족애 의식이 투철하여 전주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신흥학교를 다녔으며 둘째 아들 안 삼용은 의사가 되어 태인 읍에서 개업을 하고 태인교회를 섬겼으며 셋째아들 안 상용은 대구의학전문 학교(현 경북대학교의과대학)를 졸업하고 군산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지금까지 세광교회장로, 부인 김 혜경장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는데 큰 딸 안 영신장로는 서울 수도교회에서, 아들 안 영진 장로는 분당한신교회에서 둘 째달 안영인은 일산에서 권사로 셋째달 안 영미는 서울에서 넷째달 안 영란은 전주에서 권사로 각기 열심을 다하여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인동 교회의 안 백선장로가 있다면 임상교회에는 한 상용(1889-1963) 장로가 있습니다.(김수진목사 호남기독교 100년사 259쪽 이하 참고) 한상용은 김제군 용지면 임상리에서 천석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경남 기장의 현감이었는데 은퇴 후 김제로 이주하였습니다. 한상용은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한학을 공부하였으나 나라의 어지러움이 그에게도 미쳐 술집을 드나들며 허랑방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제 읍내에 나갔다가 선인동 교회에서 김 익두라는 목사가 와서 사경회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유명한 평양 불량배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문에 호기심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 당돌하게 한상용은 김 익두 목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는 누가 믿는 것입니까?” “죄인이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한상용은 자기의 죗 된 모습을 생각하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선인동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용지면 임상리에서 선인동 교회까지 가려면 자기가 늘 다니던 주막집을 지나가야 합니다. 주일날 그 주막 앞을 지나가려면 기생들이 돈 많은 그를 그냥 놓아 둘리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끌려 들어가 억지로 술을 마시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믿음라면 철저히 믿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20년 9월 1일 자기 동리 잠실 한 채를 구입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임상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 1500평을 교회 앞으로 등기 이전하고 1926년 22평의 임상교회를 신축하였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임상교회에는 한 상용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작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한상용은 지체 높은 양반 주지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1924년 장로가 되어 자기가 중생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중생학원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니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와 1941년 폐교할 때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학교에 전주신흥학교 출신 오 기준이란 젊은이가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코드 선교사가 중생학교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면 신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오 기준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우리나라 역사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한 상용 장로는 학교건물 옆에 연못을 팠는데 태극기 모양을 파고 주변에 소나무를 심어 괘를 만들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학교가 폐쇄되었으니 그때까지 졸업생이 500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장학금으로 오 기준 선생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전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상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상용 장로 부인 함 연춘은 전주태생으로 기전여학교와 서울 정신여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기전여학교 영어선생으로 재직 중 한상용과 결혼하여 임상리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 연춘은 1919년 3원 전주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에 옥고를 치루기도한 애국여성으로서 임상리 야학교에서 부녀자들을 가리키고 농촌 여성계몽 운동에 앞장을 서 일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 동리에 문맹자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상용 장로는 교회 내에 농우회를 조직하고 자작농운동을 실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부락민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암소로 키우게 합니다. 암소가 자라면 팔아서 송아지 값만 받고 나머지는 키운 농부가 가지게 합니다. 또 받은 송아지 값으로 송아지를 사도록 돈을 줍니다. 이렇게 계속 불려나가 마침내 농토를 소유하게 하여 소작인들이 모두 지주가 되게 하였습니다. 1939년에 임상리 농민들이 임상리 교회 뜰에 <한장로 상룡씨 영원 기념비>를 세웠고, 1941년에는 용지면 반교리 원임상리 농무들이 뜻을 모아 임상리교회 뜰에 <士人 韓相龍 施惠不忘碑>를 세웠습니다. 이 자작농운동 성공으로 임상리 지역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도 전해져 모두 지주가 되니 소작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흉년이나 보릿고개가 와도 여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상룡장로는 헐벗고 가난한 병든 가정이 있으면 아무도 몰래 그 집 문 앞에 쌀가마를 놓아주곤 하였습니다. 1926년 길거리에서 오 갈 데 없는 강정리 노인을 만나 집으로 데려와 사랑채에 모시고 그 노인을 천사가 보내 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침내 그의 사랑채를 한국기독교역사상 두 번째 양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린양로원이 존속이 되어 있으며 양로원에서 매입한 공동묘지에 300기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용 장로의 맏손자인 한 규택 장로가 애린양로원 원장으로 대를 이어 섬기고 있으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 수진 목사는 그의 책 호남기독교 100년사에서 “한 상용장로는 이웃사람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고 늘 말하였으며 물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시로 자기에게 맡겨 주신 것이며 자신은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렇게 많은 땅을 이웃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성경대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헐벗고 병든자를 돌보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담임목사는 박경철목사인데 그는 한신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구약학을 공부하여 귀국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베델 지역의 디아코니아 생태공동체 마을에 영향을 받아 온 터이라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의 권면을 흔쾌히 받아 농촌마을 2004년 임상교회로 내려와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후 박 경철목사는 한신대 교수로 , 2014년 8월 현재 남성수목사 담임)
1904년 3월 1일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에 사는 주 원선이 예수를 믿게 되어 전주의 테이트 선교사의 조사가 됩니다. 그가 대송리에 와서 전도하면서 대송교회가 세우고 영수가 됩니다. 레이놀즈선교사가 대송교회를 맡아 말씀을 전하다가 1921년부터는 스위코드 선교사가 뒤를 이어 농촌 선교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봉남면은 본래 금구 남쪽에 있다하여 남면이라 부르다가 1914년에는 하지면으로 193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봉남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송리가 봉남면 중심에 있게 되었습니다.
김제의 동남쪽 지역을 맡아 선교 활동을 하던 테이트 선교사가 1905년부터 금산면 두정리의 큰 유지였던 조 덕삼(1867-1919)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금산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두정리 일명 팟정이(赤豆)라고 하는데 금산면의 남쪽 정읍이나 태인에서 전주나 서울을 가려면 금산면으로 들어와 팟정이를 거쳐야 했습니다. 팟정이를 지나 청도리와 재를 넘어 전주의 중인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팟정이를 지나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고 선교사들이 남쪽으로 갈 때도 이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도 조랑말을 타고 남쪽 지역 전도를 하러 이곳을 지나면서 이곳에서 하루 밤을 묶게 되는데 하루는 조 덕삼이 찾아와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초청을 합니다. 본래 조 덕삼은 항상 문을 열어 놓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곤 하였는데 그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보아 오다가 오늘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조 덕삼의 할아버지 조 정문은 평양에 살면서 중국 동북부지방으로 홍삼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버지 조 정인은 전라도 김제에 금산이란 곳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금이 많이 나오는 산이다 라는 소문을 듣고 가솔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를 거쳐 만경포구에 내리게 됩니다. 그는 금산 팟정이에 자리를 잡고 사금 광산업을 하면서 역시 장사 솜씨가 대단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자인 조 덕삼이 테이트 선교사를 청하니 테이트 선교사는 뛸 뜻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금산사의 부채 살처럼 펼쳐진 불교의 영역이고 온갖 신흥종교가 들끓는 지역이라 감히 전도할 생각조차 못 가졌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호박을 넝쿨 채 주시니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니까? 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이 종교심이 많은 이 지역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 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한국 교회 전체에 큰 빛을 비추게 하는 일이 되었음을 아직 테이트 선교사는 알지 못 하였습니다.
조 덕삼이 테이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선교사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조 덕삼은 선교사의 희생적인 정신과 용기에 감동을 받아 1905년 봄부터 자기 사랑채에서 조 덕삼 부부, 마부 이 자익, 같은 마을의 박 화서 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팟종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팟종이 교회는 후에 금산교회로 불려 지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1905년 조 덕삼의 과수원이 있는 두정리에 초가삼간을 예배당으로, 10월 10일 조 덕삼과 이 자익이 학습 받은 날을 교회 설립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해 5월 30일 테이트 선교사 집례로 조 덕삼, 이 자익, 박 화서가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성찬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 명준교수가 쓴 연정교회 100년 사에는 예수를 먼저 영접하여 팟종이 교회를 시작한 이는 이 자익이라고 합니다. 이 자익이 처(김선경)와 함께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독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 할머니가 금산사의 여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 김 종규 등 몇 사람들과 함께 “팟종이 모임”을 2년간 지속하며 신앙생활 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익(1882-1959)이 누구입니까? 이 장익은 경남 남해 이동면 탐정리 섬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3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6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어린 이 자익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17살 때에 배를 타고 무작정 섬을 탈출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경남 하동 근처에 도착하여 다시 남원 전주를 거처 금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이 자익을 조 덕삼이 발견하고 자기 집 마부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조 덕삼의 아들 조 영호가 서당훈장으로부터 한문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귀동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조 덕삼이 보고 자기 아들과 함께 정식으로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이 자익이 주인 조 덕삼과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 마치 백조가 날개를 펄럭거리며 창공을 날듯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 교회에 열심을 다하니 주인 조 덕삼과 함께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하인 마부가 함께 교회의 영수가 된다는 것은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봄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907년 조 덕삼을 제치고 이 자익이 먼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시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쇼킹한 일이였고 또 염려스런 일이였습니다.
서울 승동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승동교회에 많은 하층민들이 출석을 하였는데 박성춘이란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양반 교인들이 반발하여 교회를 떠나 안국동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 연동교회에서도 갓바치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 고 찬익이란 갓바치가 장로가 되니 역시 양반 교인들이 반발하여 종묘 인근에 묘동교회를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전주 선교부에서도 마부가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 덕삼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 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자익 영수는 저 보다 신앙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도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 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자익장로를 섬기겠습니다.” 이 조 덕삼 영수의 말을 들은 교인들은 힘찬 박수를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때때로 선교사가 오지 않았을 경우엔 이 자익장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조덕삼 영수는 맨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집에서는 주인과 하인 관계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와 영수로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었습니다.
조 덕삼 영수도 1908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해 4월 4일 부활절 예배 후에 조 덕삼 장로가 헌금하여 세운 ㄱ자 교회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당 모습은 대체로 ㄱ자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분리 되어 앉아 예배를 드렸고 강대상은 꺽어진 가운데 놓았습니다. 일자 교회라 하더라도 남 녀 좌석 가운데 포장을 쳤습니다. 조 덕삼 장로의 의견을 따라 남자석 상량문에 <一千九百八年 戊申陽四月四日陰三月三日>이라 쓰고 이어 한문으로 고후 5:1-6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석의 상량문에는 고전 3:15,16의 말씀을 한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강대상 뒤 쪽으로 목사님이 드나드는 쪽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테이트 선교사가 이 작은 문을 들어 올 때 “주께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마을이 불바다가 되어 모든 집들이 타버렸지만 금산교회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죄익계 사람들이라도 금산교회는 우리교회라 하며 우리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금산교회당은 전북유형문화재 1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07년 예수교회보(11월27일자)에 이 자익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계자 이곳은 금산사가 가까우므로 우상만 섬기고 패속만 숭상하여 전도인을 보면 핍박이 자심하더니 삼년 전에 조 덕삼 씨께서 회개하고 주를 믿은 후 열심 전도하여 사람을 주의 앞으로 많이 인도할 뿐 아니라 먼저 신화 십오환을 내어 초가삼간을 사서 예배당을 삼으니 형제들이 열심 연보하여 그 돈을 갚은 후에 예배당이 또 좁아서 십이 간을 더 늘이옵고 매 주일에 모여 예배 보는 현제자매가 이백 여명이 되오니 감사하오며 세례인이 칠십 오인이요 원입교인이 삼십 구인이 되오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오며 각처 형제자매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 기록에 의하면 조 덕삼씨가 테이트 선교사를 만난 해가 1905년이 나니라 1904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조 덕삼 장로는 이 자익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어 공부하게 합니다. 191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된 이 자익은 초대 최 대진 목사 뒤를 이어 2대 금산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후 이 자익목사는 1925년부터 전국에 20여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1927년에는 경남노회장으로 그 후는 거창선교부 순회목사로 있으면서 남은 한 번도 하늘에 별 따기인 총회장을 1924년 1947년 1948년 세 번이나 장로회 총회 총회장을 하였습니다. 1954년에는 대전신학대학을 설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1958년 김제 원평에 살고 있는 셋째 아들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보다 먼저 조 덕삼 장로는 유광학교(동광학교)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삼나무 심기 운동도 벌리며 농촌 경제를 독려 하다가 1919년 12월 17일 5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사를 지내지 말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이 자익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찬송을 4절까지 다 부른 후 소천 하였습니다.
조 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 세형 장로는 금산교회를 섬기면 국회의원을 10대로 부터 4번이나 역임하였으며, 이 자익목사의 손자 이 규완장로는 대전 제일교회를 섬기며 우리나라 고분자학의 1인자로 카이스트대학교수로 있습니다.
김제군 월천면 연정리에 냉정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앞 야산에 냉정이라는 우물이 있어 마을 이름을 냉정이라 하였습니다. 냉정에서는 여름에는 물이 맑고 시원하였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을 크게 자랑하였습니다. 후에 이야기입니다만 냉정교회를 세운 후 교회 이름이 냉정하다 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구설수를 들었지만 교인들은 계속 냉정교회를 고집하다 결국 1936년에 가서야 보다 따뜻한 정감 있는 연정(蓮井)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906년부터 박사일 박지홍 박중집 김기선 김경집 김병룡 등 여러분이 입석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입석리 교회가 봉월리 교회로 옮겨지자 대창교회로 출석하였습니다. 주 명준 교수가 저술한 연정교회100년사에 연정교회 설립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교수의 기록에 의하면, 박사일은 연정리 월봉마을에 살면서 두레박을 만들어 등에 지고 다니던 중 입석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을에 부자로 알려진 박 중집의 농토를 사촌동생인 박 지홍이 소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촌형제는 본래 동학도로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동학도들을 색출하려는 정부군과 일본군으로 부터 피신할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입석리 교회와 대창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냉정마을에 살고 있는 3 형제 김 기선, 김 경집, 김 영선이 역시 동학도 였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입석리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김 기선의 아내 지변화가 군산에서 전도하러 온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여 동학도로 체포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 변화는 시동생 김 경집과 김 영선을 전도 하여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더욱 연정교회 역사에 지 변화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산 대창리 교회를 다니던 1908년 박 중집과 박지홍은 냉정리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가장 재산이 많은 박 중집이 자기 땅과 재목과 물자까지 다 내 놓아 교회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본래 김 경집은 목수로 여러 교인들과 함께 드디어 1908년 11월 8일(음9월19일) 10평 정도의 초가삼간을 건립하여 냉정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정리 교회가 창립할 당시 얼(A.M. Earle 어아력)선교사가 당회장을 맡았다가 건강상 문제로 귀국하고 1910년부터 1914년 6월 까지 불(부위렴) 선교사가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신자가 적고 넉넉한 재정이 아니라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다가 1917년에 가서야 마루를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뜻밖에 일이 냉정리교회에 벌어졌습니다. 냉정리 교회의 영수로 봉사하던 박 중집이 큰 아들이 죽자 그만 배도를 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박 지홍과 김 기선 그의 아내 지 변화 이렇게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본래 교회 터는 박 중집의 활터 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너편에 과녁을 세우고 뭇 사람들을 데리고 활을 쏘며 술마시고 즐기니 교회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박 중집이 활을 쏘려 활터에 오르니 지변화가 웃 저고리를 벗어 재치고 과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 변화는 활을 쏘려면 나를 쏘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저고리를 벗은 여자를 함부로 끌어 내리지도 못하고 박 중집은 활 쏘는 것을 포기하여 마침내 지 변화는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이 다 떠나 버려 어려운 가운데 있어 이 소식을 들은 최 학삼 장로가 전 가족과 죽동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재건에 힘써 주었습니다. 지 변화는 키도 크고 얼굴도 아름답고 말도 잘해서 선교사들의 사랑을 받아 양 채선과 함께 군산선교부의 그린(Willie Burnice Greene구리인188.5.5 조지아주 뉴에틀란타 커크우드 출생 1919년 내한하여 1960년까지 군산선교부에 소속하여 활동하였으며 영명학교 멜본디여학교와 여자달성경학교를 운영하였다 ) 선교사가 설립한 당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그린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군산 옥구 김제 부안 등을 다니며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최 학삼 장로가 무너진 주춧돌을 다시 새우듯 냉정리교회를 인도하며 흩어진 교인들을 다시 불러 모은 중에 죽산면 홍산리 내촌부락에 샬고 있는 오 봉순 가족이 나와 교회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오봉순은 일본인 농장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많은 농사일을 하여 사람들이 무시 못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 봉순이 교회 올 때마다 조랑말을 타고 왔다고 합니다. 오 봉순이 교회 출석하자 교회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그는 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하다가 교회 나온 이 명수는 당시 9천 평의 논농사를 지으며 일대 큰소리치며 살았는데 그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니 박 지홍 다음 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이 명수 영수는 교인들이 아프면 한 달이고 보름이고 병이 나을 때 까지 교인 집을 찾아가 기도해 주곤 하였습니다. 1928년 김 기선 집사가 소천 하였고, 1929년 7월 29일에는 박 지홍 영수가 소천 하였으니 그의 연세가 61세였습니다. 최 학삼장로는 박 지홍과 입석리 교회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 하여 온 연고로 비록 가난하지만 굳은 신앙심으로 교회를 지키는 모습에 감동하여 냉정리 교회를 돕기로 하였고 막내딸 최 영안을 박 지홍의 큰아들 박 영현에게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박 지홍의 아들 박 영현과 최 영안 부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냉정교회를 평생토록 헌신 봉사하며 섬기었습니다.
장로회 사기(上 p.176) 에 “1909년 김제군 구봉리교회가 성립되다. 先是에 정창화 김기환 김영국 등이 믿고 전도하야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을 新建하니라”
금구현 수류면(금산면)구월리는 구암리라고도 하고 구봉리라고 불렀습니다. 구월리 앞에 얕으막한 산이 있는데 아홉 개의 산봉우리가 초승달처럼 펄쳐져 있다고 구월리라고 하고, 아홉 개 산에 아홉 개의 바위가 박혀 있다고 구암리 또는 구봉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봉리에 테이트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니 구봉리 교회입니다.
조선 시대 조선 팔도를 지나가는 9대 간선도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양 숭례문에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항에 이르는 천리 길(950리)에 이르는 대로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지난다 하여 삼남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주 명진 교수가 기록한 원평교회 100년사에 이 삼남대로를 다음과 같이 소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한양에서 출발하여 공주를 거쳐 삼례에 이르고 여기서 방향을 틀어 부산을 향한 대로가 영남대로이고, 삼남대로는 여기서 발길을 오른편으로 틀어 이서면 원동을 지나 앵성역과 남계리 초남을 지나 은교리를 지나서 모악산 오른 쪽 아래로 나있는 길을 따라 산 중턱을 거쳐 청도원에 다다르고, 여기서 3리를 더 가서 금산면 팟정이에 이르고 다시 십리를 남행하여 금산면 소재지인 원평리에 닿습니다. 원평에서 태인을 지나 정읍을 거쳐 입암면 처원 역에 이르고 노령산맥의 갈재를 넘어 장성에 닿고 영암을 지나 해남 이진항에 닿게 됩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 제주시 관덕정에 이르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거리인 삼남 대로입니다. 이 삼남대로를 따라 남하하며 전도하던 테이트(최의덕)선교사가 팟정이에 와서 조 덕삼, 이 자익을 구원시켜 금산교회가 설립된 이야기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창화, 김 기환, 김영국이 원평 장에서 쪽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 전도를 받고 구봉리에서 십여리 떨어진 팟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팟정이 교회에서는 구봉리 교인들을 위해서 구봉리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임실 심덕면 삼길리 교인들이 모악산을 넘어 50리길을 걸어 나오는 일로 삼길리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였던 때입니다. 테이트 선교사와 교인들이 함께 돈을 내어 초가삼간을 구입하고 구봉리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자 다시 열네 간 초가집으로 등축을 하였습니다. 팟정이 교회에서 구봉리 교회를 분립할 때 한국인 책임자는 이 자익 장로 였습니다. 이 자익 장로는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구봉리에 와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지도하곤 하였습니다.
1912년 최대진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본래 목포교회에 시무하는 윤 식명 목사를 초빙하였으나 목포교회의 위임목사가 됨으로 인해 포기를 하였습니다. 윤 식명목사는 본래 언더우드 목사로부터 구원을 받아 유진벨 목사의 조사가 되어 정읍에서 사역하다가 1904년 테이트 선교사의 조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09년 9월 최 중진, 김 필수, 김 창국과 함께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이 되어 목포교회로 부임하였던 것입니다. 최 대진 목사가 부임할 당시 70여 명 교인이 있었는데 부임 석 달 만에 15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 대진목사는 최 중진목사와 최 광진 장로의 동생으로 1879년 10월 15일 정읍군 덕천면 상학리에서 최 석학의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3형제는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서문밖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형 최 중진 목사는 김 필수, 윤 석명과 함께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읍 부안 고부 고창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유교회 사건이 일어나는 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읍교회를 소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형 최 광진은 목수로 서문밖 교회를 건축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ㄱ자 교회를 지어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후에 서문밖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최 대진 목사는 1899년에 교회를 다니다가 1901년 3월 해리슨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멕커첸 선교에게 발탁되어 전라도 동북부 지역을 순회선교 할 때 조사로 활동하였습니다.
1908년 1월 15일자 예수교신보에 최 대진 조사는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습니다.
“마(마로덕)목사와 같이 도 북동지방 진안 장수 무주 용담 금산 진산 연산 고산 익산으로 다닐 새, 4년 전으로 말하면 10군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하는 이가 없어 재미없이 다니 옵더니 그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각각 주의 말씀 듣기는 스스로 원하오며 또 교회가 수 십 처이며 각 교회로 모이는 수효는 십 인으로 부터 팔구십 명씩 되옵고 예배당은 새로 짓는 곳도 많고 지금 시작하는 곳도 있으며 사서 꾸미는 곳도 있사오며 또 형제자매들께서 열심 연보하와 제직회를 열고 두 사람을 택정하여 전도 하옵더니 금년 가을에 한 사람을 더 택하였사오니 더욱 감사하오며 또 금년에 旱災가 있는 듯하더니 팔백리 지방을 관찰하는 목사와 같이 다니며 본 즉 백곡이 풍성하여 인민들이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을 보오니 하나님의 은혜 더욱 감사하오며 또 수년 전부터 금년 가을 까지 원입교인과 세례를 받는 이를 통합하여 불과 삼백 명 이옵더니 지난번 문답할 때 원입교인이 160명이요 세례 받는 이가 98인이오며 명년 정월부터 몇 교회에서 소학교를 설립키로 작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더욱 감사하오며 각처 교회 형제는 이교회를 위해 기도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멕커첸 선교사의 조사로 열심히 선교활동 하던 최 대진이 1908년 전라대리회의의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12년 5회로 졸업하고 구봉리 교회에 초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봉리 교회는 초대 신자 정 창화, 김 기환, 김 영국과 팟종이교회에서 이사 온 강 평국이 최 대진 목사에 적극 협력하여 나날이 교회가 부흥되어 마침내 팟종이 교회의 왕 순칠과 함께 구봉리교회의 강 평국이 1913년 첫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 명준교수가 저술한 원평교회 100년사에서 강 평국 장로에 대해 소개한 바를 소개하려 합니다. 아버지 강 지업 어머니 이 성녀의 둘째 아들로 1875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강 평국 장로의 첫째 아들은 강덕천으로 군산 백화양조를 창업한 강 정준 장로의 아버지입니다. 1900년 7월 15일 강평국은 금산 팟정이로 이사 와서 1904년 금산교회에 출석을 하여 1906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구봉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는 미곡상을 하는 당대의 큰 부자 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독립운동에도 가담하여 원평 삼일운동을 배후 지도를 하였으니 그의 영향을 받은 이종희가 삼일운동이후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군 장군으로 활략을 합니다(1947년 귀국후 사망). 1977년 정부에서는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1987년 원평에 그의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부인 김 신경은 전주 서문밖 교회 전도사인 박 연원의 딸로서 서울 정신여학교 4회 졸업생으로 갑자기 아내가 죽자 강 평국은 군산으로 이사를 와서 개복동교회를 출석하다 1947년 소천 하였습니다. 강 정준 장로는 백화양조 공장 부지로 마련한 땅을 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신학교 부지로 경기도 용인군 양지면 29만평을 싯가의 절반도 안 되는 대금으로 선뜻 내어 놓았습니다. 강 정준 장로는 가훈으로 보라있는 인생을 살자. 교회 열심히 다니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검소하게 살자 라고 정하였습니다. 강 정준 장로의 6남 5녀의 막내아들인 강 희성 장로가 호원대학교의 총장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 평국 장로의 후손들이 돈독한 신앙으로 각처에서 교회를 섬기며 축복을 받으니 의인의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 대진 목사는 1914년 구봉리 교회를 사임하고 강진의 병영교회와 백양교회를 거쳐 제주도 선교사로 활동하였다가 1919년 당시에는 남전교회 목사로 3.1운동을 주도하였고 서울 묘동교회와 북간도교회를 거쳐 군산 동부교회에서 목회다가가 1942년 6월 3일 38년간의 교역자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구봉리 교회는 금산면의 변두리로 발전의 한계가 있어 기왕이면 면 소재지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하여 교회의 중심인물인 김준기 장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원평리로 옮길 것을 설득하므로 1930년 7월16일 신축 이전하여 원평 교회로 이름을 개칭하였습니다.
이제 신태인 정읍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소개하려 합니다. 김제 부안 완주 고부 정읍 고창에 이르는 평야를 김만경(金萬頃)평야라고 합니다. 동진강(東津江)과 만경강(萬頃江) 유역의 충적평야와 주변의 낮은 구릉성 침식평야로 이루어진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이미 백제시대(비류왕 27년 서기 330년)에 축조된 저수지 둑인 벽골제(碧骨堤) 등이 있을 정도로 일찍이 벼농사의 중심지였으며, 사질양토가 많아 벼농사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던 호남의 농민들은 결코 풍요롭지 못하고 늘 가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리학자인 최 영준 선생은 “국토와 민족 생활사”(1997 한길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남평야의 범위가 현재보다 훨씬 좁았으며, 바닷가의 들은 장기(獐氣)가 많고 관개시설의 혜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여 한해와 염해를 자주 입는 곳이 많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들판보다는 약간 내륙 쪽의 고라실(구릉지와 계곡이 조화를 이룬 지역)에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바닷가의 들(갯땅)에는 주로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였다.(중략) 기계화의 수준이 낮은 농경사회에서는 홍수의 피해가 크고 관개가 어려운 대하천보다 토양이 비옥하고 관개가 용이한 계거(溪居)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살피지 못한 조선 시대 관리들의 탐욕과 학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은 항상 피폐한 상태 였습니다. 따라서 옛 부터 이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저항”이란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저항이 내면화 되고 종교적으로 승화되어 미륵불교가 성행하고 동학과 증산교 보천교 그리고 원불교에 이르기 까지 신흥종교가 시작되고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특히 정읍은 분명 '혁명의 땅'입니다. 반외세 반봉건의 깃발을 높이든 혁명, 우리나라 근대사의 시작을 알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었기 때문입니다. 1892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의 학정과 부패에 이기지 못한 이들은 항상 가슴 한켠에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제 아비의 송덕비를 세운다고 천냥의 돈을 거두었고 황무지에도 세를 매겼고 사람을 잡아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가둔 다음에 돈을 받고서 풀어 주는 등 그 행패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게다가 1893년에는 이평면에 있는 저수지인 만석보를 다시 쌓는다고 돈을 걷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가을이 되어 만석보가 완성되고 농민들이 추수를 하자 처음에 걷지 않겠다던 '보세'를 칠백 섬이나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이평면 부근의 주민들이 이듬해인 1894년에 이평면 조소리에서 훈장을 하던 전 봉준을 앞세워 진정서를 냈지만 돌아온 건 감옥신세뿐이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여 관청을 습격, 조 병갑을 쫓아내고 만석보를 부숴버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들불이 타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 사람들에게 갑오년의 역사는 “동학비도”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이런 역사의 울분을 마음 깊숙이 되새기어야 하는 비통한 아픔이 넓은 황금벌판에 질퍽하니 젖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읍의 사람들은 늘 미륵을 기다려 왔고 새로운 개혁을 바라보았지만 그런 그들의 기대는 번번히 부서져 버리고 대신 그들에게 찾아 온 또 하나의 아픔은 일본의 침탈이였습니다.
일본에서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란 자가 나타나 아주 치밀한 농장 운영체계를 세워 악랄한 착취에 내세우니 농장의 총면적은 군산을 비롯한 익산, 김제, 부안, 정읍 등 5개 지역에 4000여㏊(1200여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가 부렸던 구마모토 농장의 소작농 수만 해도 무려 3000여 세대 2만여 명이었고, 모두가 우리의 농민들이었습니다. 구마모토는 소유한 농장에서 소작인들에게 7:3이란 고리의 소작료 등을 착취하며 군산을 비롯한 호남평야의 쌀 수탈하여 매년 800만석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흉년이 오면 농민들은 소작료를 내고 나면 먹을 식량이 없어, 소작료를 줄여달라고 사정하면, 일본 지주들은 여지없이 주재소에 끌려가 얻어맞고, 주모자는 감옥에 가, 이듬해 소작지를 뺏기고, 따라서 살아가기 어려워, 男負女戴로 (남자는 등에 짐을지고 여자는 머리에 짐을 이고), 소작쟁이를 한 한 많은 우리민족 우리농민이 살지 못하여 남부여대하여 고향을 버리고 만주로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백제시대 정읍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로 “정읍사”라는 노래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달하 노파곰 도다샤 어리야 머리 곰 비취오시라 아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다리 져재 너러신고요 어긔야 즌듸를 드듸 욜세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전주 장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달이 상징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순박하고 지순한 사랑의 마음이 달에 의탁되어 나타난 이 노래는 '달'을 절대자 혹은 천지신명에 가까운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바로 민속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 ‘달’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던 전통적인 수호신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달로, 이 노래에서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도와주는 절대자의 의미가 함축되어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달이기에 남편의 귀가 길과 아내의 마중 길, 나아가 그들의 인생행로의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정읍 사람들에게 달보다 더 환하게 해처럼 다가온, 그리고 언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가 끝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낮 설은 서양 선교사로부터 듣게 되었으니, 그들 앞에 복음이 달려 온 것입니다.
그 낮 설은 외국 선교사는 바로 테이트 목사였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전라북도 만경강 남쪽 거의 전 지역을 선교지로 순회 전도하면서 거의 9년간 35개 지역의 1,500명 이상의 입교인을 벋었으니 아마도 한국 초기 가장 큰 선교의 금자탑을 세웠다고 할 만 합니다. 테이트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읍지역의 선교활동에 그를 도와 그 이상의 역할을 한 조사가 있었으니 바로 최중지이란 사람입니다. 후에 그는 제2회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내려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역사에 처음으로 선교사에 반발하여 선교사로부터 교회를 독립시켜 자유기독교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정읍지역의 첫 교회는 1900년 3월9일 최 중진에 의해 세워진 매계교회 입니다. 그러나 매계교회 이전에 태인면을 찾아간 최 중진은 어느 사랑방을 빌려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김 수진목사님은 <호남선교100년과 그 사역자들>의 기록을 보면, 최 중진이 태인 어느 양반집 사랑채에 하룻밤 신세를 지던 중 그 집의 머슴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집 주인이 사랑채 앞을 지나다가 이상 소리를 듣고 사랑방 문을 여니 최 중진이 머슴들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호통에 머슴들은 다 물러갔지만 최 중진은 여전히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주인이 최 중진을 바라보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 기세가 꺽기게 되었습니다. 최 중진이 주인을 두고 전도하니 결국 주인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이 양반집 사랑방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 태인 현은 유학이 매우 성황 하던 곳이라 유생들이 최 중진을 강제로 몰아내고 아예 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박해를 받고 물러난 바울을 심정으로 최 중진은 인근 매계리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계리가 태인면 소속이지만 당시에는 함보면 소속이었습니다. 전주에서 태인으로 이어지는 국도변에 태인면이 있고 태인에서 정읍으로 가는 국도변에서 동쪽으로 칠보산으로 가면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매계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계리가 아니고 매화리였으며 매화락지라하여 풍수지리상 명당자리라고도 합니다. 최 중진은 테이트선교사와 상의하여 매계리 전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계리 전도도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이미 최 중진이 태인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쫒겨 났다는 소식이 매계에도 전해져 최 중진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중진은 변장을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 모습으로 매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이씨 문중과 권씨 문중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기도하던 중 문중 중 약한 문중을 먼저 전도하리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마을의 유생들의 계속되는 훼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매계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최중진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애국의식을 고취하고 학도가를 가르치며 한글과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자 소문의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하던 유생들도 그리고 전에 쫒겨 났던 태인현 사람들도 매계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매계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들은 전주 선교부 선교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직접 매계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매계교회에 3000명이 모였다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최 중진은 매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태인 정읍 부안 고창 등지로 선교의 영역을 점점 넓혀 갔습니다.
최 중진이 누구입니까? 최 중진은 정읍군 고부에서 최 석학의 장남으로 위로 두 누이와 아래로 최 광진 최 대진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최 광진은 서문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고, 최 대진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시베리아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금산교회에 초대목사가 되었습니다.
(*최중진 최광진 최대진 삼형제 사진)
최 중진은 두 동생과 함께 동학 혁명에 동참하였다가 매부가 있는 순천에서 잠시 피신을 하였습니다. 다시 고부에 돌아와 테이트 선교사에게 전도 받아 기독교로 귀의하게 됩니다, 최 중진은 테이트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태인 정읍지방 전도에 매진하며 장로가 됩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 9월 6일에는 평양 장대현예배당에서 열린 제3회 독 노회에서 김 필수, 윤 식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태인 매계 고부 천원 등 여덟 곳 교회의 당회 권리를 맡아 열심히 교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사가 된 지 4개월 만에 평소에 마음속에 싸여오던 문제들이 있었으니 군산 전주 등 직접 선교사들의 지도를 받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1910년 1월 5일 전주에서 열리는 북전라대리회에 자신의 회의 불참사유를 통보하며 5개항을 서면으로 제의하므로 소위 ‘최중진의 자유교회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출한 5개항의 서면청원서는 다소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였지만 그의 주장은 매우 당당하였습니다. 그 가 제시한 다섯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채택이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가 제출한 5개항의 서면청원서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입교인에게 지키라는 현교회의 규율이 너무 엄격하니 이를 버리고 학주인(學主人-오늘의 학습교인 격)제도를 세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자유롭게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를 믿고 배우도록 하라.
② 군산지방에 편입시킨 부안지방을 그곳과 인접한 내가 맡고 있는 지방에 합병하여 줄 것이며 이뿐 아니라 묵은 밭과 같은 고창 무장지방을 나에게 맡겨 기경(起耕)토록 하라. 1∼2년 내에 일으킬 것이다. 나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전도구역을 넓혀 달라.
③ 내가 맡은 지방에 고등학교 하나를 세워서 주님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나라를 위하여 교육사업에 책임을 갖게 하라.
④ 교회마다 상구(常救)위원 두 사람씩 두어서 교회 이름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하게 하라. 육신이 먼저 있으니 물질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 없이 말씀으로 함보다 사랑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사회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사회는 교회의 밑천이다.
⑤ 기왕에 나는 은혜받은 바 있으나 금번 은혜를 한번 더 받고자 하니 나에게 집 한 채를 사서 줌으로 내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라.
이러한 제의에 대리회에서는 특별위원으로 김 필수 레이놀즈 최 흥서로 정하고 최 중진의 청원은 ① 배은(背恩) ② 배약(背約) ③ 분쟁(紛爭) ④ 무지각(無知覺)함 ⑤ 불복(不伏) 하는 일임으로 거절하며 그가 맡고 있는 당회권리를 보류한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최 중진은 불복하고 독립의 뜻을 나타내고 장로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대리회와 선교사들에게 반발하여 자주교회를 선언한 최 중진 목사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가진 레이놀즈 목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여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권면하며 화목을 이루자.”라고 제의하고 다시한번 더 김 필수 마로덕 서 영선을 특별위원으로 뽑아 최 중진 목사에게 보내 위로와 화목을 권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가 마음을 이미 굳혔으므로 위원들의 방문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기성(旣成) 장로교회와 결별을 선언한 최 중진 목사는 그동안 태인·정읍 지방의 각 교회를 돌보며 당회권리를 행사하였던 만큼 그의 활동 영향은 실로 컸습니다. 3천여 명을 헤아리는 많은 교인들이 자유교회 주장에 동조했고 여러 교회가 동요되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분쟁에 휘말렸는데 오랫동안 최 중진 목사의 직접 지도를 받아온 담당지역 교회들은 대체로 자유교회 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교회들은 찬반쟁론으로 예배당 쟁탈전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대리회는 최 목사 처리문제로 특별 임시노회를 소집할 것을 전보로 긴급 청원하고 산하 모든 교회들에게 “자유교회 운동에 미혹되지 말고 교회를 수호하라”는 목회 서신을 띄웠습니다. 더 이상 자유교회운동을 그냥 둘 수는 없으므로 대리회는 노회의 업무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서울의 노회지도자들(당시 노회장은 언더우드와 게일 목사 등)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하고 1910년 2월 22일 전주에서 전북대리회를 열고 토의 끝에 “최 중진 씨가 목사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직분을 거두고 이 사건을 노회로 올려 보내자.”라는 안을 기립투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음 정기노회 때까지 최 목사는 휴직을 명하였습니다.
1910년 9월 18일부터 평북 선천 염수동예배당에서 열린 제4회 독 노회에서는 22일 정사위원회(定事委員會)의 보고에 따라 “전북대리회에서 최 중진 씨를 휴직시킨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바 최 중진 씨가 청원한 일이 법 밖의 일이오며 또 자기가 스스로 퇴각(退却)하여 교회를 해롭게 하며 노회 앞에서 한 약조를 배반하였으므로 대리회가 노회 때까지 임시 휴직시킨 것이 가합(可合)한 일이 온바 지금까지 불복하니 회개하기를 바람으로 혁직(革職, 免職)함이 가한 일”이라 함을 채택하여 최 중진 목사의 신분 처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최 중진 목사는 목사 된 지 6개월 만에 휴직되고 1년 만에 노회에서 면직되었습니다. 전북 교회사에서 목사면직 사건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선교사 테이트선교사와 오랫동안 동역자로서 사소한 일로 인격적 차별대우와 감정대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발단된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목사가 된 이후 최 중진 목사의 자세와 주장을 통해 볼 때 자존심과 왕성한 사업 욕구에서 경제적 요망이 뚜렷했고 상대적으로 선교사에 대한 대우와의 격차에 불만을 느끼고 시정해 보려고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 중진 목사는 일찍부터 동학농민운동이나 의병활동으로 민족자존의 정신이 뚜렷하였고 열정적이고 언변과 통솔력이 뛰어나 선교사들과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선교사들과의 경제적 차별과 선교사들의 주도적인 교회 운영에 불만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는 동생 최 대진 목사의 간곡한 설득과 권유에 다시 1914년 10월 12일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노회에서 강도사로 복구되었지만 하필이면 그간 갈등을 비져 온 테이트 선교사와 동사케 함으로 복구 1년도 못되어 일본 조합교회로 교직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노회에서는 그를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일본화 운동의 앞잡이 역할을 한 조합교회에 가입하였는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를 따르던 많은 교인들이 더 이상 최 중진 목사를 따르지 않게 되었고 그의 지도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전도운동으로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매계교회를 떠나 정읍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적 천민계급의 신분해방을 주장하는 형평사(衡平社)를 중심으로 한 형평운동(衡平運動)에 열심을 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형평운동에 대해 뒤에 소개 할 것입니다. 최 중진 목사가 매계교회를 떠나니 1923년에 이르기 까지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최 중진 목사는 사회운동에서도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1940년 정읍에서 세상을 떠나니 그의 불같이 피어올랐던 믿음의 열정이 스러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의 청원을 들어주고 그의 전도 열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좀 더 있었다면 태인 정읍지역 뿐 아니라 호남 선교에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었을 터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민족의식은 당당하였지만 그는 극한 감정에 사로잡혀 뜻밖의 일본 조합교회에 동참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자치교회 운동에 동조하는 여파가 여기저기 나타나 1911년 평북 의주군 노북교회의 영수 김 원유(金元瑜)와 강계의 차 학연(車學淵)장로 역시 최 중진 목사의 주장과 운동에 공감하여 자유교회 운동은 이북까지 파급해 갔었습니다.
최 중진목사의 면직으로 인해 문을 닫은 매계교회는 박 봉래((朴琫來, 1880-1950)장로에 의해 1926년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박 봉래 장로는 부모를 따라 전주 서문교회를 다니던 중 한일병탄이라는 나라의 비극적 역사에 고민하던 중에 북간도 용저에 머물면서 독립군 소대장을 하며 독립군 신참훈련병들을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본군 무기고를 털어 용정으로 이송하던 중에 체포되어 1921년 6월 18일 재판을 받고 5년 형을 받아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출소한 뒤에 전주로 내려오고 최 중진 모사를 따라 매계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매계교회가 문을 닫자 다시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매개교회를 재건하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1950년 6.25전쟁중 마을을 점령한 인민군에 체포되어 그해 8월 5일 71세 나이로 태인 돌미산 언덕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때 박 봉래 장로뿐 아니라 박 도춘 집사 박 봉래장로의 아들 김제 난산교회의 박 종헌 장로 그리고 천원교회의 박 영기장로 강 태주전도사 매계교회로부터 분립한 두암교회 임 윤례 집사등 22명이 순교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1977년 박 봉래 장로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하였습니다. (김수진목사 한국장로신문 2009년 12월 12일 장로열전에서 발췌)
앞서 소개한 최 중진 목사가 참여하였던 형평운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평운동은 한국판 노예해방운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로부터 조선 500년 거의 천년 여 동안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신분차별제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종이 되면 대대로 종살이를 해야 하고 어쩌다 중인으로 태어나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대대로 신분의 차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신분 차별의 적폐를 하려는 일도 있었지만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 죄인으로 다스리니 감히 이에 대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1198년(신종 1) 5월 당시 집권자인 최 충헌의 노비인 만적이 수백 명의 노비들과 신분해방운동으로 봉기를 일으켰지만 내부자 고발로 실패한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간간이 신분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인 평들을 주창하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본격적으로 신분제도가 부당하다는 의식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낮은 급을 천민이라 하는데 8천이라 하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노비, 백정, 재인, 기생, 공장, 승려, 무당, 상여꾼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조선 8천이라 하는데, 그중 천민 중에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 백정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이들을 화척(禾尺:楊水尺)이라 불렀는데 아마도 고려시대 북방서 들어온 유목민 타타르인(韃靼人) 계통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과 육류판매를 하며 천민으로 국가에 세금이나 부역도 하지 않음으로 몰락한 빈민들이 백정으로 전락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백정의 수가 40만에 이르기도 하였고, 1923년경 형평운동에 참여한 백정의 수가 3만4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김수진 목사의 <호남선교100년과 그 사역자들>86쪽 이하에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을 잘 하여 주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글에서 발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정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와집에 살수 없고 명주옷을 입지도 못하고 망건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외출 시에 상투도 틀지 않고 평량자(平凉子패랭이)를 써서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백정이 죽으면 상여를 사용할 수 없고 묘를 쓸 때도 떼를 입히지 못하였습니다. 혼인 때 여자들이 가마를 사용할 수 없고 비녀를 꼽지 못하고 트레머리를 하여야 했습니다 이름도 仁義禮智忠孝가 들어간 글자를 사용할 수 없었고 물론 족보도 없으니 항렬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신을 소인이라 칭하여야 하고 일반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길을 갈 때도 몇 걸음 뒤쳐져서 가야했습니다. 만일 이런 규례를 어기면 가차 없이 감금을 당하거나 사형(私刑)으로 태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메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무어(S F Moore 1846-1906 모삼율)선교사가 언더우드의 영향을 받아 한국선교사로 1892년 9월 21일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1893년 곤당골교회(승동교회)를 설립하고 특히 백정들의 실상을 보고 백정전도에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9웧 어느 날 관자골 백정 박가의 아들 봉출이가 무어선교사를 찾아와 아버지의 병을 고쳐 달라고 말합니다. 무어선교사가 가서 보니 장티브스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종임금의 주치의로 있는 에비슨 (O.R. Avison, 한국이름 어비신魚丕信)선교사에게 부탁하여 마침내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박가는 임금의 주치의가 자기 병을 고쳐 준 것에 너무나 감동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가는 세례를 받고 무어로부터 성춘이란 이름도 얻게 됩니다. 그 후 1911년 박 성춘이 장로가 되자 교회내의 양반들이 반발하여 홍문수골교회(안동교회)를 세우고 분리해 나갑니다. 그 후 1914년 왕손인 이 재형이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 신분의 차별이 없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박 성춘의 아들 박 서양(朴瑞陽, 1885년 9월 30일 ~ 1940년 12월 15일)은 제중원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되어 그 후 10년간 이 학교의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어선교사는 뜻밖에 장티브스로 인하여 1906년 12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 박 성춘과 많은 백정들의 소원을 들은 무어선교사는 에비슨의사와 협력하여 1895년 고종에게 백정인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을 김수진목사님 책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 합니다.(89쪽)
<당신의 비천한 우리 백정들은 과거 500년 이상 짐승을 도살하는 생업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일에 무조건 순종하고 삵도 안 받고 섬겨 왔지만 우리는 천민 중에도 제일 바닥사람으로 천대받아 왔습니다. 다른 천민들은 그래도 긴 소매 옷과 망건 따위를 쓰고 다니지만 유독 우리 백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삽니다. 심지어는 관가에서 심부름하는 하치들까지 우리를 업수히 여기고 가끔 우리의 재산을 노략질해 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날이면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네들은 우리 뺨을 갈기고 옷을 찢고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자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강제로 일을 부려먹으며 엽전 한 푼 안 주면서 천대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일 참기 어려운 일은 삼척동자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대말을 쓰는 일이옵니다.>
이 같은 탄원서는 1896년 갑오경장 때 윤허를 받아 마침내 백정을 비롯한 신분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는 링컨의 노예해방과 버금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백정들도 갓과 망건을 쓰고 긴소매 옷도 입고 족보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백정은 너무 기뻐서 갓이나 망건을 잘 때도 벗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자비를 들여 백정해방 선언문을 360여장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백정들이 교회로 몰려오니 수원 지방에서는 50여명이 한꺼번에 교회로 나왔고, 서울에서만도 132명의 백정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아직도 신분의 차별의 풍속이 여전하므로 1923년 4월 2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양반 출신 사회운동가들과 장 지필과 같은 백정 출신 지식인, 이 학찬과 같은 경제력을 갖고 있던 백정은 계급을 타파하고 백정에 대한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백정도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한다는 목적 하에 형평사를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이같은 형평운동이 점점 사회운동화 되고 일본 총독부는 이들을 이용하여 민족 분렬을 획책하는 정책에 넘어가 1935년엔 이름을 대동사로 바꾸면서 친일을 하게 되니 점점 형평운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평운동에 최 중진 목사가 처음으로 호남에서 그 운동을 시작하여 정읍 지역의 천민 인권운동의 효시를 이루었고 이 같은 운동은 천민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점차 신분의 차별의식이 호남지역 내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4월 28일 보내 원고임
--------------------------------------------------------------------
정읍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른 내장산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을 단풍 중에 가장 택갈이 붉고 아름다운 단풍이 바로 내장산 단풍을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 단풍철이 되면 매일 수십만 인파가 내장산 가는 길에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장산 단풍을 구경하고 전주로 가는 길에 정읍군 산외면을 지나갑니다.
산외면은 정읍시 동북부 25㎞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완주군 구이면, 김제시, 금산면, 임실군 운암면과 경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아마도 산외면을 지나가면 맛있는 청정 한우 소고기 구이 맛을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산외 한우 마을엔 정육점이 44여 곳, 그리고 정육점식당이 25여 곳이 있어 나그네의 발걸음을 먼추게 합니다. 이곳은 정육점에서 먹고 싶은 소고기 부위를 직접 구매하여 정육점식당으로 가져오면 숫불과 반찬등 상차림 비용만 지불 후 구어 먹게 됩니다. 흔히 돼지고기를 먹는 값으로 소고기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한우소고기 마을 에 조금 떨어진 곳에 동곡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산외교회 주보를 보면 첫 표지 상단에 1900년 3월 7일에 설립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04년 5월경 매계교회 또는 구이면 정자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해 졌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909년 3월경 평사리 398번지 기도처가 마련되고 곽씨의 인도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 공산군에 의해 정읍경찰서에서 조요섭 전도사가 순교를 하고 역시 강성애집사(70세)와 장남 한판갑 성도, 임신 중인 자부 안씨, 막 젖을 뗀 아기 등 일가족을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죄목을 부쳐 죽창으로 찌르고 도끼로 쳐서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송회집사와 그 모친 등이 수복 후 치안 부재 시 순교하였는데 양집사 사위가 매계교회 출신 조기술목사(선교사)입니다. 강성애 집사의 자부 장옥순권사와 손자 한동석집사(전주시의원) 외손 고 손병선목사(군산 세광교회 시무) 고 손금자권사(전성교회) 등 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읍군 용북면 신덕리에 테이트 선교사와 최중진 조사에 의해서 전도받은 김덕수 이복국 신준이 중심이 되어 신덕리교회를 설립합니다.
사기(255쪽)에
“1907년 井邑郡 新德里교회가 成立하다. 先是 本地人 金德守 李輔國 申俊三등이 몬저 밋고 鄰近에 傳道하야 信者가 增加됨에 禮拜堂을 新築하고 敎會를 設立하니라.
1925년에 11월 17일에 첫 당회가 열렸는데 당회장은 스위코드(Switcord:서국태)선교사였고 장로는 김덕수였습니다. 1927년에는 당회장이 윈(Winn:위인사)가 맡았습니다.
이미 옥구 땅을 차지한 일본인 구마모도가 화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화호리의 농토들을 사들여 한국인 소작농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자 화호리로 이주하여 오니 1929년 신덕리 교회 교인들도 화호리로 이사와 신덕리 교회를 화호교회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마모도의 행패가 날로 심해져가 견디기 어려운 소작농민들이 의지할데 없어 하나님을 믿고 성경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회 출신으로
재야활동을 한 전주남문교회의 고 은명기목사, 기장 총회 총무를 진낸 이영민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한국교회 협의회 회장과 한기총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목사(서울충신교회), 김현식목사(전주태평교회원로) 오병길목사 등 한국교계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화호교회를 소개할 때 두분의 목사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분은 곽진근목사(1897-1941)입니다. 곽 목사는 김제 출신으로 불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ㅣ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92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완주의 삼례읍교회 김제의 금산교회 원평교회등에서 시무하였습니다. 1937년 신태읍교회를 거쳐 화호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는 조선예수교장로교 총회의 서기를 맡으며 입지를 쌓아가다가 1938년 전북노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신사참배에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전북노회는 관진근목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총회에 헌의하고 1938년 9월9일 평양 서문밖 교회 제 27회 총회(총회장 홍택기목사)에서 천추의 역사에 부끄러운 한 획을 긋는 조선예수교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전격적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 서기 곽진근 목사가 다음과 같은 신사참배 결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중략).....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勵行)하고 추히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 시국하에서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誠 )을 다하기로 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이 가결된 후, 장로급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신사에 참배를 하고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일을 하고 조선에 돌아와 역대천황을
위한 사당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본경찰에 끌려 나가 온갖 박해와 옥고를 치루었고 결국 주기철목사도 순교를 당하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곽진근목사는 1940년 제 29회에서 일약 44세의 나이로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친일 행각은 장로교 역사의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을 끝내 1941년 4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분의 목사님은 임종헌 목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임종헌목사는 1906년 충남 부여군 수원리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총명한 그는 고학으로 군산 영명학교를 간신히 그의 꿈이 좌절되자 날마다 술타령에 놀음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친구 김인배가 자기 동생을 소개하여 결혼을 하여 그의 부인의 기도로 가세의 빈곤으로 더 이상 공부를 못할 뿐 아니라 당시의 식민지 상황에 친구와 함께 일본에 갔으나 고생만하고 대학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귀국하던 중, 친구 김인배의 중매로 그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고 그의 고향 충남 부여군 홍산으로 돌아 온 그는 부인의 기도 덕으로 정신을 차리고 홍산교회 집사로 봉직하던 중, 1944년에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대전제일교회에서 시무하다가 해방 이듬해 황등 용산교회로 옮겼다가 신태인 화호교회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무렵 임목사가 전개한 일이 식량비축운동과 음주투전추방운동 등 절제운동을 전개해서 영적 부흥과 함께 농촌부강을 이룩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950년 2월 고창읍교회로 부임하고 "우리 농토에 풍년을 오게 합시다"를 외치며 목회의욕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그가 1950년 6.25가 터져 모두 몸을 숨길 때 "하나님의 가슴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소"하며 새벽기도와 가정예배를 쉬지 않다가 내무서원에 의해 체포당해 지상낙원인 공산주의의 우산아래 모이자고 선전방송을 할 것을 강요하는 내부서원의 요구를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는 말로 거절하고 3개월간 유치장에서 혹독한 옥고를 치루다가 퇴각하는 공산군에 끌려나가 고흥 뒷산 솔밭으로 끌려가 총살당했으니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1903년 최중진목사에 의해 정읍군 북면 화해리에 화해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화해리는 서쪽이 드넓은 평야를 화해평야라 불린데서 화해리로 불려졌습니다. 태인과 정읍사이 칠보를 향한 갈래 길 주변 정읍방향으로 한교(漢橋)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동리를 한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엔 학교교회 또는 한다리교회로 불렀습니다. 주명준교수에 의하면(전북의 기독교전래243쪽) 6.25전쟁 때 근처 산에 숨어 있던 빨치산에 의하여 교회가 전소되는 바람에 교회의 모든 비품과 자료들이 다 불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김한수 집사가 불에 탄 교회의 상량문 일부가 불에 탔는데 주후는 물에 타 없어지고 1901년이란 글자를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화해 교회 건축이 1901년으로 보게 됩니다.
화해 교회 출신으로 김병엽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병엽은 1900년 2월 18일 전북 조촌면 여의리 용정마을에서 김성중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곱 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계모의 손에 괴롭히며 자라던 중 당시 면소재지인 유상리에 나타나 설교하는 선교사의 설교에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나간 것이 인연이 되어 신자가 되고 열심있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모의 미움을 받아 가출 구걸 등 노숙을 하며 화해교회 출석하던 중 김달석 장로를 만나 10년 머슴살이 끝에 14마지기(2400평)을 작만 하였습니다. 김병엽은 그 무렵 그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개척되어 대지는 마련되었으나 재정이 말라 건축이 지지부진 진척될 줄을 모르자 미쳤다는 동네 사람들의 야지를 받아가면서 그가 가진 전 재산인 논 14마지기를 팔아 헌금을 해서 칠보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노회까지 알려져 노회는 부안군에 소재한 줄포교회 조사로 그를 파송했고 35세의 늦은 나이로 전주고등성경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고 봉상교회로 적을 옮겼고 그곳에서 정칠호 장로의 도움을 받아 조선신학교에 입학 2회로 졸업하고 대
수교회. 고부읍교회 고창읍 교회에서 목회하였습니다.
1949년부터 출발한 부흥운동이 담양지역에서부터 곡성군을 거쳐 화순지방에 이르렀을 때는 7월 초였습니다. 6.25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7월초까지 부흥회를 하던 김목사는 7월초에서야 6.25가 발발 한것을 알고 광주로 돌아와 8월 주일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광주 내무서에 수감되었다가 인민위원장의 구명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김제로 가든 중 9.28수복이 이루어졌고 신태인에 이르렀 을때 유격대에의해 교통이 두절되어 김제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신태인교회는 순교한 김병구목사 대신 강단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10일 신태인제일교회에서 새벽기도 중 200명의 빨지산이 식량을 구하려 왔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에게 총을 난사하니 김병엽목사는 복부를 맞고 군화 에 짓밟혀 순교하였습니다.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에 1904년 4월 20일 천원교회(현재 천원제일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입암면은 내장산 톨게이트를 나와 장성방향으로 가다보면 정읍시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있는 입암면이 있습니다. 입암면은 방장산과 입암산을 배경으로 아름답고 인심 은 장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옛날 왜구들이 전라남도 바닷가로 침범하여 이곳까지 들어오는 때가 있어 입암산성을 쌓고 이산이 사갓 모양이라하여 입암산이라 불렀으며 산 아래 곡장지대가 펼쳐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 천원리가 있는데 옛날 장성에서 재를 넘어 오면 이곳에서 말을 갈아타고 하룻밤을 자는 역과 숙소가 있던 곳입니다.
최중진 조사가 이곳에 머물며 전도를 하니 지역 주민인 서영선 박창욱 박성숙 이공숙 김도흥 김윤구 김일언 조면선 송세문 허기서 양경현등이 중심이 되어 1904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인수가 늘어나자 교인들이 헌금을 하여 14컨 교회당을 신축하고 박창욱이란 청년이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사기 177쪽)
당시 천원에는 100호 정도의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보다 큰 집이 있었는데 교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천원은 광주와 전주의 중간 지점이라 선교사들은 오며 가며 머무는 숙소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미리 음식과 침구를 미리 보내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3일 애나벨 메이저 니스벳(Anabel Lee Major Nisbet 1869.1.19.-1920.2.21. 한국이름 유애나. 존 사무엘 니스벳John Samuel Nisbet 한국명:유서백 선교사와 1899년에 결혼하여 1906년 남장로교선교사로 내한 전주와 목포에서 선교 활동하였다. 1919년 서울에서 있었던 삼일운동에 영향을 받아 4.8만세운동에 애나벨 니스베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던 정명여학교학생들이 적극 참여 할 때 도와주다가가 낙상하여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목포에 유애나기념관이 있고 1923년 정명학교 동창들이 “교장 유다해 묘”라는 묘비를 세웠는데 현재 그의 묘가 광주 양림선교사묘역에 안장되어있다)은 내한한지 6개월 정도 된 피츠(Laura May Pitts)간호선교사와 함께 천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피츠선교사는 한국 가정을 “돕기를 좋아한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한국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천원에 오는 중 갑자기 폭우를 만나 길을 잃고 두 시간 동안 길을 해매였는데 폭우가 이제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씨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해도 우리는 전진하리라고 웃으며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천원에 도착하여 천원교회 교인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영선 장로의 도움을 받았는데 서 장로는 본래 술주정뱅이에 노름꾼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 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의 속에 들어오자 그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평판을 얻게 되었고, 어느 믿지 않는 한 부인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테이트 선교사의 말을 듣고 “나는 그 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바로 우리 마을에 살고 있지요. 그분은 예수쟁이가 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라고 말하더라고 애나벨 선교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애나벨 선교사와 피츠선교사가 부인들과 함께 저녁예배를 드린 후 그 날 밤에 갑자기 피츠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서 장로는 다음날 일찍이 전주 선교부로 전보를 치도록 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지혜의 아버지께 길을 보여 달라고 간구 합시다“라고 말하고 미국에 잇는 피츠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나벨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관습의 장벽을 일소하고 선교사들을 잘 이해하고 도우며 가족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애나벨 섬교사는 마치 하늘 문이 열리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애나벨 니스벳 선교사는 1919년 이 때의 기억을 그의 책 “한국에서 날이면 날마다(Day in and day out in Korea ‘한국 선교초기 역사’ 한인수 옮김 1998 도서출판 경건)”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피츠 간호선교사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위의 책 180쪽)
전주에서 찬실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천원에서 세상을 떠난 정규간호원을 기억하나요? 언젠가 내가 아파서 입원해 있었을 때에 그녀는 아름답고 청결하며 매우 친절했지요. 나는 왜 그녀 같은 여인이 고행을 떠나 이곳에 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나는 어느 한국여인에게 그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정규 간호원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정규 간호원은 미소하면서 이렇게 대답 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녀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를 불렀기 때문에 그녀가 이곳에 와서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 했지요. 그녀의 서거 이후 나는 그녀가 섬겼던 예수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었어요. 그분은 밤 낮 그녀의 메시지를 통해 저를 부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는 그분에게로 올 수 밖에 없었답니다.“ 애나벨 니스벳 선교사 그리고 피츠 간호선교사,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를 보내셨다면 아마도 그들일 것입니다.
천원교회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23년 철원에서 이사 온 박영기(1877-1950)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강원도 이천군 출신으로 무당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주도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 성안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며 자신의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천원으로 이사와 인근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거의 독점하다 시피 하여 서울로 팔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매계의 박봉래 정읍교회의 정종실과 함께 박영기 세 장로는 부호로 이름을 날리며 교회를 섬기니 천원교회가 한때는 6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박영기 장로의 부인 안덕신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당시 가난하여 진학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하여 천원학원을 설립하여 중등교육을 시켰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더 이상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전주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하는 등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박영기 장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50일간이나 경찰서유치장에 수감되었고, 1950년 6,25시에 교회를 지키던 강해주전도사와 박영기 장로는 인민군에게 끌려가 부락의 청년 50여명과 함께 입암면 하부리 부락 언덕에서 1950년 9월 28일에 인민군이 쏘아대는 총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때 박영기장로는 인민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한편 이 교회의 초대 교인 박창욱은 교회를 설립하고 처음 장로가 된 후 신학을 졸업하고 1922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이 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창욱목사는 목포지역과 제주도에서 목회사역을 하다가 1938년에 아들이 있는 김제 원평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거기서 6,25를 만나 순교하였습니다.
1999년에 발행된 정읍제일교회 90년사에 의하면, “1909년 4월 5일 정읍 상리 황대일씨 居에서 數人의 기도회로 시작되었는데, 정읍군 태인면 매계리와 한교리와 입암면 천원리레 최중진 목사가 교회를 설립한 후 최중진 목사의 활동으로...” 정읍제일교회가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시작될 당시에 교회 이름은 마을 이름대로 상리교회라 하였습니다. 1911년 황대일씨 집앞에서 초가 2칸을 건축하였습니다. 1912년 노회에서 상리교회 설립을 허락하고 황대일을 초대집사로 임명하였으나 1915년 황대일씨가 타락하므로 성장하던 교회의 쇄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일꾼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1918년 장현팔씨가 집사로 임명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 교회는 다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의 역할이 꺼져가는 불을 다시 활활 일으켜 교인수가 8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리 원상동 산하에 초가 3칸을 신축하고 교회 이름도 정읍교회라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1922년 천원교회 설립교인중의 한분인 박창욱장로가 목사가 되어 초대목사로 오자 교회가 더욱 부흥이 되어 장명리 129의2 밭 98평을 매입하고 목조기와 50평 교회를 신축하고 상리예배당은 목사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923년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박치규라는 사람이 교회가 다만 예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식을 구취하고 지역민들을 계몽하는 일에 감동을 받아 땅을 헌납하니 오늘의 저읍제일교회로 발전하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전북노회 제 23회 회록(1929.3.28.44-45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정읍 상리교회는 제직과 김수영 조사의 성역으로 ㅠ익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숙제이던 예배당 이전문제는 독지가(박상열집사의 작은 아버지) 박치규씨가 중앙 적소에 시가 천여원의 기지 248평을 기부하여 준 일과 임선호씨가 풍금 1대를 기부하여 준 일, 집사 양공윤씨가 예배당 건축비로 750원을 낸 일이 있사오며....”
1950년 6.25전쟁으로 역시 이 지역에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으니, 박창욱 목사님이 원평에서 순교하였으며, 박목사님의 아버지 박순영씨도 본래 독립운동하다가 공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홍재기 장로도 순교의 제단에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공비들에 의해 교회당도 전소되었습니다.
정읍제일교회 수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지만 그중에 기억할 한 사람은 정종실 장로입니다.
1938년 장로로 임직한 정종실 장로는 의사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정읍으로 내려와 삼남의원을 개업하였습니다. 비록 외지인이지만 성심성의로 환자들을 치료하며 교회에 충성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니 당시 읍장인 최인철장로와 함께 장로가 되었습니다. 1945년 11월 당시 최상섭목사님과 최인철 장로와 함께 30여명을 모아 고아들을 수용하는 정읍애육원을 세워 정읍시 최초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 후에는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애육원에서 큰 위로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일에 막대한 재정이 소비될 수 밖에 없는데 정종실 장로님이 병원에서 얻어진 재원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애육원을 돌보았습니다. 매계교회 박봉래장로 천교회에 박영기 장로가 있듯이 정읍제일교회에 정종실장로가 있어 교호를 섬기는 일뿐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큰 공헌을 하였으니 그분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읍제일교회와 연관된 목사로 길진경목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길진경목사는 길선주 목사의 차남으로 1958년 7월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교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서구적인 감각으로 전통적인 역사의 고장인 정읍에서 새 바람을 이르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정읍 다방가와 골목을 누비며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1961년 길진경목사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총무로 선출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신대 박근원박사는 고창출신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정읍제일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는 예배학의 대가로서 한국교회의 예배의 동향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90년사 발간 축사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8.15해방을 맞아 정읍제일교회는 여전히 그 지역의 사회복지와 국가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했고 6,25 전란의 비극으로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했던 상황에서 전쟁고아들의 복지를 위한 정읍애육원의 설립운영, 전쟁미망인들을 위한 정읍모자원과 그들의 재활을 위해 직조공장을 세워 운영했던 그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개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당시 제일교회의 신앙적인 집단 역학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1994년 부임 이래 지금까지 김천영 목사는 교인들의 영성 함양은 물론 지역 내 하나님의 선교와 한국기독교 연합 사업에 크게 활동 하므로 정읍제일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부안군 주산면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건너편에 영원면이 있습니다. 그 영원 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1km 지점에 앵성마을이 있습니다. 앵성마을은 백제 초기 시대부터 있어 온 오래된 마을입니다. 남쪽으로 고부 사이에 두승산이 있는데 풍수적으로 두승산 12혈지의 하나로 옛 부터 명당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며 꾀꼬리 노래하는 마을이라 앵성리라 하였습니다. 예전에 큰 과수원이 있었는데 봄이면 꾀꼬리들이 찾아와 노래를 부르면 과수원에서 일하는 처녀들이 덩달아 흥겨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앵성리에는 고종 29년에 세워진 정려문이 있습니다. 김복규의 아내인 밀양 박씨가 남편의 등창의 고름을 3년여 동안 빨아 고쳐 나라에서 정려문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엔 백정기 의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앵성리 출신 백 의사는 일제 시대 만주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요인 암살 실패로 무기징역으로 옥고를 치르는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효창공원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그의 유골이 묻혀 있는 삼의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앵성마을에 1907년 4월 5일 남녀 16명이 모여 앵성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초대 목사는 김 병엽 목사입니다. 그러나 오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의 역사 자료들이 소실이 되어 그간의 교회역사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였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앵성교회 이상열 집사는 정읍군 부량면 대창리에서 일제 말엽 신앙과 애국심이 강해 신사참배를 않는다는 이유로 왜경에게 끌려가 무참히 고문을 당하고 집에 귀가 했으나 상처로 몸 져 누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4남 2년 중 3남으로 이마태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교회의 대성학교와 전주 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25세에 큰 형님 이주일집사가 출석하는 부안군 동진면 오중리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때 담임목사인 김수현목사는 이마태전도사를 국민촉성회에 가입하게 하고 동진면 위원장직을 맡겼습니다. 1949년 이전도사는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고 앵성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여 시무하였습니다. 6.25전쟁시 이 지역을 장악한 북한 공산당원들에 의해 이 전도사 집안은 반동으로 몰려 큰형과 함께 이전도사도 잡혀서 내무서로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두 다리와 두 손목까지 부러졌습니다. “동생, 자네를 보냄이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보는 것 같구먼, 죽더라도 비굴하지는 말게” 동생의 얼굴을 만지며 형 이주일 집사는 울었습니다. 결국 이마태 전도사는 전주 형무소에서 1950. 9. 26. 죽창에 찔려 순교하니 그 나이 갓 서른이었습니다.
앵성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는데, 이상훈(은퇴) 정우근(화산제일은퇴) 이봉기(개혁측 증경총회장 전주쉼터) 이탕영(김제주평) 조경연(이리창대) 임기준(김제신덕중앙) 박상구(고창석남) 김영만(안양봉산제일) 이은호(광양임마누엘) 이제균(군산충진) 김향중(신갈지역) 이동선(의정부지역) 등입니다.
아마도 호남평야에서 가장 좋은 쌀이 산출되는 곳이 정읍군 이평면의 배들(梨坪)평야의 쌀이라 하겠습니다. 이 배들평야의 중심은 바로 예동마을 입니다. 이 마을은 신태인에서 이평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 마을로, 옆에는 원평천과 동진강 연안의 비옥한 농지인 기름진 배들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38년(헌종4년)에 지금의 정읍천 제방이 그때는 작은 둑 이였는데, 비만 오면 터져 제방이 흘러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합니다. 그때 예동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이웃마을 사람들과 함께 둑을 쌓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더위에 옷을 벗고 일을 하는데 예동 주민들은 삼배 적삼 옷을 입은 채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고부 군수 안길수가 이 마을 시찰을 나와 그 광경을 보고 ‘저기 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마을 사람들이냐’하고 물어 ‘호동(狐洞)이란 마을 사람들입니다’하고 말하니, 예의 바른 사람들의 마을 이름이 호동이 무어냐면서 예의 예(禮)자를 넣어 예동(禮洞)이라는 마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마을이 우리나라 역사에 기억되는 사건이 1894년 1월 10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 예동에서 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봉준 중심으로 농민들이 이 말을 말목장터에 모여 봉기하여 고부군수 조병갑 관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관아를 습격하고 만석보를 혁파하므로 동학형명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만석보는 조병갑(趙秉甲)의 부당한 수세징수로 동학혁명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洑)입니다. 현재는 하천으로 제방의 흔적은 없고 1973년 전봉준이 만석보를 허물고 보관 중이던 세곡을 굶주린 농민들에게 나누어준 그 자리에 만석보혁파비가 세웠습니다.
이같은 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예동마을에 1907년 김보경 이화중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을 신축하여 예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선을 긋는 노령산맥 아래 복분자재배로 유명한 고창군이 있습니다. 고창군 죽림리의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고대문화의 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을 상징한 말로, 고창군이 삼한시대에는 모로비리국이었다는 데에서 착안해 ‘모로모로’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에 대해 논난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전북의선교지와는 다르게 광주선교부에서 장성 영광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1900년 덕암교회를 설립한 것이 이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명준 교수는 1900년대에는 목포에서 유잔 벨(Eugene Bell)과 오웬(C C Owen)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던 시기이였고, 광주에 선교부가 세워진 때는 1904년임으로 덕암교회가 광주선교부에서 설립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바로 이웃인 흥덕에 까지 전주선교부의 테이트 선교사가 활동하였던 지역이라 고창 선교는 테이트선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그 후 세워진 광주 선교부가 세워져 그 관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것입니다. 1921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서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한 페슬리(Paisley, James I 한국명으로 이아곡 1948년부터는 군산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귀국하였다가 1952년 사망하였고 프로렌스부인은 54년에 재 입국하여 59년까지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덕암교회를 자주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900년 공음면 덕암리 지음 마을에 세워진 덕암교회는 1915년 3월 1일에 오창언 오병언 오윤팔 오동근 등 오씨 집안이 중심으로 18명이 고창 땅이 한 눈에 보이는 언덕에 교회를 신축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덕암리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심이 심하였지만 덕암리 오씨 집안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대단하여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오씨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험담과 비난을 하였지만 점차 그들도 교회를 찾아 나와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덕암교회는 6.25 전쟁시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덕암교회 출입구 좌측에 오계환장로1912.10.7.-1950.10.7.)와 김영해집사 외 24명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중 2학년 학생이었던 오장로의 아들 오균열이 목사가 되어 예장보수개혁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순교자들 중에 오병길 전도사의 순교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덕암교회 창설자 중의 한사람인 오윤팔의 네째 아들 오병길(1897년 3월29일)소년은 남달리 머리가 총명하여 얼 선교사가 가르쳐 준 성경 말씀을 그 날로 암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듣고 암송하는 것을 지켜본 페슬리 선교사는 그를 광주 숭일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광주 숭일학교 입학식 날 입학식장에서 교장선생님이 누가복음 2:32절을 읽으며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만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오병길 소년은 '그래 나도 베드로와 같이 핍박 속에서 목숨을 요구하면 기꺼이 베드로처럼 순교의 길을 가야지...' 그러나 이때의 결단이 그를 마침내 베드로처럼 순교의 장으로 이어지리라고는 당시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임한 교회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교회였습니다. 야월리교회는 유진 벨선교사에 의해서 야월도에 세워진 섬 교회였습니다. 섬이란 예부터 무속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전도사의 헌신적인 전도로 마을에는 새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들어 올 때마다 지내던 풍어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배가 출어할 때마다 오전도사가 기도해준 후에 떠났습니다. 2년 만에 온 동네가 복음화되고 오전도사에게 감명을 받고 그의 신앙지도를 따르면서 성장해 왔던 최재섭 등 전 교인 65명이 결연히 신앙의 순결을 지키다가 6.25동란에 65명의 순교자를 낸 야월리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야월리 교회에 가면 당시의 증언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순교기념관이 있습니다.
오 전도사는 고향인 고창군 부안면 용산교회, 홍덕면 홍덕교회. 해담면 동호교회 등 미자립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들고 떠나곤 하였습니다. 6.25전쟁 전 부안군 백산면 평교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부임하자 집안 살림은 부인에게 맡기고 전도밖에 모르는 전도사로 어려운 교인들에게 신세질까봐 항상 미싯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다가 시장하면 우물가에 앉아 시원한 냉수에 타서 마시며 시장기를 면하곤 다시 전도를 하였습니다. 1950년 7월 하순께 부안군 백산들녘에도 물밀듯이 인민군들이 들어 왔습니다. 이 고장에 들어서자마자 인민군은 교회부터 점령하니 오전도사는 큰 아들 오주환의 집 부엌에 지하실을 파놓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벽에 태극기를 걸어 놓고 예배드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너무 감격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지하실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9월 하순 퇴각하는 인민군들에게 발각이 되어 소위 인민재판에서 오전도사와 그의 아들들이 옆구리에 와 가슴에 아랫배 등 수없이 죽창으로 찔려 그야말로 형언키 어려운 참상을 당하고 일가족 삼부자는 장한 순교하였습니다. 오병길 전도사의 소년시절 베드로의 길을 가리라는 다짐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로회 사기(p.103)에 “1903년 고창군 신촌교회가 설립하다 초에 몇몇 신자의 전도로 교회가 설립되야 송복렴(宋福廉)이 인도자가 되니라”는 기록을 보면, 문헌상으로는 신촌교회가 고창군내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기에 송복렴이 인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송복겸(宋福謙)이 옳은 이름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 미야자끼(宮崎圭太郞), 아베(阿部), 호소까와(細川많), 사또(佐藤) 오오모리(大森五吉郞) 등 일본인들이 들어와 농토를 차지하였는데 그중에 不二회사가 있습니다. 송복겸은 불이회사의 농감(農監)으로 일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소작을 주었습니다. 송복겸은 자포리 신촌에 있는 사돈 임승유의 집이 비교적 넓은 것을 보고 교회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임승유의 집 머리방에서 유하며 예배를 인도하곤 하였습니다. 비록 일본인 농장에서 농감으로 일하였지만 송복겸은 신촌학당을 세워 소학교 교육을 시켜 고창에서 가장 개화된 마을이 되니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교사와 전도사로 활동하던 시미석(柴美錫)은 정읍출신으로 전주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자포리에 와 농촌계몽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송복겸은 그의 애국심에 감동을 하여 막내딸 송경애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송경애는 고창지역에서 최초로 전주 기전여학교를 졸업하고 삼일운동에 동참하여 구속되어 대구복심 법원에 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송경애는 남편을 도와 농촌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점점 일제의 신사참배의 압력이 심해지자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있는 흥덕 소학교에 학생들을 인계하였습니다. 그 후 시미석은 고창 중앙교회에 출석하며 1948년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6.25 전쟁시 공산군들에 의해 같은 교회 임종헌 목사님과 함께 순교를 하였습니다.
1912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에는 하오산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오산교회는 특이하게도 일본인 마스도미 야스자이몬(升富安左衛門) 즉 한국 이름으로 승부장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호남평야는 위에서 소개한 일본인들을 위시하여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약탈의 현장이였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미로 농토를 빼앗고,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은 남부여대하여 멀리 만주로 떠나가던 때 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수탈과는 다르게 승부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한 일본인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진정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이 그러한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계몽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을 향한 일본의 침략은 날로 더해 가던 시절 진정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부장로 외에 오다 나라찌(織田楢次1908-1980 한국면 전영복)목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간사이(關西)성서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조선인 유학생으로부터 일본의 조선침략과 만행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인이 지은 죄를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928년 21세 때 목포로 와서 노방 전도와 주로 벽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노리마쯔 마자야스(乘松雅休1863-1921)목사는 1896년 명성황후의 살해사실을 알게 되자 기독교인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죄하는 마음과 조선인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메이지신학원을 중퇴하고 그해 12월 23일 인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서울로 가던 중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치자 마부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첫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897년 1월부터 조선인 조덕성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인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선교범위를 넓혀가며 장호원까지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재워주는 집이 없어 어떤 때는 시골집 굴뚝을 껴안고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조선인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일념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평소에 한복을 즐겨 입고 한옥에서 한국음식을 먹으며 한국인처럼 생활을 하였습니다. 1898년 영국 플리머드 형제단 소속으로 일본에서 그에게 한국선교의 영향을 준 브랜드(H G Brand 1965.6.11-1942)선교사가 한국에 오자 노리마츠는 그와 함께 더욱 열심히 선교활동을 벌렸습니다. 1900년 8월 9일 수원으로 이주하여 자신의 집에 ‘성서강론소’를 개설하였고, 그 후 1909년 8월에 김태정이란 분이 수원천변에 토지를 기부하자 신자들의 헌금과 협력으로 한옥집회소를 세워 성교강론과 전도에 열의다 하니 후에 수언 동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번은 한 청년이 그를 찾아 왔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까?”라고 하니 아직 먹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은 노리마츠 목사는 부인에게 얼른 점심을 차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이 밥을 하려하니 쌀독에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시장에 나가 팔아 밥을 지어왔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조선선교에 열정을 다 바쳤던 부인은 33세 나이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리마츠목사는 1919년 삼일 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위해 기도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병이 악화되어 고향 오다하라에가서 요양 중 세상을 떠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수원 동신교회 교인들이 그의 유골을 가져다가 교회 뜰에 그의 부인과 함께 합장을 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일본인 가운데는 한국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이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승부장로는 더욱 기억하여야 할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승부장로에 대해 다음 회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51호로부터 원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