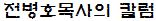378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전병호(기독교대한복음교회총회신학교 총장)
1. 지동식은 누구인가?
21세기 초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는 지동
식이란 이름이 퍽 낮 설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대부분의 신과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지동식 박사의 제자들일 것
이다. 흔히 말하기를 지동식 박사는 연세신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지 박사는 훌륭한 학자이며 설교자인 동시에 뛰어나 교회 행정가로서
연세대학교와 교계에 남긴 업적은 기리 빛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1)
1) 박숭인, 『겸손 휴밀리타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동창회 (한우리, 2007), 11.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79
박대선 박사가 지동식 박사 회갑기념호로 출간된 『신학논단』 제11
집 권두언을 통해 지동식 박사를 훌륭한 학자요 뛰어난 설교자이며 교
회행정가라고 소개하였다. 소위 연세신학을 말할 때 지동식 박사를 빼
고 말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신학이 될 것이요, 기독교대한복음교회를
말할 때 지동식 목사를 빼고 말한다면 기둥 없는 움막이 될 것이다.
1947년에서 1976년까지 30년 동안 연세신학을 공부한 모든 후학들은
지동식 목사로부터 신학을 배웠으며 그의 겸손을 보고 목회자의 인격
을 본받았을 것이다.
1948년 1월 12일 종로6가 기독교대한복음교회에서 ‘복음동지회’가
창립총회를 열었다. 모임 이름에서 복음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를 번역한 것으로 진보적인 개신교를 뜻하는 것이었다. 창립 당시 회원
은 장하구 ․ 홍태현 ․ 김철손 ․ 이시억 ․ 문익환 ․ 문동환 ․ 지동식 ․ 이영헌
․ 김덕준 ․ 박봉랑 ․ 김관석 ․ 장준하 ․ 유관우, 이렇게 13명이었다. 그
후 연세대의 박대선, 감리교신학대의 윤성범 ․ 김철손 ․ 김용옥, 연세대
신학대의 김정준 ․ 김찬국 ․ 백리언 ․ 문상희 ․ 유동식, 한국신학대의 이
장식 ․ 전경연 ․ 이여진, 장신대학의 박창환 ․ 이영헌, 루터교의 지원용,
중앙신학대의 안병무 ․ 홍태현, 대전 감신대의 이호운, 이화여대 교목
인 이병섭, 기독교청년회(YMCA)의 전택부, 기독교 서회의 조선출, 잡
지 『사상계』의 장준하, 대광중고등학교의 장윤철, 종로서적의 장하구
등이 회원이었다.2) 이 중에 지동식 박사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
다. 당시 모임의 장소로 4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복음교회 지동
식 목사의 서재를 이용하였으니 이곳은 한국 신학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였던 것이다.
2)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 9일, 길을 찾아서, 진보개신교의 밀알 ‘복음 동지회’
문동환.
380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1956년 10월 23일부터 27일간 ‘임마누엘 신학강좌’를 개최하였는
데 여기서 지동식 목사는 ‘사도시대의 성령’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
다. 임마누엘 신앙강좌는 1959년 제4호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개최하
였는데, 1958년 남산감리교회에서 있던 제3회 강연에서 지동식 목사
는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발표하였다.
복음동지회에서 1956년에서 1959년까지 3년간 임마누엘 총서를
발간하여, 1집: 박봉랑 역,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2집:
지동식 역, 칼 바르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3집: 장하구 역, 칼 바르
트의 『교회와 예배』, 4집: 김정준의 『구약성서의 인간관』을 발행하였
다.
복음동지회에서는 특별한 사업으로 1957년 5월부터 성경을 원어로
부터 새롭게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여기 번역위원으로, 박대선
1970년대 초반 당시 박대선 연세대 총장 댁에서 부부 동반으로 모인 복음동지회 회원들. 맨 뒷
줄 왼쪽부터 장하구 김찬국 문익환 전택부, 뒤에서 두 번째 줄 왼쪽부터 김철손 유동식 박영숙
김용옥 김관석 (한 사람 건너) 안병무 윤성범, 그 아랫줄 왼쪽 두 번째부터 이병섭 장준하 박대선
지동식 장윤철 박리언 유관우.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81
을 위원장으로, 김정준을 서기로 선출하고 지동식, 전경연, 김용옥, 문
익환, 김철손, 윤성범, 박창환, 조선출, 고영춘, 장하구, 이여진 등 13명
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장하구는 마가복음, 지동식은 요한복음, 이
여진은 누가복음, 박창환은 고린도전후서, 윤성범은 갈라디아서, 에베
소서, 디도서, 빌레몬서, 박대선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고영춘은 데살로니가전후서, 김정준은 히브리서, 문익환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서신, 전경연은 유다서, 계시록을 맡아 번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새번역 마태복음』을 첫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모임에 서울복음교회의 박종규 장로의 경제적인 협조와 한글학자 김
윤경 박사, 문필가 황순원 선생, 시인 박목월 씨의 도움이 있었다. 이
같은 성경번역사업은 1960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의 새번역(공동
번역성경)을 시작하는 데 자극제가 되었다.
지동식 박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서양사상뿐만 아니라 동양사
상도, 현대사상만 아니라 고대사상도, 기독교 신학은 물론이요 불교학
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의 주 강좌인 칼 바르트 신학뿐 아니라 에밀
부룬너, 폴 틸리히,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도 달통하여 학생들에게 가
르쳤다. 그는 조직신학뿐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 신약학, 목회학까지
가르치니 아마도 한국 신학계에서 그의 박학다식을 따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하에서 1970-7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의 회장을 맡아 NCCK의 민주화와 인권 투쟁의 중심에서 지도
력을 발휘하여 화해와 평화의 노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지동식 목
사에게서 근엄한 연합회 회장이나 대학교 학장의 풍모보다는 늘 자애
로운 목사의 모습을 접하면서 학생들은 교수님으로 부르기보다는 목
382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사님으로 호칭하였다. 지 목사 자신도 목사라는 호칭이 더 듣기 좋다고
하였다. 지동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자생적 민족교회인 기독교대한복
음교회의 목사요 총회장으로서 한국교계의 작은 교단으로서의 위상을
우뚝 세우는 데 그의 업적은 지금도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큰 자랑과
함께 귀감으로 삼고 있으니 지난 2012년 1월 지동식 목사의 탄생 100
주년을 맞이하여 동 총회 신학위원회에서는 『지동식의 신학과 사상』
을 펴낸바 있다.3)
2. 신학의 길을 가다
지동식 박사는 1910년 9월 20일 전북 남원군 덕과면 금암리에서 출
생하였다. 남원읍교회를 인도하던 니스벳 선교사와 김석조 조사에 의
해 1906년 4월 5일 임실군 내에 최초로 덕과교회가 설립되었다. 덕과
교회를 고개 넘어 다니던 성도 10여 명이 1913년 5월 21일 금암리
367번지 김경추 성도의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수교회를 설립
하였다.
이처럼 금암리에 교회가 세워져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지역에
서 태어나 자란 지동식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키웠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을 듣고 자신의 꿈을 키워 갔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학교에서도 줄곧 우등을 놓치지 않았다. 1932년 전
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선친께서는 의사가 되기를 바랐으나, 전
3)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 편, 『지동식의 신학과 사상』(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2).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83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대공황으로 당분간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군산 옥구금융조합의 서기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조합원
으로서 그의 생활은 마뜩하지를 않았다. 당시 금융조합은 한국 농촌에
대한 수탈의 전지 기지로서 많은 농민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눈물을 흘
리며 봇짐 하나 달랑 지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만주로 떠나가고 있었
다. 이러한 모습을 본 지동식은 더 이상 금융조합에 근무할 수 없었다.
차제에 그는 그가 존경하는 최태용 목사를 만나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진로 상담을 하게 되었다. 지동식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칼빈의 요리문답이나 우치무라 간조의 신앙서적들을 탐독하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고민하던 중에 당시 교회갱신을 부르짖으며 독립신앙운동을 펼
치고 있던 최태용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이
다. 청년 지동식은 새벽기도회에서 영력을 얻고 열띤 신앙체험을 한‘경
건주의 신앙인이었으면서도 당시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 개
혁을 외치고 있는 최태용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 최태용이 개인적으
로 펴내고 있던 잡지 『천래지성』, 『영과 진리』 애독자의 한 사람이 되었
다. 이래서 지동식은 최태용이 매우 사랑하는 애제자가 되었다.
1935년 12월 22일 최태용은 독립 교회 갱신 운동가이기를 그만두
고 세 가지 표어를 내걸고 기독교조선복음교회라는 교단을 설립하고
초대 감독이 되었다. 세 가지 표어는 첫째로 신앙은 복음적이요 생명적
이어라. 둘째는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셋째는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였다. 이처럼 자생적 민족교회로 복음교회를 세운
최태용 목사는 장차 복음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국 교계를 이끌
어 갈 큰 재목으로서 지동식을 내다보고 그에게 자신이 졸업한 일본
신학교에 입학하기를 권면하였다. 지동식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문
384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제가 아니라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데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가
다음과 같은 평지를 써서 최태용 목사에게 보냈다.
“日前에 下送하옵신 惠書와 規則書 拜受하였음니다. 其間에 小生은
每日 各樣으로 꾀하고 혀아려보며 今般의 일이 人間의 智識이나 自己
意識으로 由來된 것이 아닌가 祈禱해 보았습니다. 告白하오면 내 智識
대로 하여서는 小生은 神學校 志願을 不可하게녁였습니다. 第一爲人
이 하나님의 要求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無勇하고 無識하고 到底히 그
의 일에 勘當키 어려울 것같이 생각할뿐더러 于先 入學도 問題요 學費
도 생각지 아니치 못함이로소이다. 그래서 小生같은 것이 主의 일을 爲
야 덤비다가 自我도 破滅 當하고 하나님의 일흠을 辱되게 하지나 않을
가 하는 卑怯한 생각조차 갖게 됨니다. 然이나 祈禱해보오매 聖靈께서
는 指示하사 肉을 버서난 딴 心情에 小生을 引導하야 主의 뜻은 오히려
이 그릇된 것을 不足한 것을 굳게 잡고 계셔서 强한 자기의 뜻대로 統治
하시는데에 있음을 믿게 하오니 思索도 計算도 다 버리고 聖靈의 敎示
대로만 順從키로 했아옴니다. 黙考하오면 도모지 可望이 없는 엄청난
일이오나 主께서는 自己의 뜻대로 이 일을 始作하셨아오매 또한 自己
의 뜻대로 끗내시리라고 밌읍니다. 或은 小生으로 하여곰 先生님의 말
슴대로 將來에 그의 일에 加擔케하시사 그의 權能으로 支持하시든지
或은 今後에는 農夫나 工匠이로 變換식히시드니 이제 全部가 그의 뜻
에 일임되여있읍니다. 主의 뜻이면 成敗가 없아옵고 모든 것이 小生의
게 取하야 幸福이오 기뿜일 것 뿐이오니 모든 것을 主께만 돌니고 있아
오면 그의 自由로우신 뜻대로 取扱받게 될 줄 믿읍니다. 그러므로 今後
의 일은 오즉 主의 뜻 如何에 依하야 展開 되여 갈 줄 믿읍니다. 가장
큰 念慮는 小生의 不足이 主의 恩寵과 矜恤을 擔當치 못 하는데에 있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85
아오니 加禱하야주옵소서.”4)
청년 지동식을 일본 신학교에 보낸 뒤 최태용 목사는 다음과 같이
『영과 진리』에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은 예정대로 되어서 지군은 입학시험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야 일
본신학교 예과 1학년에 입학하였다. 지군은 재작년 시작하려 한 신학
숙에 올 작정이었었는데 이제 보다 완비된 일본신학교에 입학케 되었
으니 더더욱 잘 된 일이다. 금후 6개년간에 지군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또한 이 신학교의 교육 때문에 저는 좋은 전도자가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취급하신 일로 조선이 지도자를 얻게 되었으
니 감사를 마지 못한다. 저는 우리의 동무요, 동지인고로 현재 그럴뿐더
러 장래에도 저는 우리의 동로자(同勞者)일 것이다. 우리의 진영에 장
교 하나이 더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영을 굳게 하신 일이다.
이로써 확실히 우리의 조선 공취(功取)의 전비(戰備)는 굳게 한걸음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일을 일우어 가시옵소서. 아
멘. 나는 또한 지군의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일우기를 중지하고 용감한
결단으로 전도의 전선에 바친 일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저의 곤난에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저의 인내와 순종에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
시기를 기도하야마지 아니한다.”5)
지동식은 최태용 목사의 권고를 받아 1934년 4월 동경신학대학의
전신인 일본신학교 예과에 들어갔고 그 후 본과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4) 『영과 진리』, 73. 1935년 4월 16일. <지동식 군의 신학교 입학에 즈음하여 편지>.
5) Ibid.
386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졸업하였다. 당시 일본신학교의 학제는 예과 3년, 본과 3년, 연구과 2
년으로 되어 있었다. 지동식은 예과 3년 동안 영어와 독일어, 불란서어
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 어학과 철학을 주로 공부하였다. 더욱
이 칸트, 피히테, 키에르케고르의 독일어 원서를 밤을 새가며 독파하
기도 하였다. 본과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였는데 『루터
선집』, 칼빈의 『기독교 강요』 등도 원서로 독파하였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그의 학문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후 한국
신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게 한 일은 당신 일본 신학계에 에밀 부르
너와 함께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칼 바르트의 서적을 접한 일이었다.
처음 그가 읽은 칼 바르트의 책은 『로마서 강해』였다. 아직은 독일어
에 익숙하지 못하였던 때라 한 쪽을 읽는데도 한나절이나 걸려다. 예과
3년에 올라가서 기념 삼아 구입한 슐라터(Adolf Schulatter)의 『신약
성서 강해』를 읽고 큰 감화를 받아 학교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해방
후 이북에서 목회를 한 후 서울에 와서도, 6.25 피난 중에도 마치 “위급
할 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첫 사랑을 약속했던 약혼반지만은 버리지
최태용과 지동식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87
못하고 끼고 다니는 심정과도 같은 심정”6)으로 이 책을 간직하였다.
그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 맨 처음 번역을 시작한 일이 슐라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였다. 그러나 지동식이 평생 마
음에 품고 머리에 담고 산 것은 바로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이다.
이 책을 번역하던 중에 전경연 박사가 이미 번역을 완료하였다는 소식
을 듣고 그만둔 일이 조금은 섭섭하였다. 이처럼 학생시절 그는 바르트
의 책이란 책은 구입할 수 있는 한 다 찾아 읽었다. 그래서 일본신학교
의 졸업논문이 칼 바르트의 사상을 나름대로 소화한 “선교론”이란 것
인데, 이 논문으로 1940년 3월 졸업식에서 졸업 논문상을 타게 되었고
또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1941년 4월 책이 출판될 때 마쓰다니
요시노리(松谷義範)가 써준 서문에는 다음 같은 추천사가 나온다.
“이것은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을 숙독한 후 음미하여 쓰인 논문이다.
이 논문을 통독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바르트의
신학이 동양의 토양 속에 깊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을 읽음으로써 바르트의 교의신학 연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어떠
한 의의를 가질 것인지를 많은 독자는 긍정하게 될 것이다.”7)
여서 말하는 선교(宣敎)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션’을 뜻하지 않는
다. 바르트의 신학용어로 선교는 ‘선포’(Verkündigung)를 말한다.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칼 바르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신학자 신준호 박사가 2010년 12월
9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가 개최한 <지동식목사 탄생 100
6) 『기독교사상』(1963. 8), 19-21.
7) 『지동식의 신학과 사상』, 334-335.
388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주년 기념 강좌>에서 발표하며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
리는 왜 우리가 지동식 목사님을 기억하여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대답은 ‘선교론’ 안에서 주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지 목사님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축복과 저주의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에 선 영원한
진리와 마주 대면하기 때문이다. 선교론에 담긴 이 진리는 잊혀져서는
안 되며 또 잊혀질 수도 없을 것이다. … 우리는 선교론의 핵심을 재발
견함으로써 바르트 신학의 중심이며 더 나아가 성서적 진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증거를 재발견하여 오늘의 한국교회의
설교적 혼돈 상황 안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지동식 목사
를 통해 칼 바르트 신학이 연세신학에 소개되고 또 한국교회에 알려진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바르트 신학이 연세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고 피력하였다.
지동식 목사가 수상집 『돌 세계』를 펴낼 때 가까운 지인 한 명이 평
하기를 “이 사람의 신학사상은 비유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
고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의 신학사상과 그리고 고전적인
학자라고 인정받게 된 칼 바르트의 사상을 둘레로 한 하나의 일주와
같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평이 매우 적절한 평이라고 인정하였으니
그의 서재에 루터, 칼빈, 그리고 바르트의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3.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다
8)지동식 군이 일본신학교 학생일 때, 그는 최태용 목사의 개인 발행
8) 이하의 글은 2010년 12월 9일 ‘봄새물 지동식 목사 기념강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안한 글입니다.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89
잡지였고 후에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기관지가 된 『영과 진리』를 기
숙사에서 프린트로 제작하여 애독자들에게 발송하였고 여기에서 나온
얼마간의 구독료를 생활비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확실한 이유 없이
1939년 7월호에 다음 호는 날씨가 더워 휴간한다는 광고 후에 잡지
발간이 끊어졌다. 그가 후에 본과를 졸업하고 다시 연구과 과정을 가기
로 하였지만 학자금이 떨어져서 못 갔다는 회상을 하였는데 아마도 잡
지 중단 사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학업을 중단한 것
은 그의 기본적 신앙에 따른 것이다. 그 이유를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
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사관학교 학생이 군사학을 공부하는 까닭은 일선에 나가서 힘
차게 싸우기 위함인 것처럼 신학도도 역시 일선에 나가서 전도 전선을
펴는 것이 그 정도(正道)라. … 신학수련을 더 쌓아 가자던 최 감독(최
태용 목사)의 제안을 물리치고 농촌교회에 투신한 것은 자격문제도 있
었지마는 그보다는 차라리 이와 같은 생각이 작용했던 것이다.”
지동식이 일본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처음으로 전도사로 목회
하기 위하여 찾은 곳이 전라북도 금마복음교회였다. 초기 복음교회 교
인들은 해마다 새해 1월 첫 주간을 금마에 모여 전국적인 사경회를 개
최하곤 하였다. 이러한 금마복음교회에서 새내기 지동식 전도사는 그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1940년대 초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농촌 사
정은 너무나 어려웠기에 농촌 목회자로서 지동식 목사와 그 가족들의
생활은 더더욱 비참할 지경이었다. 결국 지동식 전도사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노모와 신혼인 아내 역시 굶주림에 허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엘리야를 돕게 하신 까마귀를 우리 집에
390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도 보내 주셨다”고 후에 말한 대로 친척 되는 박형수 씨의 도움으로 그
후로는 큰 어려움 없이 농촌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일제 말기에 징
용을 피하여 원산 근처에서 시멘트 부대 공장을 경영하는 처남의 공장
에서 십장을 하면서 근방 운림에 있는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다
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동식 목사는 후에 말하기를 당시 목회는 그야말로 동면기 목회요 땅
굴 목회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무엇보다도 악기도 없이 찬
송가를 시골 농민들에게 가르쳤으니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을 일
이라고 술회하였다.
1945년 해방 후에 복음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최태용 목사가 농민계
몽운동을 위해 서울복음교회의 담임목사를 사임하고 대신 지동식 목
사가 후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1962년 제자인 장성환 목사에게 물
려 줄 때까지 계속 서울복음교회를 지켜 왔다. 1950년 6.25 한국전쟁
으로 잠시 부산에 피난 가서도 서울에서 함께 피난 온 서울복음교회
교인들과 함께 피난교회 목회를 계속하였다. 부산 피난 시 낙동강 하류
‘망뒤’라는 농가에 허름한 방 한 칸을 얻어 기거하면서, 매일 같이 부산
시내까지 20여 리 길을 걸어 부산에 흩어져 있던 피난 교우들의 집집
을 심방하였다. 또 낮에는 부인이 간이로 차린 노점을 보면서 밤이면
판자촌에 살고 있는 집을 찾아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
는 새 소망과 용기를 얻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시에 최태용 목사는 북한군에 납치당한 후 순교하였으며,
2대 감독이었던 백남용 목사도 저산복음교회에서 체포되어 학살 순교
를 당함으로 복음교회는 두 지도자를 잃게 되었다. 1954년 1월 5일 전
국의 남아 있는 그루터기 복음교인들이 금마에 모여 복음교회 재건 총
회를 하며 감독 제도를 이사회 제도로 바꾸고 그 이사장에 지동식 목사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91
를 선출하였다. 이때로부터 1977년 소천할 때까지 실질적인 복음교회
의 지도자로서 때로는 이사장으로 감독으로 총회장으로 복음교회를
이끌었다.
지동식 목사가 서울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서울복음교회에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참
생명의 신학의 길을 찾으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교회로 몰려왔
다. 그 당시 서울복음교회를 찾은 이들의 일부를 보면, 김찬국, 배한국,
장성환, 오승태, 박태의, 채위, 이화선, 정일선, 조용술, 이승익, 김하
풍, 박순경, 허혁, 최남열, 김중기, 김상근, 이병주, 안계춘, 김경재, 신
복룡, 백도기, 오충일 등등 내로라하는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인물들이
거쳐 갔다.
당시 가장 복음교회의 교세가 강한 지방은 군산이었다. 그런데 군산
에 있는 복음교회는 그 시대 풍미하던 부흥사들의 영향으로 열광적인
신앙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칫 복음교회의 본래의 정신과 신
학적 방향이 상실하여 갈 수 있던 때였다. 이렇게 교단의 신학적 근거
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동식 목사는 복음교회의 신학적 뿌리를 든든히
세우고 소(小)하나 순(純)한 교회로서의 입지를 대내외로 공고히 하여
한국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지동식
목사가 군산지방의 성령부흥운동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인
정하며 오히려 본인의 설교도 다분히 열정적인 복음주의적 설교로 교
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1959년 5월 10일 군산복음교회 주보에 다음과
같은 서울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다.
“서울교회는 지 목사님의 복음주의적 설교로 서울시내 신자들의 환영
392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을 받아 매 주일 구름같이 모인다고 전하는바 5년간 새벽제단에서 부르
짖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
하오며 우리 복음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목사님께 더욱 성신 충만하시
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1966년 3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제19차 총회에서
복음교회의 가입이 승인되고, 이어서 1985년 6월 27일 아시아교회협
의회(CCA)에 가입하여 명실 공히 한국교계와 아시아 내지 세계교회
에 발돋움하게 된 그 배후에는 지동식 목사의 공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지동식 목사는 1970-1972년간 한국기독
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에 앞장서며, 서
두에 이미 소개한 대로 당시 군사독재정권과의 투쟁에 첫 깃발을 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KNCC의 대표회장 취임사에서 그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작은 교단
인 복음교회의 목사가 연합회회장이 된 것은 아름다운 연합정신의 결
과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연세대학교 교정에 핀 갖가지 꽃들에 비유하
여 말하기를, “향기를 발하는 장미는 장로교의 상징이요, 정열적인 인
상을 주는 다알리아는 감리교의 경건성을 말하듯 하며, 키 높은 목련화
는 성공회에 해당되고, 새빨간 색깔로써 길손들의 시선을 끄는 깨꽃은
구세군의 열정을 보여준다면, 소박한 야생화인 무궁화는 이 고장에서
산출된 복음교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라 말함으
로써 복음교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스스로 겸
비함을 보여주면서도 작지만 한국교계에 제 몫을 다하는 복음교회임
을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자 함이었다.
1960년 지동식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93
자 제자인 장성환 목사에게 서울교회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복음교회
의 이사장으로서 교단 정치의 중심에 있음으로 틈틈이 전국 각지의 복
음교회들을 돌아보는 등 보다 폭넓은 의미의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는
신학대학의 교수로서 충실하였지만 오히려 교회의 목회를 더욱 사랑
하였던 것이다. 1975년 7월 13일에는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겸 대학교
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1976년 2월 29일 정년 퇴임예배를 드릴 때까
지 잠시 대학목회를 하였으니 그야말로 신학교 졸업 이후 30여 년 동
안 지동식 목사는 목회일념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지동식 목사는 서울복음교회를 담임하면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목회와 신학이 서로 접목된 바람직한 목
학협동(牧學協同)의 목회자상과 신학자상을 보여주었다. 지동식 목사
의 목회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쾌한 해석을 통하
여 진리를 전달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봉사
하는 일이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살아간 그의 글을 들춰 본다.
“고난 중에 처한 이에게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 일도 소중하겠지만 희망
을 가지고 접하는 일이 더욱 더 소중하다.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힘쓰시는데 목회자는 여기에 대한 소망 중에서 목회를 포용한
다. 아들 부름하르트는 ‘인간은 신의 것’이라 말했다. 그 뜻은 세계는 죄
와 죽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가(高價)한 대가로 구속
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다. 세계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 자신이 세계의 희망이시다. 모든 사람
을 위한 신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목회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다.”9)
9) 지동식의 <목회학 강의 노트>에서 발췌.
394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4. 연세신학의 아버지로
다시 이야기를 거슬러 지동식 목사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게 된 경
우를 보면, 1947년 초 어느 주일 오전이었다. 서울복음교회 예배에 이
환신 목사와 당시 대학생인 김주병 목사가 참석하였다. 예배 후 이들은
백낙준 박사가 지동식 목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해 주었다. 백 총장
은 연세대학교에 신과대학이 생겼으니 지동식 목사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동식 목사는 당시 일류대학교를 졸업
하고 미국, 일본 등에서 수학한 내로라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있는
데 한낱 농촌 전도자였던 내가 종합대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백낙준 박사는 연세대학교에 신과대학을 설립한 목적을 1970
년 10월 8일(목) 신과대학 채풀에서 “연세신학의 4반세기”라는 제목
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파의 연합을 위주로 하는 것이 그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
둘째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신학교육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
하여 이 학과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 다른 한 가지는 해방 이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 교회 부흥의 세력이 새로 시작하는 신학기관
인 이곳에서 나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 그 밖에도 근래에 와서 많
이 생긴 기독교 사회사업 기관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훈련받을 기회
가 없어서 어떤 이는 일본 가서 몇 주일 공부하고 오고, 어떤 이는 미국
에 가서 한달 훈련받고 오고 하는 식으로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우리 신과대학은 바로 그러한 모든 교회 활동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도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95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본래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문학과, 농
학과, 상과, 수학 및 물리학과, 응용화학과와 더불어 본교 창립정신에
따라 신학과를 두어 그 정원이 60명이었다. 지동식 목사의 열렬한 후
원자인 최태용 목사가 이때 신학과에 입학하여 신학수업을 받은 바가
있다. 1944년 5월 10일 일제의 ‘전시 교육 비상조치 요강’에 의하여 연
희전문학교를 폐교하고 대신 5월 11자로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가 설
립되었다.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해방으로 연희 동산에 때늦은 봄
꽃이 피어나게 되었고 다시금 신학부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
다. 10월 27일 연희전문학교가 재출발하면서 신학부 부장으로 장석영
교수, 이환신 교수, 박상래 교수가 있었으며, 김재준 교수와 송창근 교
수는 겸임교수로 있었다. 1946년 2월 20일 통계에 의하면 신학과 재
적생이 51명이었다. 그러나 1950년 5월 10일 졸업 시에는 고영춘, 김
주병, 김찬국, 문상희, 박봉환, 최형준, 황진주 등 7명이 졸업을 하였
다. 당시 장석영 교수의 회고를 들어 보면, 다른 과에는 이견이 없었으
나 신학과 설립에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교회배경이 없
고, 둘째 우수한 교수진이 없고, 셋째 각 교파마다 신학교가 있어 연합
체제의 신과대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모한 계획이라는
것이고, 넷째 국내 실정에 신학과 졸업생들이 나가서 일할 만한 사회적
분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억겸 선생, 백낙준 박사, 장석영 교수
등의 노력으로 신학과가 존속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수한 교수진을 확
보하는 문제가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백낙준 박사는
지동식 목사와 같은 젊은 학자들이 필요하여 신학과 교수로 부르게 된
것이다.
396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그러나 지동식 목사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겸비한 성품도 있지만 일
본신학교 본과 졸업이라는 학력으로 어찌 종합대학교의 교수로 일할
수 있겠는가 극구 사양을 하였다. 그러나 백낙준 박사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등학교를 갓 나온 학생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되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니, 지동
식 목사는 백 박사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신학과 교수로 임명받게 되
어, 신약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조
직신학을 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석영 교수가 이론신학을
담당하고 한영교 박사께서 조직신학을 담당한 관계로 신약학을 가르
치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다방면의 공부를 할 수 있었
다고 회고한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바르트 신학을 소개하는 변변치 못한 저작을
남긴 일이 있거니와 나에게 전문분야랄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론
신학이 될 뻔하였다. … 부득이 신약학을 담담하게 되었었는데 이 일
역시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익이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없었던들 나는 전연 성서적인 근거도 없이 추상적인 이론만을 주장할
뻔하였기 때문이다.” 10)
특히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학교가 부산으로 이전하여 피난학
교를 이루고 있을 때 한영교, 박태준, 고병려 교수와 더불어 신학과를
지키며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1952년 당시 신학과 입학생이 4명과 복
학생 1명이 있었다. 이처럼 연세신학을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존경받
10) 지동식, “내가 영향받은 신학자와 그의 저서,” 『기독교사상』(1963. 8-9월호),
21.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97
는 교수로서 1976년 퇴임 때까지 30년을 연세신학의 아버지로 그의
최선을 다하였으니 연세신학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1968년에 1년간 모교인 일본 동경신학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을 때에
1969년 2월 동 신학대학에서는 그가 동교의 졸업생으로 한국 신학계
에 끼친 큰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고, 1971
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교육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하였다.
흔히 연세신학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럴 때
마다 지동식 목사는 백낙준 박사의 연세신학 설립의 정신을 이야기하
며 연세신학의 세 가지 정신을 말하곤 하였다. 그 하나는 연합정신이
다. 교회는 하나여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여러 교파로 나뉘어 있고 따라
서 신학교도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있음은 민족의 복음화에 있어서도
나라를 위한 교회의 기능적 역할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속하여 있는 복음교회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연세신학에서 공부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에 따
라 성공회와 루터교회에서도 신학생을 연세신학에 보내어 공부케 하
였다.
두 번째는 백낙준 박사가 문교부 장관이 되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
을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삼은 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지동식
목사는 이를 신학화하여 연세신학의 정신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에 의하면, 홍익인간을 정부에서 영어로 번역하기를, ‘The most extensive
service for the Benefit of Humanity’로 옮기어 세계 각국
에 소개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service’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로는
사용되어 본 일이 없는 말로서 기독교에 의해서 비로소 사용된 말이라
는 것이다. 이 영어 번역의 뜻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
398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간의 참뜻은 인간 상호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성공하기를 바라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라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의 계명과 약속에 따라 형제를 위하여 발을 씻어 주고 온 세상 사람
을 위하여 봉사하는 숭고하고도 폭넓은 사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
세신학의 기본정신은 이러한 홍익인간의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 보다 넓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보
았다.
세 번째는 자유정신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는 연세대학교의 창학정신이다. 진리와 자유는 삶의 두 축이다.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인간을 부자유케 하는 인격의 자유로,
자유의 근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밖에 없다. 그러
므로 이기심을 모조리 벗어버리고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를 위하여 종살이
하며 그의 사랑의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봉사자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여기에만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있고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데에만 인간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
라서 연세신학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그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
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동식 목사는 그가 속한 복음교회
의 신학적 준거로서 복음의 자유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지동식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교수로서 30년의 세월을 돌
아보면서 교회에 있어서나 학교에 있어서 콩깍지 구실을 하여 왔다고
회고하면서, 그의 은퇴하는 마지막 채풀에서 “연세동산의 일월성신”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지동식, 연세신학의 아버지 | 399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가르친 것도 시원치 못했었고 외친 것도
변변치 못했었기 때문에 후회막급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책임
은 내가 단독으로 질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이 동산에 불러 주
시고 30년간이나 후대해 오신 학교 당국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줄 압니다. … 그리고 은하수에 집결된 창공의 별들과는 달리 학
의 연찬과 인격의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든지 자랄 수 있
는 연세 동산의 수많은 잔별들이 어서 빨리 자라서 어두운 이 강산을
밝혀 주는 거성도 되고 온 세상을 두루두루 비춰 주는 혜성도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