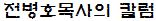282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전병호(기독교대한복음교회총회신학교 총장)
1920년 7월 “퇴폐적인 경향의 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폐허라는
동인지를 발간할 때 공초 오상순 선생은 “시대와 희생”이란 글을 발표
하면서 이렇게 그 시대를 말해 주었다.
“우리 조선은 황량한 폐허의 조선이오, 우리 시대는 번민의 시대이다
이 말은 우리 청년의 심장을 짝이는(쪼개는) 듯한 아픈 소리다. 그러나
이 말은 아니할 수 없다.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소리나 이것을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 이 폐허 속에 우리들
의 내적 외적 심적 물적의 모든 부족 결핍 결함 공허 불평 불만 울분
한숨 걱정 근심 슬픔 아픔 눈물 멸망과 死의 제악이 쌓여 있다.”1)
1) 전병호, 『최태용의 생애와 사상』(성서교재간행사: 1983), 39.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83
이미 폐허처럼 되어버린 조선 땅에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기독교였
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는 방황하는 백성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데 도
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압력과 미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외교관계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
는 근본주의적 내세적 신앙 성향에 따라 교회 안에서의 민족애국운동
을 불허하였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조선독립불능론을 공공연하게 설
교하였다. 선교사들의 한국교회 비정치화는 교회의 율법화 현상을 초
래하였고 이에 대한 실망이 비판하는 소리로 높아 가다가 드디어 1920
년대 반기독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2)
당시 신채호는 역사는 “我와 非我의 鬪爭의 記錄”이라고 하면서 기
독교는 非我로 我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폭력도 不辭하라고 하였다.
1928년 초 마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신채호는 “예
수는 죽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용과 용의 대격전”이란 글에서 “상
제의 외 아드님 야소기독이 지방 농촌 야소 교단에서 상제의 노를 강연
하더니 불의에 그 지방 농민들이 <이놈 제 아비 이름 팔아 일천구백년
동안 협잡하여 먹었으면 무던할 것이지 오늘까지 무슨 개소리치고 다
니느냐>고 <서양에서 협잡한 것도 적지 않을 턴인데 왜 또 동양까지
건너와 사기하느냐>고 <당일 예루살렘의 십자가 못 맛을 또 좀 보겠느
냐>고 발길로 차며 주먹으로 때리며 마지막 호미날로 퍽퍽 찍어 야소
기독의 전신이 곤죽이 되어 인제는 아주 부활할 수 없이 참사하고 말았
다”고 하며 기독교는 “우리의 생존을 빼앗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였다.
이런 반기독교 분위기가 1920년대 한국 사회에 팽배하여 있었다.3)
2) 기독교대한복음교회 50년 약사편찬위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50년 약사』
(1985), 13-17.
3) 『최태용의 생애와 신학』(한국신학연구소, 1995), 47-59 참조.
284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이러한 시절 28세의 청년 최태용이 선교사들을 향하여 한 소리를 하
였다. “제군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사냐? … 제군의 입에서 떨어지
는 말씀, 복음으로서 조선교회를 진흥시키고저 하는 진리 확신이 있느
냐? 제군의 손으로 주는 돈으로서 조선교회를 진흥시키고저 하는 자본
주의를 태도 삼고 있느냐? … 아-제군아 돈을 가졌느냐? 복음을 가졌
느냐? 돈의 선교사냐? 복음의 선교사냐? ― 마땅히 복음을 줄자가 돈
을 주고 있고 마땅히 복음을 받을 데서 돈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어그
러진 일을 보느냐? 진리에 어그러져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
이다.” 그래서 조선 교회를 향하여 ‘독립하라’고 외친다. “각 교회는 독
립하여 외국 선교사에게서 그 재정의 원조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
님 앞에 의로워지리라. 그리하여 조선교회는 독립교회로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체임을 얻으리라”4)
마침내 1925년 12월 6일 주일 오후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대강
당 가득한 2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그리고 당시 조선교회들을 향하
여 신앙혁명을 선언하기를 교회는 복음의 생명을 상실하였고 개개인
의 신앙은 죽고 말았다고 간파한 최태용은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 신앙을 소유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그리고 신앙
혁명가를 힘차게 불렀다.
<신앙혁명가>
1. 아! 신앙혁명은 가까 왔구나, 아! 신앙혁명은 이르렀구나, 현대의 생
명없는 교회들아, 허위에 날뛰는 교회들아, 말라진 교리만 붙잡아 있
고 근본 된 신앙은 내어 버렸구나.
4) 『천래지성』 제18호, 3.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85
2. 아! 신앙혁명은 가까왔구나, 아! 신앙혁명은 이르렀구나, 속죄와 부
활믿고 신앙 막혔다. 윤곽과 터만 닦고 신앙 막혔다. 생명의 신앙은
사각이 되고, 현하의 교회는 고목이 되었네.
3. 아! 천국나라는 가까웠구나, 아! 진리세계는 전개됐구나, 음침한 골
짜기를 벗어나서 광명한 하늘 길을 밟아가자, 환난핍박에 순종하며
늘 기도하면서 힘써 싸워라.
4. 아! 하늘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아!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다. 영원히
솟는 샘 구주 예수니, 생명수 마실 자 용맹 다하여, 신앙 신앙에 혁명
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세.
최태용은 『천래지성』이란 잡지 1926년 1월호에 <신앙혁명가> 가사
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5)
“이제는 신앙혁명을 들으라! 기독교가 아니요,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
라. 교회생활이 아니요, 영이 되라. 진리가 되라. 위로부터 오신 자는
만물 위에 계셔 저는 영이셨느니라. 그와 같이 그를 믿는 자도 모든 것
위에 초연히 사는 영이 되라. 진리가 되라. 생명이 이에 있나니 혁명신
앙은 곧 생명신앙이니라. 혁명신앙의 소리는 들렸다. 생명의 소리는 들
렸다. 전능하신 자로부터 온 이 소리여, 나아가서 신앙계의 사각(死角)
을 파쇄하라. 그 굳은 윤곽을 깨뜨려 버려라. 그리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영에 올려라. 진리에 올려라. 무한을 항하여 살게 하라. 영원히 솟는 샘
에 인도하라. 그리하여 너의 소리를 받는 자를 영원히 주리지 않게 하
라. 그리스도 자신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 신학으로 쌓아 놓은 제도
5)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 『최태용전집』 제1권, 234.
286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도 아니며 영원히 솟는 산 샘이니 교리 승인의 신앙으로 막힌 영혼들아,
이 샘에 와서 마셔라. 제도생활의 형식으로 막힌 영혼들아, 이 샘에 와
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네게 주는 생수가 네 속에서 샘이
되어 영생토록 솟으리라.”
최태용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지금 세상은 한번 뒤집혀야 한다>
신학은 많고 신앙은 적고
기도회는 많고 기도는 적고
단체로서의 수는 많고 신앙의 개인은 적고
사람의 지혜로의 운동은 많고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일은 적다.
이 많은 일이 적게 되고
이 적은 일이 많게 되어야
세상은 바른 세상이니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 세상은 한번 뒤집혀야 한다.
아! 세상은 역시 한 혁명을 요한다.
교회의 신앙혁명을 외친 청년 최태용은 함경남도 영흥군 안흥면 동
원리 69번지에서 1897년 11월 25일(음) 출생하였다. 1912년 9월 영
흥공립간이농업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사는 길은 농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품기 시작하였다. 정작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일은 35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 1914년 3월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87
수원고등농림학교(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하여 1917년 3월에
졸업을 하였다. 그가 수원에서 공부하던 당시 학우 김성실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열렬한 신앙인으로 믿음생활을 하였는데
이는 나라의 자주 독립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요일이면 십리나 되는 예배당을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고 월요일이
시험인데도 일요일에는 학과 공부는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었다.
기숙사 기독청년회를 조직하여 새벽 5시에 서둔천 연습림에 가서 머리
에 서리를 맞아 가면서 기도를 하였다. 당시 그는 나라의 독립과 백성
들이 부강하게 하는 일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였다. 1916년 늦가을 수요 예배 후 기숙사에 돌아와
잠을 자려는데 홀연히 광명한 빛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마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복음을 위하여 네 몸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는 소명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
라 마침내 연희전문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였다.6)
연희전문학교는 언더우드 목사가 설립을 주도하여 1915년 3월 조
선기독교학교가 설립되어 당시 YMCA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신과 문과 상과 농과 수물과 응용화학과를 두는 한국 최초의 사립대학
이었다. 언더우드 목사는 반드시 기독교 정신으로 진리와 자유를 체득
한 조선의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조선기독교학교를 설
립하게 된 것이다. 본디 평양 장로교신학교가 있는데 또 새로운 신학교
가 필요한가에 대해 선교사들 간에 이론들이 많았지만, 언더우드 목사
는 일반 전문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총독부의 사립학교
6) 전병호, ibid., 26. 『천래지성』 제16호, 150. 『영과 진리』 제98호, 6.
288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운영방침에 따라 고민하던 중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이 기독교인으로
서 자문해 주기를 신학과를 두면 자연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는 말을 듣고 신학과 세우는 데 반대하는 선교사들을 설득하여 마침
내 신학과를 두게 된 것이다. 그런 언더우드 목사는 신병으로 치료차
미국에 가서도 1915년 4월 1일부터 1916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2300
통이나 되는 편지를 각계각층에 보내 조선에 새롭게 설립한 학교를 위
한 후원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16년 10월 12일 그는 57세의 나이
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기도와 꿈이 담긴 연희전문학교는 1917년
4월 7일에 당국에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당연히 신과가 이 학교
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한 최태용은 1년간 배화학교 선교사들에게 한
글을 가르치던 중 1918년 연희전문학교 신과에 입학을 하였다. 당시
신과과장은 노해리(盧解理, Rhodes Harry Andrew, 1879-1965)이였
고, 교수로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여 연전 부교장으로 영어 종교학을
가르친 변영서(Billings Bliss W., 1881-1969), 코넬 대학을 졸업한 기
이브(奇怡富, Cable Elmer M, 1874-1949) 등 선교사들이 강의를 하였
지만 다른 신학교와는 달리 민족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열망하는 모
세 같은 인물들이 다수 모여 공부를 하였다. 신과는 3학년제로 최태용
은 5학기만을 마치었으니, 당시 농과를 지도할 교수요원이 부족하여
차출되어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농과 교수로 있게 되어 연희동산에
서 생활한 기간이 도합 4년이었다. 이같이 연희전문학교에서 생활하
는 동안 그의 신앙 인격 형성을 수립하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에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이묘목 박사와는 평생지기로 교
제를 나누었다.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89
“연희 송림 이것이 내가 기도를 시작한 곧 나의 신앙의 발상지였다.”7)
수원농림학교에서 연습림을 찾아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최태용은
연희전문학교 청송대를 찾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
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서 안정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수원
에서부터 존경해 마지않았던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요 무교회주의자
인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을 만나 그의 신앙을 따르려 일본으로 건
너갔다. 우선 1921년 10월 동경정규영어학교에 입학하여 영어공부를
하면서 우치무라 간조의 문하생으로 그를 따랐다. 그 후 김교신, 함석
헌, 송두영, 유동식 등이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가 되었다. 김교신 선생
은 무교회주의 신앙에서 최태용보다 한수 아래로 최태용을 제외하고
자신이 무교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일은 감당할 수 없노라고 말한 바 있
다.8) 최태용은 제2의 유치무라란 말을 들을 정도로 우치무라 간조의
모든 것 심지어 발걸음까지 닮아 가려 하였다. 최태용은 이때를 회고하
면서, “일본의 내촌감삼 씨의 서적을 탐독한 일이 어찌도 유익하였는
지 모른다. 그때 나는 저의 안에 있고 저는 나의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저의 말은 나의 마음의 바닥까지를 울리는 것이었다”라고 하였으며,
우치무라 간조도 “나의 설한 복음은 일본 내지에서보다 대륙방면에서
더 선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이 나의 일상의 기대하는 바라”9)고 함
최태용에 대단한 기대를 하였다.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발생하고 일본인들의 조선
7) 『최태용전집』 제3권, 『영과 진리』 제40호, 144.
8) 김교신, 『성서조선』 8, 9 (1930), 216.
9) 『성서조선』, ibid.
290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최태용은 “일본에게 보낸다”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일본 사람들의 야만적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징벌이
내리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新生命』이란 기독 잡지에 당시 전영택, 양주삼, 방인근, 채필
근 같은 신학자들과 함께 “제도냐 신앙이냐”, “사업이냐 생명이냐”, “완
전함에 나아가자” 등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과 그 성격에 대해 연
이어 18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최태용은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결함은
제도적 교회로, 제도가 복잡한 교회일수록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고 보았다. “노인이여, 구제도의 보수를 고집하느냐. 당신들에게 신앙
이 없으니 회개하고 … 생명의 어린아이가 되라. 형제들이여, 교회로 하
여금 신앙을 위하여 있게 하고 제도를 위하여 있지 않도록 합시다.”10)
그는 신 생명지에 다음과 같은 <암상소송>(岩上小松)이란 시를 발
표하였다.
巨大한 바위 / 한 모퉁이에 / 한 웅큼 되는 / 모래 위에 서 있는 / 너
작은 솔아
네 나이는 10세가량 / 네 키는 7, 8촌 / 금년도 새 순을 / 一寸가량 내밀
어 / 남과 다름없이 / 신록을 자랑하는구나 / 네가 가진 생명 / 네가 받
은 권능 / 바위틈에 내리는 / 신비한 너의 뿌리 / 점점 깊어지고 / 차차
굵어져서 / 마침내 巨巖을 / 무너뜨리고 말 / 定命을 가졌도다.
아― 위대할거나 너 작은 솔아
10) 김한준 편, 『생명신앙』, 2.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91
최태용은 당시 안국동교회의 초청을 받고 설교한바가 있는데, 3.1
운동의 민족대표 한 분이신 오하영 목사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최태
용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랄하게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특히 윤치호
장로를 야단치는데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최태용은 1925년 12월부터 27년까지 스스로 등사판을 밀어 『천래
지성』(天來之聲)이란 개인 잡지를 발간하여 자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
님의 음성을 마음껏 토로하였다. 그는 『천래지성』 창간호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도덕은 무력해지고 종교는 부패하였으며 생명은 죽은 껍질이 되었고
진리는 그 소리를 잠잠히 하였습니다. 광명은 어데 있는지 온 땅은 빽빽
한 암흑이올시다. 아― 무서운 세대를 당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 있는 운동이 온 땅을 덮어 행하시옵소서.”11)
“아― 하나님이여, 조선을 구원하옵소서. 당신의 권능 있는 복음으로
이 백성을 돌보시옵소서. 아― 저희는 썩었습니다. 육도 망하고 영도
죽었습니다.”12)
결국 신앙혁명선언을 발표하였으나 그는 교회를 통한 신앙혁명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리라 다짐을 하였다.
“現今의 조선교회와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
지 못할 것은 확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吾人은 조선의 구원을 교회에 의
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의탁하여 기도하는 바이다.”
11) Ibid., 36. 『천래지성』 1926년 6월 10일, 창간호.
12) Ibid., 36. 『천래지성』 제3호.
292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독자적으로 신앙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본격적인 신학교육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최태용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는 1927년 4월 동경 메이지학원 신학부에 청강생으로 입학한 후 다
음해 11월 본과 1년 정규과정에 편입학하였다. 일본신학교로 개명한
동 학교를 31년 3월 졸업하고 다시 1934년 9월부터 1년간 계속 수업
을 받았다.
당시 일본에는 조선의 내로라하는 젊은 신학도들이 다니는 몇몇의
신학교가 있었다. 그 하나가 1912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온 나지
마 조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샤 대학(同志社大学) 문학부 신학과이다.
1945년까지 이 대학 출신으로 한국인 유학생은 전순득, 우익현, 윤성
범, 서남동, 정대위, 옥경석, 강관흥, 이만호, 권동철, 이상순, 홍병선,
조용기 등이다. 이 대학의 학풍에 대해서 이덕주 교수는 “서구 근본주
의신학과 자유주의신학 사이에서 중도적 칼빈주의 신학, 구체적으로
는 바르트와 틸리히 그리고 니버로 이어지는 신정통주의신학 노선을
취했다”고 말한다.
또 이덕주 교수의 논문 「초기 일본 신학교 한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
구」에 의하면, 미국 남감리회에서 파송한 램버스 선교사가 목회자 양
성을 목적으로 1889년에 설립한 관세이가쿠인 대학(関西学院大学)이
도시샤 대학과 함께 관서지역의 명문사립대학이었다. 1901년 박영효
가 11명의 조선인 학생을 신학부에서 공부시킨 이래 김춘배(장로교,
1929년 입학), 김영주(장로교, 1930년 입학), 홍현설(감리교, 1933년 입
학), 이호빈(예수교회, 1936년 입학), 현영학(장로교, 1938년 입학), 김
용옥(감리교, 1940년 입학), 박대선(감리교, 1940년 입학) 등 한국 신학
계의 거물들이 이 학교에서 유학했다. 이 학교에 69명의 한국인 유학
생이 공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학적인 특색을 보면, 1930년대 초부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93
터 칼 바르트와 브루너 등의 변증법 신학, 또는 폴 틸리히의 저서가 소
개되었고 구약학의 마쓰다와 신약학의 마쓰시타 같이 성서신학에서
역사비판적인 연구를 중요시하면서도 텍스트의 신학적 해석을 지향하
는 연구방법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축자영감설에 비판적인 자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용옥 학장이 이 학교에서 유학했던 경험을
훗날 회고했는데 “대학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주의적이고 매
우 활발했으며 로맨틱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했고, 박대선 박사는
“한국 동포도 많았고 모두가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 안에는 민주적인
법이 준수되었다”
그런데 최태용은 도시샤 대학도 아니고 관세이가쿠인 대학도 아닌
메이지가쿠인 대학생이었다. 이 학교 출신으로 김봉규, 김관주, 김형
도, 이재면, 이두성, 정훈택, 황호봉, 김종규, 이기준, 심응섭, 황재명,
윤인구, 지동식, 김관석, 김철손, 문익환, 문동환, 문상희, 박봉랑, 백리
언, 이영헌, 오태환, 장병길, 장준하, 전경연, 전택부, 최화정, 김윤식,
박형규 등 훗날의 한국교계와 신학계에서 활동할 쟁쟁한 인물들이 배
출되었다. 강원용 목사도 메이지학원 영문학과에 다녔다. 그 외에 이
광수, 김동인, 주요한, 박영효, 백남훈, 김상돈, 문일평, 김홍량, 고승
제, 김관호도 신학부는 아니지만 메이지학원 출신들이다.
왜 최태용은 메이지신학원에서 신학공부를 하였는가? 명확한 대답
은 없으나, 한 가지 메이지학원의 교장이 당시 가장 알려져 있는 신학
자 다카쿠라 도쿠타로(高倉德太郞, 1885-1934)로 최태용은 그에게 관
심이 컸었다는 것이다. 다카쿠라는 바르트의 스승으로 알려진 포사이
드(P. Forsyth, 1848-1921)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2011년
Ministry 지에서 일본 목회자 300명을 대상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294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첫 번째가 우치쿠라 간조
이고 아홉 번째가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로 다카쿠라 도쿠타로였다.
최태용은 이 학교에서 포사이드의 신학과 바르트의 신학, 부룬너의
신학, 서구의 자유주의신학들을 섭렵하였다. 1931년 3월 졸업 논문으
로 “제4복음서의 구원관”을 발표하였다. 당시 이 연구에 수십 권의 원
서를 읽었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최태용전집』에서 밝히고 있는
책들은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E. F. Scott, The Fourth Gospel its Purpose and Theology (1908).
R. H. Strachan, The Fourth Evangrlist Dramatist or Historian?
(1925).
G. H. C. Macgregor, The Moffat N. T. Commentary, The Gospel
of John, especially its Introduction (1928).
J. H. Bernard,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John, especially
its Introduction (1928).
W. F. Howard, The Forth Gospel in Recent Criticism and Introduction
(1931).
W. Sanday, Christology and Personality (1911).
J. Baillie, The Place of Jesus Christ in Modern Christianity (1929).13)
이러한 참고도서 목록을 볼 때에 최태용은 상당한 성경비평학적인
연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1년 4월에 발행한 『영과 진리』 28호
에서 “신약성경의 역사적 비판적 방법에 의한 취급과 기독교의 영원한
13) 『최태용전집』 3권, 350. 『영과 진리』 제51호.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95
신성성”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 “대저 역사적-비판적 방
법에 의한 성경관은 바른 지식이다. 이 바른 지식을 물리치고 관념적
성경관을 보수함, 그것은 미련한 일이다. … 그것을 통하여 나는 신약
성경의 산 종교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14) 이러한 최태용의
입장을 유동식 박사는 “최태용이 성서의 역사적-비판적 연구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성서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화석화하여 생명
을 잃어버린 역사적 기독교를 혁신하여 생명이 넘치는 ‘산 종교’를 회
복한다는 데 있다”15)고 하였다.
최태용이 청산신학원에 다니면서 서구의 신학에 심취하여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비판적이면서 새로운 신학과 신앙의 길을 나름
대로 모색하고 이었으니 그의 독창적인 신학으로 “영적 기독교론”을
발표하였다. 『천래지성』을 폐간한 후 잠시 영적인 휴식을 취한 다음
1929년 2월 6일 『영과 진리』라는 새 잡지를 발간하고 1937년까지 이
잡지를 통하여 자신의 신학적 ․ 신앙적 변화와 새로움을 펼쳐 나갔다.
그리고 그 잡지를 통하여 한국에는 새로운 한국 신학이 필요함을 제창
하였다. 그는 일찍이 근본주의적 고정주의 한국교회가 그 생명을 상실
하고 고목화되었다고 외치며, 이는 선교사들의 지도하에 있어 더 이상
교회가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
고 고목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죽은 신앙을 혁파하고
생명신앙으로 나가는 데 최태용은 무교회 신앙으로는 될 수 없음을 간
파하였다. 그는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는 일본의 상황에 걸맞은 신앙
이지 조선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치무라는 ‘JJ’ 즉 ‘Japan
and Jesus’이지만 최태용은 ‘CC’ 즉 ‘Chosen and Christ’여야 한다는
14) 『최태용전집』 2권, 508. 『영과 진리』 제28호.
15) 『최태용의 생애와 신학』, 334.
296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것이다. 그래서 無교회운동(The Nonchurch movement)이 아니라 非
교회운동(The Antichurch movement)을 주창하였다. 여기 非라면 교
회가 아니라 율법과 신경과 교리와 제도와 낡은 전통에 생명을 상실한
교회주의 그것이 non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
하심에 따르는 ‘영적 기독교론’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1929년 7월
『영과 진리』 7호에서부터 1931년 7월 33호에 이르기까지 무려 26개
월 동안 20호에 걸쳐 ‘영적 기독교론’을 발표하였다. 1931년 어느 날
아침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다.
“ 오, 주여 나로 하여금 / 영에 있게 하옵소서 /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 영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 육으로 내려가지 말게 하옵소서 / 육으로
삶은 죽음이로서이다. / 육에 있어서는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 그리스
도의 안 / 이것이 나의 살 세계이로소이다. / 나는 나의 생활을 전혀 /
그의 안에 가지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 나의 기쁨과 행복도 / 오직 거
기만 있나이다. / 아멘”16)
최태용은 다시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신앙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으로 순수한 조선신학 위에 선 조선교회를 세우자고 각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외쳤다. 그는 이 같은 논리를 전국 각지를 다니며 설파하였
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폭탄이다. 우리는 조선대장로
교, 대감리교를 향하여 이를 던진다. 그러나 우리를 오해하지 말라. 우
리의 참 목적은 교회가 참된 교회됨에 있고 결코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17) 그러나 장로교회를 비롯한 조선 교계는 아직 그의
16) 『영과 진리』 36호 (1931. 12월호), 24.
17) 『영과 진리』 47호 (1932. 12월호), 5-10.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97
외침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그의 논리를
외곡하고 그를 강단에 세우지 말라는 명령이 총회로부터 각 교회에 시
달되었다.
최태용은 조선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학교가 요
구된다고 생각했다.
“조선 교회는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신앙의 지침을 가짐 없
이 영계의 훌륭한 바다를 제 멋대로 휘둘러 다닙니다. 일방 정통파는
그 신앙이 신경주의에 화석화하였음에 반동하야 타방 저희는 얼마나
주관세계의 순례를 하고 있는가? 조선교회의 신앙은 정통주의가 아니
면 주관적인 신비주의입니다. 그 근자에 유행하는 근대주의와 같은 것
에 대하여는 그것을 신앙에 비추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 다만
과거의 권위 있는 신학을 이지적으로 승인하는 일이 신학의 주장이지
는 아니합니다. 현대의 사상범위, 사고능력에 찬 현대적 확신으로서의
기독교 진리주장이 신학입니다. 이런 의미의 조선교회가 없음은 사실
이 아닙니까?”18)
조선의 현실에 맞는 민족신학을 주장한 최태용은 마침내 ‘조선에 맞
는’ 민족교회를 세우는 데 이르렀다.
영적 기독교론을 주창한 최태용은 1930년부터 1950년에 이르기까
지 해마다 1월 초 1주간 전라북도 금마에서 전국에 있는 『영과 진리』지
의 독자들과 최태용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영적
기독교론’을 피력하였고, 1933년 9월부터 경성부 종로 6정목 210-9
18) 『영과 진리』 52호 (1933. 7월호), 4-6.
298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부활사’(현 서울복음교회자리)에서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복음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김교신, 김재준, 정경옥, 송창근 등도 참석하였고 집
회 후에는 따로 모여 서로의 생각들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1935년 12월 22일 최태용은 마침내 ‘조선기독교대한복음교회’를
창립하였다. 많은 비판자들이 무교회주의자가 이제 교회주의자가 되
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교사들이 전해 주고
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교회가 아닌, 조선을 위한 조선의 신학으로
조선인의 고백에 의해 조선을 구원할 조선의 교회로서 ‘조선복음교회’
를 출발한 것이다. 조선복음교회는 두 축이 있으니 하나는 민족이요
또 하나는 복음이었다. 장로교 목사로 존경받고 있던 윤치병 목사가
복음교회에 가입하면서 최태용에게 목사 안수를 하였다. 이때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이여 조선을 구원하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역사로 이 백성의 영
의 구원을 일해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권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옵소서. 당신의 역사, 당신의 권능으로만 그리스도
의 복음이 조선을 정복하여 주옵소서. 조선의 전도를 위하여 나는 나의
양심을 죽이옵니다. 나는 나의 전도심을 죽이옵니다. 나는 나의 일체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하기만 기도
하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조선의 구원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조선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님이여, 당신의 거룩하고 권세 있는 역사를 위하여 나는 다만 기도하며
믿기만 하고 있으렵니다. 아멘.”
조선복음교회를 출발하면서 최태용은 복음교회의 표어를 발표하고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299
복음교회가를 힘차게 신앙 동지들과 함께 불렀다. (복음교회에서는 현
재도 복음교회가를 부르고 있다.)
<복음교회 표어>
1.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2.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3.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
<복음교회가>
1절. 암운은 천지 덮었고 사망의 세력이 모든 생명 삼켜서 썩히는 세대
다.
2절. 조선에 있는 교회들 부패코 말랐네 참 씨를 못 뿌렸던가 그 맘이
나쁜가
6절. 그래서 복음교회가 조선에 되었네 전능자 우릴 가지고 그 뜻을 행
하리
후렴) 하나님이여 말하소서 권능 베퍼 주소서 우리도 믿음으로써 응답
하오리다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일본주의에 의한 기독교가 되도록 억압을 하였고,
이에 “우리는 종교인이기 전에, 조선인이기 전에 먼저 제일로 일본인
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황폐하의 충성한 적자로서 다만 일본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 조선 기독교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다”19)라는 명분하에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그리고 전쟁 수행을 돕도록
강요하였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총회적으로 신사
300 |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주년
참배를 결의하였으며, 일본 당국은 부일 존황 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하였다. 일찍이 최태용은 선교사들의 활동
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일본 총독부의 방책을 따르는 입장으로
보여 친일 부역 동원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신사참배나 동방
요배 같은 일을 교회 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용 목사는 창씨개명의 압력에 복원유신(福元唯信)이라고 개명
하였다. 이를 풀어 보면 ’‘복의 근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뜻으로 지었
지만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 바 없었다. 다만 1942년 4월 『동양지광』
(東洋之光)이란 일본어 잡지에 일어로 “조선 기독교의 재출발”이란 글
을 福元唯信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쓴 하나님에
게 충성하듯 일본에게 충성하라는 친일의 글로 오늘날 친일 목사의 구
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수많은 친일행각을 해야 존명할 수 있는 당시
상황하에 최태용의 친일행각은 오직 이 한 번뿐이었다. 당시 복음교회
교인들은 최태용 목사로부터 친일에 관한 단 한 마디의 말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의 글이라도 글은 증거하는
것이니, 비록 억압과 회유 속에 쓴 글이라 해도 최태용 목사에게 오늘
날 한 점의 오점이라고 해도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었다. 기독교대한복
음교회는 2006년 제46차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안건으로 공식 상
정했고 토론 끝에 최태용 목사의 친일행적을 함께 책임을 짊어져 그
잘못을 민족 앞에 고백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대동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이
사라지고 세계 앞에 떨리는 음성으로 항복을 선언하는 일본 천황의 목
소리를 라디오를 통해 들은 대한민국 동포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
19) 민경배, 『교회와 민족』, 409.
최태용, 민족교회의 설립자 | 301
를 불렀다. 그러나 이 8.15 광복의 날이 날선 이념의 칼로 민족의 허리
를 끊어버린 비운의 날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 것인가! 남북이 갈라져
버린 해방의 정국은 어지럽고 혼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때에 최태용
목사는 교단을 백남용 목사에게, 교회는 지동식 목사에게 맡기고 풍덩
어지러운 정국으로 몸을 던졌다. 나라를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야 한다
는 뜻을 펼치고자 함이다. 새로운 나라는 ‘Democracy’가 아니라
‘Deocracy’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온 국민이 한 덩어리
로 뭉쳐서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에 총궐기하도록 하는 국민운동을 전
개하기 위해 국민의식 계몽운동을 벌여 나갔다. 때마침 이승만 박사가
귀국을 하자 그와 더불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하여 그 단체를
주관하였으며,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좌우합작 반대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한편 나라를 새롭게 세워 나가기 위해 ‘국민훈련
원’을, 후에 ‘농민훈련원’을 개원하여 3천여 명의 농민을 교육시켰다.
최태용 목사는 훈련생으로 하여금 “국가를 찾자, 국가를 이루자, 국가
를 생각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그들에게 ‘신 국가론’을 역설하
였다.20) 이승만 박사의 주도하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입각 요
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순수한 농민 개혁운동을 하던 중 농민회
(현 농업협동조합)를 만들어 부회장이 되었다(회장은 농림부장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처 피난하지 못하였던 최
태용 목사는 9월 9일 그와 함께 농민운동을 한 오랜 친구이자 교인이
었던 이의 밀고로 공산군에게 붙잡혀 납북되어 끌려가던 중 당시 함께
있었던 이의 말에 의하면 공산군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한다.
20) 이 당시 최태용 목사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태용의 생애와 신학』,
400 이하. 전병호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최태용”을 참고할 것. 『최태용전집』 제6권,
193 이하를 참고할 것.